호텔 등급속에서 길을 잃다
|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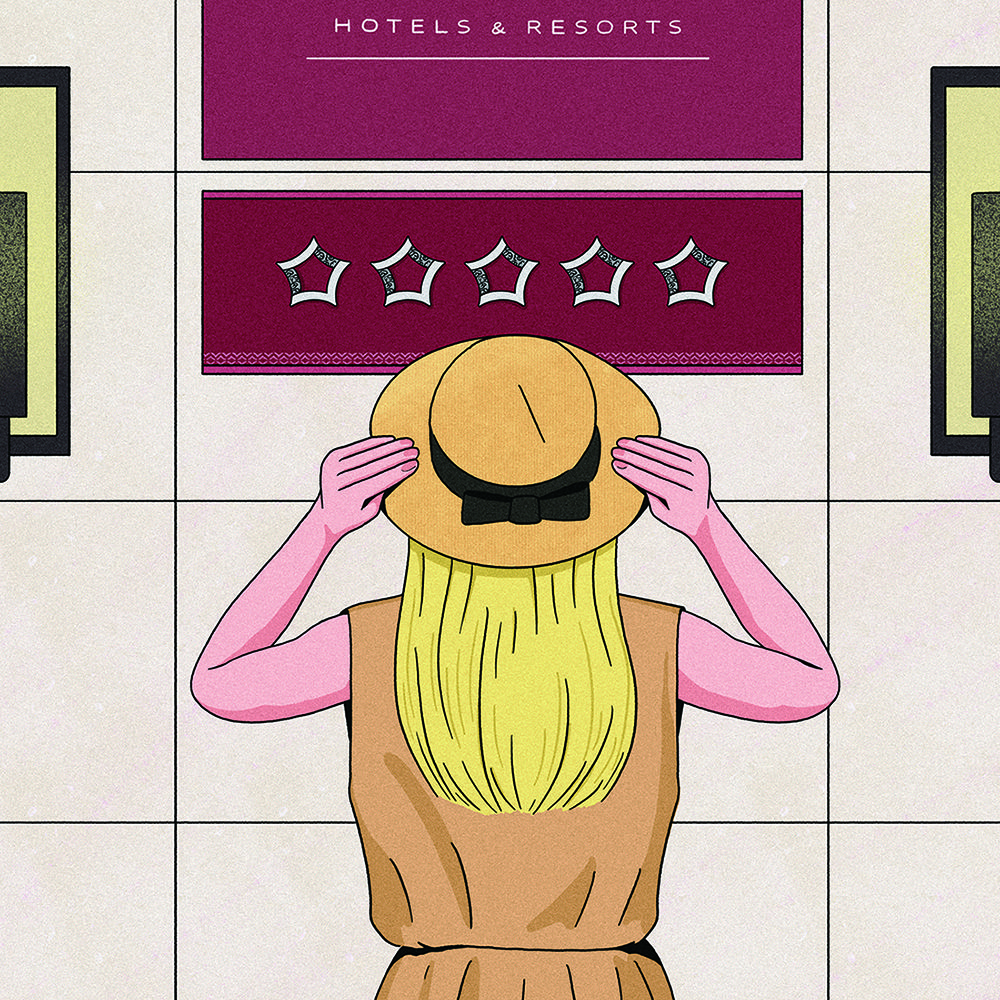
호텔 홍보팀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다 보니, 호텔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얼마 전, <포브스> 선정 호텔 관련 기사를 봤을 때도 그랬다. 누군가 사기라도 친 것처럼 ‘6성급이라고 광고하던 국내 5성급 호텔들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뽑은 스타 등급에서는 별 다섯 개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일단 오해를 풀어야 한다. 별이라고 다 같은 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각 나라의 최상위 호텔들만 선정한 후, 다시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한마디로 최고급 호텔들만 방문한 뒤 그 안에서 다시 5성, 4성, 추천(Recommended)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만약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이 등급의 이름을 ‘럭셔리’ ‘프리미엄’ ‘레코멘디드’로 정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좀 다르게 생각하면, 포브스 인스펙터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호텔은 국내에서 최고급 호텔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리가 보통 ‘5성급’이라고 할 때의 등급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퍼실리티의 다양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5성급은 3개 이상의 올데이 레스토랑, 대형 연회장, 18시간 이상의 룸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예약, 주차, 로비 환경, 프런트 접객 등의 여러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 이상인 호텔에 등급을 부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등급과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등급을 비교하는 일은 서울시가 선정한 ‘국민맛집 1스타’와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미쉐린 1스타를 두고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호텔 등급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체 왜 호텔에 별을 매기기 시작한 걸까? 호텔 등급 제도의 목적은 관광객이 호텔을 선택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0명 규모의 와인 시음 행사를 기획한다면 별이 다섯 개 달린 호텔들에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빠르다. 5성급 호텔의 기준에 ‘대연회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준도 등급으로 알 수 있다. 5성급 호텔에서는 더러운 시트를 볼 일이 없을 것이고, 4성 호텔에서는 저녁에 외출한 뒤 돌아와서 턴다운 서비스(고객의 숙면을 돕기 위해 저녁 시간에 제공하는 객실 정비 서비스)를 왜 안 해주냐며 화를 내선 안 된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호텔의 등급 심사는 크게 시설과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특히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성급 체계든 포브스든 인스펙터가 사전 고지 없이 호텔을 방문해 점검한다. 그런데 <포브스>의 경우엔 이 인스펙터의 주관성에 꽤나 크게 기대고 있다는 풍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포브스>의 서비스 점검 리포트를 쭉 살펴보면(엄청나게 길다) ‘적절한(appropriate)’ ‘진심 어린(genuine)’ ‘우수한(excellent)’이라는 형용사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용사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닐까?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아니 맞는 건가? 모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닐까? 나에게 이 지면을 부탁한 <에스콰이어>의 박세회 피처 디렉터는 “얼마 전에 사이판의 크라운 플라자라는 호텔에 묵었는데, 제가 있던 7층의 아이스 머신이 고장 났더라고요. 그래서 리셉션에 ‘아이스 머신이 고장 났다’고 말했더니, 리셉셔니스트가 시원하게 웃으며 ‘그렇다면 6층으로 가보면 어떠냐’고 말해서 저도 크게 웃은 적이 있어요”라며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당한 서비스가 좋아요”고 말했다. 한국의 접객 문화였다면, 일단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시작했을 것이다. 박세회 디렉터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질문에 대해 직원이 우아한 톤과 적절한 속도로 답했습니까?’라는 <포브스>의 평가 항목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질문에 주어지는 인스펙터의 주관적인 점수 역시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오히려 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의 본질을 사랑한다. 예전 호텔리어로 일하던 시절, 제주도에 호텔을 오픈할 일이 있었다. 오픈을 준비하다 보니 호텔의 경쟁재인 고급 펜션을 찾는 고객 심리를 이해해야 했고, 이를 위해 곽지해수욕장 근처의 ‘코끼리잠’이라는 곳을 벤치마킹하러 다녀왔었다. 건축가 부부가 운영하는 이 숙소는 깔끔하고 정갈한 디자인만큼이나 서비스도 군더더기 없이 딱 알맞았다. 필요한 것만 묻고,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는 담백한 응대. 호텔업계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라’는 강박 속에 살던 나에게는 그 담백함이 무척 생소하면서도,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편안했다. 그러나 햇살로 빚은 듯한 5성급 호텔의 상냥한 서비스에 길들여진 고객이라면 ‘고객에게 관심 없는 적당한 서비스’로 판단했을 것이다. 정답은 없는 법이다.
와인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 방문했을 때도 기억난다. 작은 호텔의 카페테리아에 자리를 잡고 매니저에게 와인 한 잔을 주문했는데, 그 매니저는 어떤 와인 종류를 좋아햐나고 물었고 레드 와인을 좋아한다는 말에 너덧 종류의 와인을 테이스팅하게 해줬다. 한참 동안 시음을 하며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와인을 주문하지도 않았고, 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응대가 접대 매뉴얼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나와 동행한 어린 조카에게 레이(Lei)를 건넬 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반쯤 앉아서 전달했다. 로마의 한 호텔에서는 아침에 여정을 시작하는 나를 위해 벨 데스크 직원이 다가와 “날씨가 더우니 조심하라”며 물 한 병을 건넸다. 홍콩의 작은 호텔선 관광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깨끗이 닦여 세면대 위에 놓여 있는 내 안경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다. 혼자 잘 때면 늘 침대의 오른쪽에서 자는데,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선 첫날엔 왼쪽 베드사이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물과 침대 왼편에 놓여 있던 슬리퍼가 둘째 날부터는 내가 자는 쪽인 오른쪽에 세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감동적인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 항목에도,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질문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누가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 결국 호텔의 진정한 가치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고객이 경험하는 순간 속에 있다. 호텔을 사랑해 오랫동안 일했던 내가 줄 수 있는 결론이다.
윤소윤은 15년 동안 호텔리어로 일한 후 현재 호텔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다. ‘포시즌스’ ‘리츠칼튼’ ‘인터컨티넨탈’ ‘조선호텔앤리조트’에서 근무했다.
Credit
- EDITOR 박세회
- WRITER 윤소윤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CELEBRITY
#마크, #류승룡, #이주안, #류승범, #백현, #카이, #정우, #이수혁, #안효섭, #엔믹스, #육성재, #양세종, #윤성빈, #추영우, #차은우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