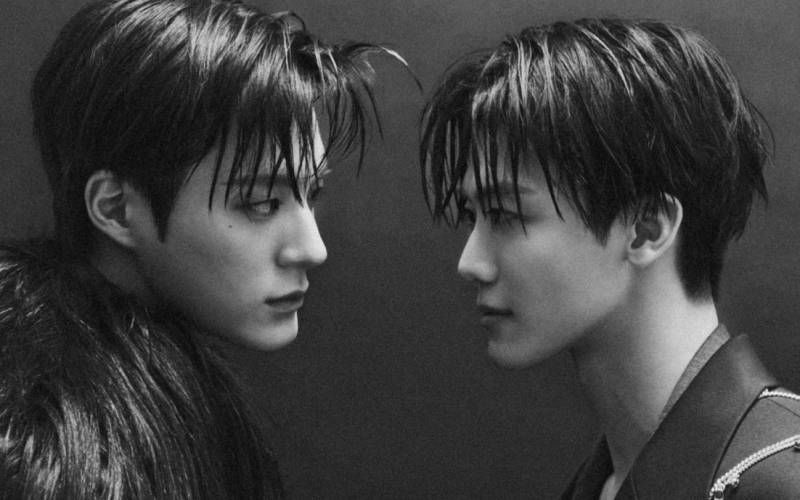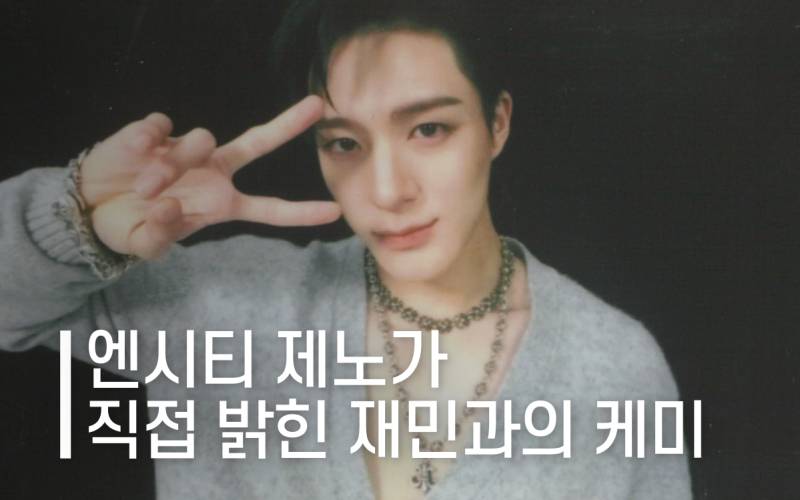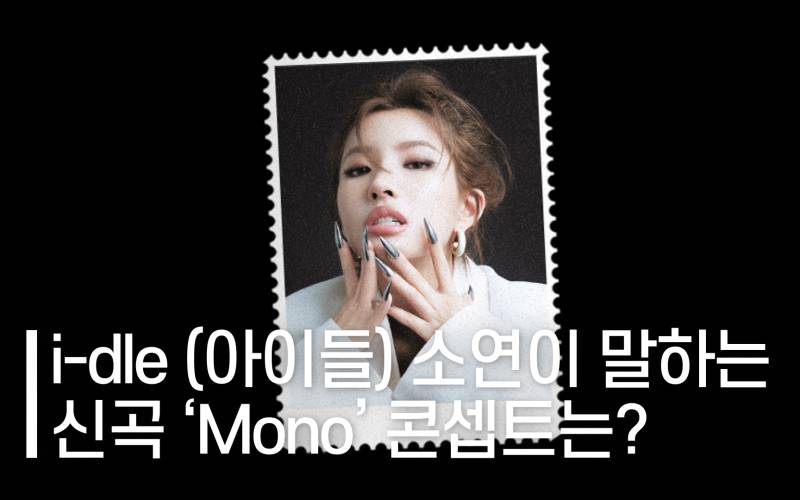모든 게 진심인 와인 장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저 농부였고, 그 땅 위에선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주일 동안,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15개의 와이너리를 종주하는 어마어마한 트립에 참가했다. 이번 6월호에 들어간 기사 ‘캘리포니아의 포도밭엔 왜 양 떼가 떠도는가?’라는 기사가 그 결과물이다. 행복했지만, ‘편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출장이었다. 엘에이의 웨스트할리우드에 있는 한 호텔에 10개국에서 모인 16명의 기자가 집결해 40인승 버스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센트럴 코스트에 있는 주요 와인 지역과 와이너리를 탐방하는 거대한 여정이었고, 버스에 실려 가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와이너리들을 구글 지도에 찍어보니 총 이동거리가 자그마치 560마일, 약 900km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와이너리로 가서 해당 지역의 테루아와 와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와이너리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기록했다. 다시 버스에 올라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꾸벅꾸벅 졸다 보면 다음 와이너리에 도착해 있었다. 그렇게 하루에 3개의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저녁이면 해당 지역의 와인 생산자들과 함께하는 긴 식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여행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나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내 인생에서 캘리포니아는 네 번째였다. 두 번은 엘에이,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가본 곳이 그 두 곳뿐이라 내게 캘리포니아는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가 흘러넘치는 도시의 이미지로 각인됐다. 베벌리힐스와 웨스트할리우드의 팬시한 매력, 끝이 보이지 않는 크리시 필드와 낮은 구름이 걸린 골든 게이트 브리지의 아름다운 자태. 대략 그런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은 것들과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언제나 웃고 화를 내지 않는 여유 넘치는 사람들. 그러나 영화를 통해 각인된 선입견에 따르면 무척 경쟁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이번 여행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달랐다. 파타고니아. 일단 그들은 파타고니아를 입고 있었다. 와인메이커도, 와인 그로워도 열 중 여덟은 파타고니아 패딩이나 베스트를 입고 있었다. 하도 궁금해서 호프 패밀리 와이너리에 갔을 때 그곳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벌써 5년째 입고 있는데 튼튼하고 품질이 좋아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세상에 튼튼하고 품질 좋은 옷은 많지 않은가? “그거 알아요? 파타고니아는 튿어지거나 찢어진 옷을 가져가면 새것처럼 수선해줘요. 그게 환경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저도 이 옷 하나로 겨울을 나다시피 했어요.” 그는 진심이었다. 그들에게 환경을 살리는 기업의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일이다.
거대한 포도밭에 헬리콥터로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리고 더블 트랙 트랙터가 끝이 보이지 않는 밭을 오가며 수천 톤의 포도를 수확하는 곳. 거대 농업 자본들의 집산지. 내가 가진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런 인상은 산산히 부서졌다. 로버트 홀 와이너리에선 그곳의 포도 재배를 책임지는 케인 톰슨을 만났다. 그는 2021년부터 꽤 큰 실험을 진행 중이다. 로버트 홀의 에스테이트 빈야드 40에이커를 대상으로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밭과 ‘재생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밭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실험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재생 유기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했을 때 비용도 줄고, 생산량도 늘고, 테이스팅을 해봤을 때 심지어 와인의 복합미도 더 뛰어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재생 유기농으로 바꾸니까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달라요. 그 전에는 제가 밭에서 뭔가를 묻히고 왔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제 아이가 있는 집에 아무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예요.”
그전까지 나는 사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데 와인 산업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트립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지속 가능한 와인 재배를 위한 노력에 대해 취재하는 것이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결국 중요한 건 와인의 맛이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재생 유기농으로 재배 방식을 바꾸고 나니 집에 갈 때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좀 더 격한 감동의 순간도 있었다. 라플라야 호텔의 다이닝 테라스에선 몬터레이 베이의 서남쪽에 있는 카멜 비치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16명의 와인 전문 저널리스트와 3명의 캘리포니아 와인 인스티튜트 소속 스태프들이 모인 자리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들이 군데군데 끼여 앉았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나 테이블 앞에 서서 말했다.
“제 할아버지가 스위스에서 1905년에 사들인 땅에서 저는 아직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 평생 45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어요. 포도를 처음 심기 시작한 건 1996년이죠. 전 제 두 아들에게 ‘떠나라, 네 꿈을 펼쳐라’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놈은 돌아와서 포도 농사를 같이 해줬으면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두 놈이 다 돌아와서 한 명은 저와 농사를 짓고 또 다른 한 명은 와인을 양조하고 있지요.”
그 남자는 개리 프란치스코니였다. 산타루치아 하일랜드의 와인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두리(Siduri), 테스타로사(Testarosa), 투미(Twomey) 등의 와인메이커들이 그의 포도를 사다가 ‘개리스 빈야드’라는 레이블을 달아 판매했거나 판매 중이다. 개리스 빈야드는 프란치스코니가 자신과 세 살 때부터 친구였던 캘리포니아 피노 누아의 선구자 개리 피소니와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인 ‘개리’를 따서 함께 가꾸기 시작한 포도밭이다. 물론 모든 포도를 팔기만 하는 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노 누아 재배지인 이 밭의 포도로 피소니는 ‘루치아 바이 피소니 개리스 빈야드’를 만들고 프란치스코니는 자신의 레이블인 ‘로어’(ROAR)로 ‘로어 개리스 빈야드’를 만든다. 복잡하고 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는 산타루치아 하이랜드의 키스 리처드, 피소니는 믹 재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어 말했다.
“사람들은 제게 지속가능성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제 손주 녀석이 네 살이에요. 그리고 그 애는 제 포도밭에서 클러스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고, 포도나무 이파리를 잡아당기며 놉니다. 제가 어떻게 제 아들과 손주가 살아가야 할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다가 수십 명이 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서 <발리에서 생긴 일>의 조인성 씨처럼 감정을 다스리며 고개를 위로 올려 눈물을 말렸다.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에겐 굳이 꾸며 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결국 우리는 그냥 농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한 병에 100달러짜리 와인이 서울에 건너오면 10만~20만원이 훌쩍 넘어가곤 한다. 그런 와인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럭셔리다. 그러나 그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전혀 럭셔리하지 않다. 럭셔리한 사람들은 싸구려 와인을 만들고, 럭셔리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험블하다. 물론 통장을 까보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부자일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정말 겸손한 진짜 농부다.
그 순박함을 일깨워준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니의 오랜 친구인 개리 피소니의 빈야드를 찾았을 때였다. 피소니의 포도밭은 해발 440m에 있었고 강수량은 1년에 400mm가 채 안 된다. 밤과 아침엔 너무 춥고, 바람이 거세다. 그 땅을 개리 피소니는 피노 누아의 성지로 만들었다. 피소니의 밭을 두고 로버트 파커는 이렇게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그랑 크뤼.” 개리의 두 아들 중 마크는 포도를 기르고 제프는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피소니 빈야드는 견학 프로그램도 없고, 테이스팅 룸도 없다. 그들의 와인을 살 수도 없다. 모든 와인은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과 업체에 할당제로 판매된다. 그런 곳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우리 일행은 억세게 운이 좋았던 셈이다. 제프 피소니는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행사차 일본과 한국에 가 있어 마크와 제프의 아내이자 와인메이커인 비비아나 피소니(‘카틀레야 와인즈’의 와인메이커)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마크는 자신들이 양봉한 벌꿀을 한참 동안 자랑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는 농부니까요.”
그가 뒤에 보여준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 말은 큰 울림이 없었을 것이다. 이후 마크는 우리를 그 유명한 ‘시멘트 동굴’로 이끌었다. 언덕을 한참 올라 있는 산중턱. 제2차 세계대전 때 만든 듯한 오래된 철문을 밀자 마치 지하 벙커 같은 서늘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트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네 종의 피노 누아와 두 종의 샤르도네를 테이스팅했다. 모두가 황홀감에 젖어 있었고, 나는 이런 포도를 재배한 마크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한 10년은 되어 보이는 콜롬비아 재킷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남자는 진정한 장인이었다. 그런데 피소니 패밀리가 준비한 살시차(이탈리안 소시지)와 함께 남은 와인을 즐기고 있을 때 마크가 우리 팀 사진가에게 말했다.
“물구나무서기 하는 거 보여줄까요?”
옆에 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가 말했다.
“물구나무서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구나무서기거든요. 이렇게요.”
그는 팔짝거리며 손을 짚더니 물구나무를 서다가 처음엔 고꾸라졌다. 그러나 다시, 또다시 시도하더니 결국 우뚝 서서는 한 1분 정도를 버텼다. 대체 왜? 내가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별로 없었다. 마크 피소니는 물구나무서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 그러나 16명의 글로벌 기자단 앞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는 것. 그가 농부라고 말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 마치 프란치스코니가 우리에게 손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그 얼마 전, 멕시코에서 온 와인 저널리스트가 내게 “미국에서 재생 유기농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나 멕시코의 소비자들이 신경이나 쓸까요?”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마크의 물구나무서기를 보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은 그런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농부’라는 그들의 얘기가 단순하지만 엄청난 신념으로 내게 다가왔다.
박세회는 <에스콰이어> 코리아의 피처 디렉터인 박세회는 아트와 와인을 사랑한다. 와인 전문 자격시험인 WSET LEVEL 3 홀더로 세상의 모든 와인을 일단은 마시고 보자는 주의다.
Credit
- EDITOR 박세회
- WRITER 박세회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MONTHLY CELEB
#카리나, #송종원, #채종협, #롱샷, #아이들, #제노, #재민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