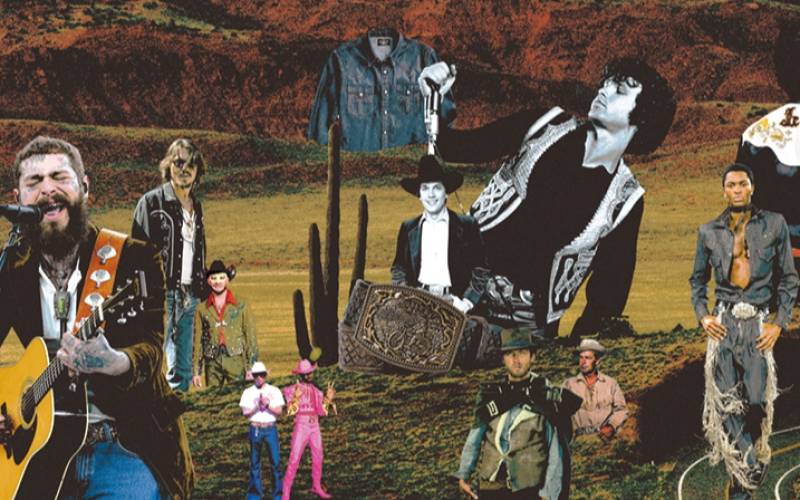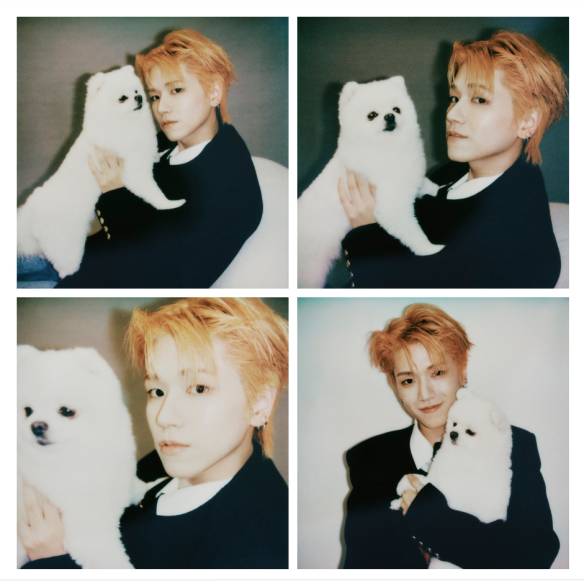STYLE
무대 미술 감독 여신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대미술가이자 시노그래퍼이며 에르메스 윈도의 오랜 인연인 여신동이 홈 컬렉션을 위한 스페셜 윈도를 완성했다. 아름다운 기물들이 꿈처럼 날아다니며 밤의 경관을 만들었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크의 스페셜 윈도.
꽤 오래전 감독님이 무대를 맡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니, 한국 연극계에서 이런 무대연출이 가능해?’라고 생각했지요.
데뷔작은 <빨래>였어요. 두산 아트센터에서 제 데뷔작을 좋게 봐서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신진 연출가 중 하나인 성기웅 연출과 엮어줬어요. 그렇게 맡게 된 작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고, 그 작품으로 동아연극상을 받았죠. 어찌 보면 그 작품의 성공 덕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죠? 저도 그때 “이게 한국에서 흔한 연극은 아니지?”라고 일행에게 물어봤었죠.
그때는 처음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웃음)
(웃음) 지금은 열심히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작품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작품이 없어요. 연극계가 옛날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요. 한때 국내 순수 창작극 시나리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걸 두고 의상감독, 음향감독, 미술감독 등이 힘을 모아 협업하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협업해서 빌드업 할 작품이 없어요. 옛날처럼 정말 직업적으로 ‘무대만 만들어줘’라고 주문하는 연극들이 많죠.
그 시기 감독님의 작품은 설치미술이나 체험미술 같았고, 테크놀로지가 정말 강조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창 그쪽에 집중했어요. 젊을 때라 본 게 너무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걸 다 써먹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불탔거든요. 프로젝터들을 활용해 영상으로 무대를 꾸며서 아마 기술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얇은 스크린들이 중간중간 겹쳐 있었고, 그 스크린에 프로젝터의 광선이 조사되면서 꽤나 입체적인 레이어를 만들어냈던 기억이에요.
잘 기억하시네요. 그 두산 아트센터 무대 깊이가 얕았어요. 그 얇은 무대를 좀 깊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대를 그 뒤로는 잘 못 봤어요.
저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만 유일하게 이런 경향을 선도했고 내가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뒤로 왕성한 신이 사라지면서, 훌륭한 무대 디자이너들이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전 제 뒤에 후배들이 정말 왕성하게 무대를 꾸미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런 디자이너가 없다기 보다는 그런 디자이너를 만들 수 있는 프로덕션이라든지, 기획자들이라든지, 시스템이 부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프로덕션이 자생하려면 토양이 필요한데요.
그건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미술감독이 되기 전에 어떤 작품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부 때 공연을 정말 많이 봤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LG아트센터에서 해외 공연을 정말 많이 기획했거든요. 그때 LG에서 하는 공연은 거의 다 봤어요. 사실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무대미술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외 공연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고, 공연이 너무 재밌고 좋아지기 시작했죠.
어떤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창세기>라는 공연을 봤어요. 성서의 창세기를 대사 없이 일종의 이미지 극으로 꾸민 작품이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이건 뭐…미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냥 ‘우아, 공연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감상과 동시에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무대였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쪽 가슴이 없는 이브가 등장하는가 하면, 셰퍼드들이 무대를 뱅뱅 돌면서 무대에서 삼각 구도를 이뤘던 장면 등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게 이젠 거의 20년 전 기억이니까요. 또 피나 바우슈의 <카페 뮐러> 역시 그랬죠. 사실 무용은 잘 몰라서 피나 바우슈가 누군지도 모르고 봤는데, 너무 훌륭했어요.
감독님은 둘 다 할 수 있지요. 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무용이 무대 위의 시고 연극은 무대 위의 소설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무대미술은 서지 디자인이 되려나요?
저도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참 힘들어요.
감독님은 시노그래퍼라는 타이틀도 쓰지요?
예전의 무대미술은 사실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전 무대 디자이너로 시작했지만, 계속 무대 디자인만 할 생각은 아니었죠.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무대미술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부터 무대 위에 있는 것들을 총괄하는 무대미술가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 직함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무대미술가라는 타이틀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하는 역할처럼 포괄적이지 않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유럽의 극장미술 중에서 세트뿐 아니라 조명까지 장면의 전체를 책임지는 ‘시노그래퍼’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감독님이 에르메스 홈 컬렉션으로 ‘스페셜 윈도’를 꾸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과연 예전 작품들처럼 조명을 아름답게 활용한 결과물이 나왔더군요.
이번에 에르메스에서 제시한 과제가 ‘가벼움의 미학’이었어요. 가벼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빛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적인 언어로 말하면) 실체가 없고 무게가 없는 가벼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빛은 또 엄청나게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죠. 그래서 꼭 빛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자와 오브제들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전에 제가 에르메스의 윈도를 맡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설치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것들, 거의 모든 것을 덜어냈어요. 조명의 도움을 받으면 오브제들이 그림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림자들이 그 사물들의 이면인 거죠. 밤이 되고 조명이 켜지면 그 빛을 통해서 사물들이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뭔가를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보이게 하는 것. 그 방법들이 ‘가벼움의 미학’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해가 진 시간에 쇼룸에서 사진을 찍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약속도 있는 날인데요.(웃음)
감독님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미학적인 아이덴티티 혹은 미학적인 비전이 있나요?
전 무대미술이, 또 공연이 결국 경험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전 관객들이 감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관객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무대미술은 관객을 경험케 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고원>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이 중요하지요.
맞아요. 연희동에서 열고 있는 체험형 전시 <고원>은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해주는 전시예요. 원래 제 작업실이었던 장소를 조금 바꿔서 다도와 명상을 경험하며 1시간을 오롯이 느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자신과 대면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edit
- EDITOR 박세회
- PHOTOGRAPHER 김성룡
- ASSISTANT 송채연
- ART DESIGNER 김동희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