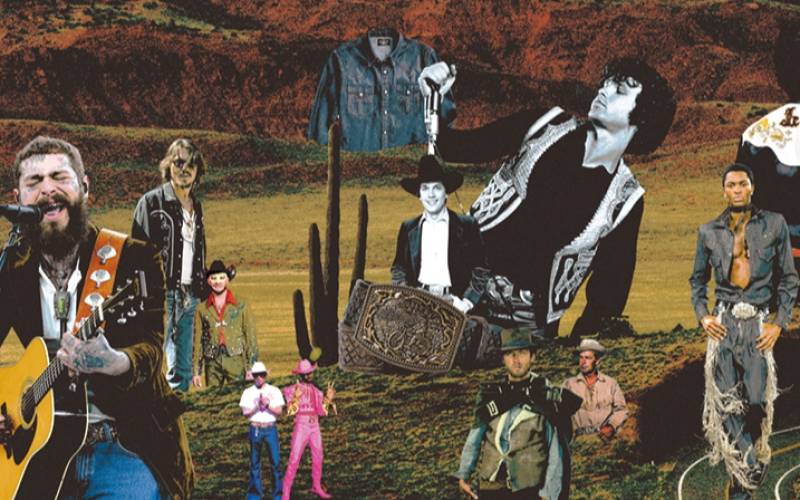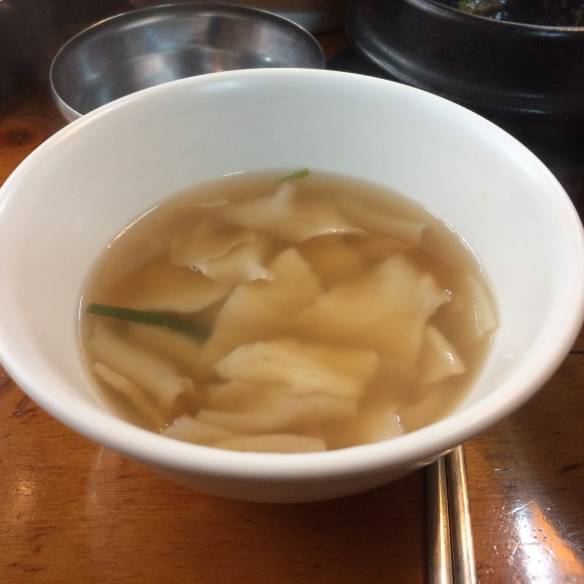주인 없는 집을 거니는 듯한 감흥을 선사하는 세계의 가옥 박물관들
주인이 이미 떠나고 없는,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가 사는 양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 아름다운 저택을 거니는 감흥에 대하여.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백인제가옥은 여러 측면에서 특별한 집이다. 대중에 개방된 서울의 전통가옥 중 가장 큰 공간이고(윤보선 가옥이 가장 크지만 후손들이 기거하고 있어 일반인이 관람할 수 없다), 한옥을 기반으로 근대적 변화를 수용한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으며, 무엇보다 ‘생가’의 의미가 지극히 옅다. 서울백병원 설립자 백인제 선생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의 업적을 기려 터를 보존했다기보다 건축물의 가치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후 해당 가옥의 마지막 소유주였던 백인제 선생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쪽이 더 정확하다. 백인제가옥을 둘러볼 때 느낄 수 있는 감흥이 원서동 고희동가옥이나 계동 배렴가옥에서의 감흥과 다른 것은 이런 차이점들이 응축된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인제가옥은 왜 이렇게 시대가 혼재되어 있느냐고. 어떤 건 조선시대 때 있었을 법한 가구인데, 또 어떤 건 너무 현대적인 가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가옥은 만들어진 당시인 1913년부터 1970년대까지 계속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한 시대를 표현하기보다 한옥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 공간에서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함께 사랑채를 돌아볼 때, 김성룡 학예장이 설명했다.

백인제가옥 Seoul, Korea -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개화기 한옥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한옥. 서울역사박물관 산하 분관으로, 특정 인물을 기리거나 특정 시대를 박제하기보다 ‘시대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주목하는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덕분에 영화 <암살>부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까지 다양한 시대상의 작품에 배경으로 쓰이기도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가옥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관람 해설 예약이 필요하다.

백인제가옥 Seoul, Korea
이쯤에서 주지할 사실이 있다. 이 기사는 한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안채의 사방탁자에 놓인 십이각 화병에 대한 것이다. 유적지를 떠돌다 그런 물건을 마주했을 때 찾아오는 묘한 감각에 대한 이야기. 미국 주 및 지역 역사 협회(AASLH)의 운영부장 베타니 호킨스는 ‘가옥 박물관이 방문자들로 하여금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저는 우리들이 역사에 대한 사명과 엄격한 컬렉팅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적 주택을 얼어붙게 했고 결과적으로 방문자와 장소 사이의 연결점에 장벽을 건설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런 것들이다. 시설이 해당 건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역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연구를 할 것. 시대를 혼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방문자가 과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건물에서 살았던 모든 인물을 이야기에 포함시킬 것. 그 건물이 가진 역사의 어두운 부분도 스스럼 없이 드러낼 것. 흥미로운 건, 백인제가옥의 김성룡 학예장은 AASLH나 베타니 호킨스의 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주 흡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백인제가옥에는 백인제 박사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시설이 전통 한옥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후로 다양한 가족들이 살면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 저 유리문도 원래 한상룡이 처음 지었을 때는 전통 한지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불이 한 번 났었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전부 유리로 갈아 끼운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존 소안 박물관 London, UK - 18세기 영국의 유명 건축가였던 존 소안의 저택. 3개 건물을 사들여 직접 재건축하고 내부를 꾸몄으며, 사후에 박물관으로 쓰이도록 하는 조치도 본인이 직접 했다. 존 소안은 광적인 수집가로, 이집트 파라오의 석관부터 현대 건축물 모형에 이르기까지 3만 점에 달하는 귀중품을 만날 수 있다. 유언대로 그의 사망 시점 그대로 무엇 하나 바꾸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예약이 필요 없고 입장도 무료지만 시설 관리를 위해 방문객 수를 제한한다. ⓒ Gareth Gardner / Sir John Soane’s Museum

존 소안 박물관 London, UK ⓒ Gareth Gardner / Sir John Soane’s Museum

프릭 컬렉션 New York, USA - 미국의 전설적 사업가 헨리 프릭의 맨션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 30세 때 이미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헨리 프릭은 13세기부터 19세기 작품까지 폭넓고 방대한 미술품을 수집했다. 하지만 실상 소장품보다 유명한 건 로마네스크 양식의 실내 정원 ‘가든 코트’다. 2021년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 매디슨 애비뉴의 마르셀 브로이어에서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공간은 2024년 다시 개관할 예정이다. ⓒ Michael Bodycomb / The Frick Collection

W&K 팰리스 Wien, Austria - 오스트리아의 갤러리 W&K에서 연 전시 공간. 1699년부터 1706년까지 지어진 대저택 팰리스 쇤보른 바티야니에 위치해 있는데, 갤러리 운영은 화이트 큐브에 가깝게 재단장된 공간에서 하며, 당대 바로크 양식을 고스란히 살린 전시실에서는 3~4개월 지속되는 현대미술 전시를 연다.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크 클래식 콘서트홀인 비너 바로크 오케스트라도 만날 수 있다. ⓒ W&K- Wienerroither&Kohlbacher, Vienna, Austria

뮤제오 델 로만티시스모 Madrid, Spain - 낭만주의 시대 상류 부르주아의 일상과 풍습을 재현한 박물관. 1779년에 지어진 후 다양한 인물의 저택으로 활용되다 왕립 관광 위원회의 본부가 되었다. 스페인은 오래된 가옥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데에 익숙한 나라로, 박물관은 무려 1924년에 개관했다. 자연히 오랜 세월 여러 번의 복원을 거쳤으나 특유의 분위기를 잃지 않았다는 평을 받는다. ⓒ Javier Rodriguez Barrera / Museo Nacional del Romanticismo
Credit
- EDITOR 오성윤
- PHOTOGRAPHER 박기훈
- ART DESIGNER 주정화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