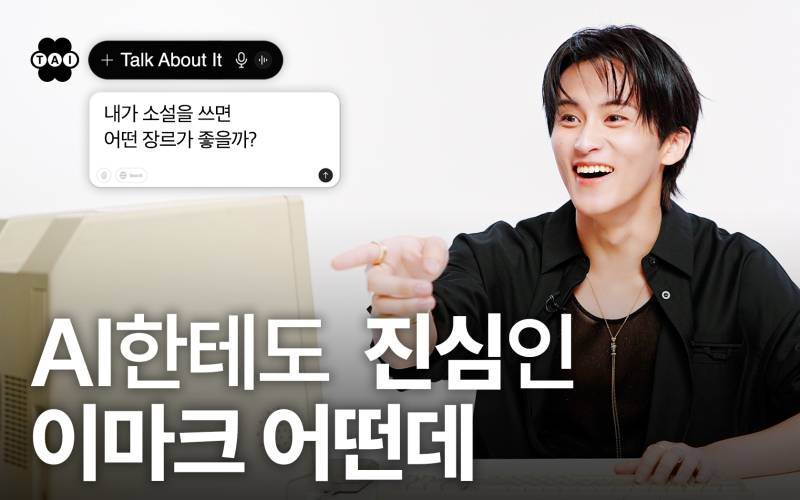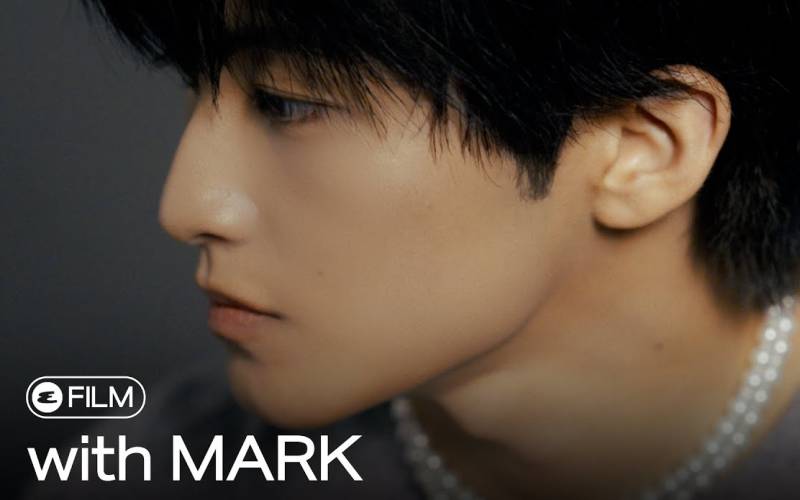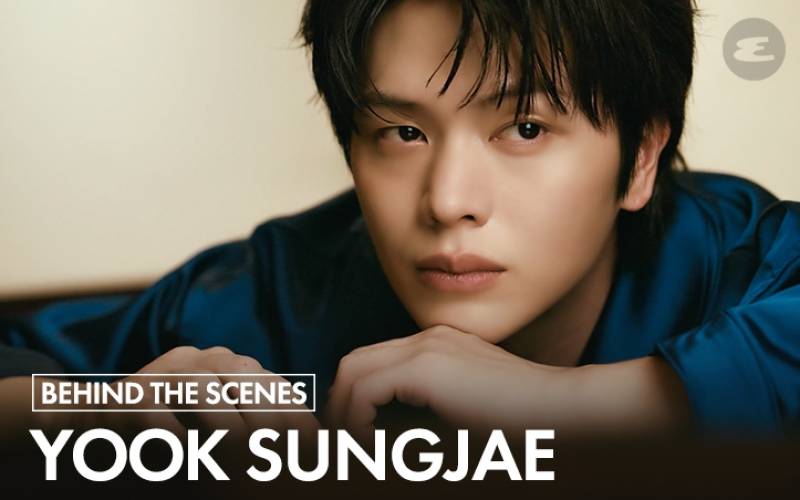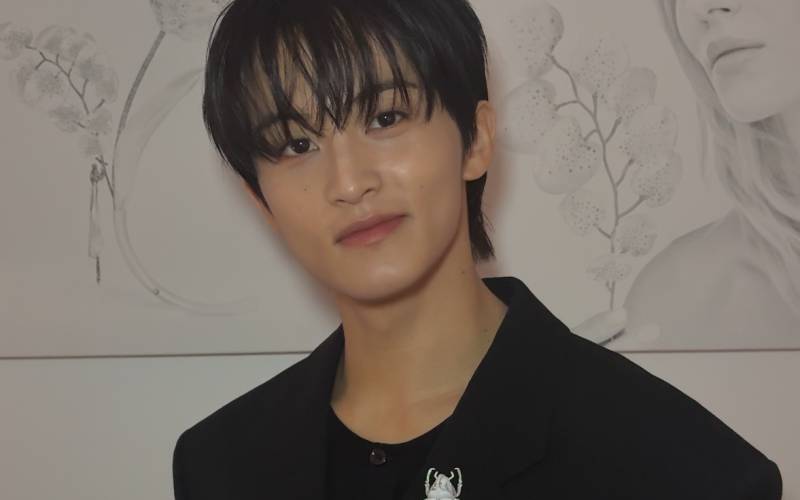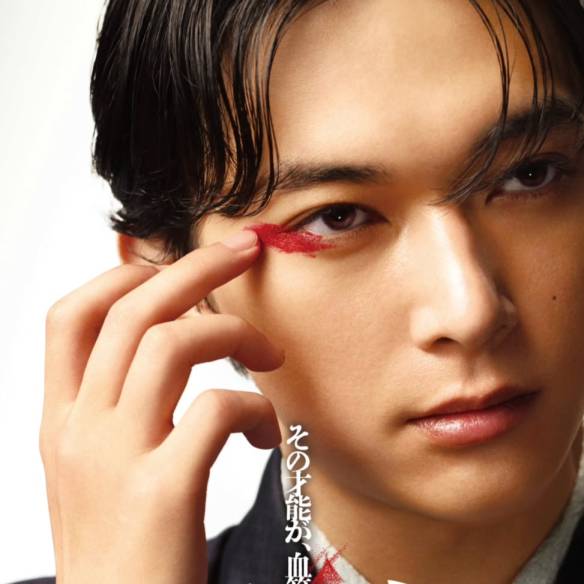STYLE
로리엘 벨트란이 만드는 평면의 레이어
물감을 틀에 붓고 말리고 붓고 말려서 거대한 물감 시루를 만들고, 얇게 편을 내 나무판에 붙이면 로리엘 벨트란이 부리는 레이어의 마법이 시작된다. 레이어가 없는 평면이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로리엘 벨트란을 그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 리만 머핀에서 만났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신의 스튜디오에 서 있는 로리엘 벨트란. 그가 오른팔을 올린 나무틀 안에 또 다른 물감의 레이어들이 굳어가고 있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작업 방식 자체에 미술사 전반에 걸친 첨예한 논의들이 드러나죠. 작업 방식을 설명해주세요.
최종 작품의 폭과 길이가 같은 큰 틀에 페인트를 부어요. 그 페인트의 레이어가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 레이어를 붓지요. 이걸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작품은 레이어가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레이어가 굳는 데 사흘 정도 걸리니까 약 60일이 걸리는 셈이죠. 다 굳으면 그걸 특수 절단기를 활용해 긴 면에 평행하게 잘라내요. (진공 포장되어 있던 거대한 삼겹살 덩어리를 선명한 지방과 근육의 레이어가 드러나게 정육점에서 잘라주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그렇게 잘라낸 긴 면들을 나무틀에 차곡차곡 붙여 완성하지요. 작업 방식을 생각해보면 틀의 높이는 작품의 레이어를 잘라낸 단면의 높이와 같고, 틀의 폭은 평면으로 붙은 레이어들을 평행하게 붙였을 때와 같겠지요.
레이어를 이루는 물감들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넣기도 하고, 어떤 형상이 드러나게 디자인하기도 하지요.
맞아요. 틀에 물감을 붓기 전에 최종 형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면 좋을지 그 방식을 드로잉해보기도 하죠. ‘Studio Collapse’(2023)에서는 석고처럼 굳은 채 작업실에 남아 있던 라텍스 페인트 덩어리들을 중간중간 넣었고, ‘Space(styrofoam)’(2023)에서는 주운 스티로폼 컵을 넣어 패턴을 만들기도 했어요. 위에서 페인트를 똑똑 떨어뜨려 레이어의 중간쯤에 물방울처럼 맺히게도 하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 갤러리 소속의 매튜 데이 잭슨이라는 작가와 인터뷰를 하다가 제스처와 익스프레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작품엔 액션 페인팅 같은 예술적 제스처의 산물과 철저하게 디자인된 표현의 의지가 모두 들어 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뭔가를 택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작품에는 물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고 그런 상반된 성향이 있다는 걸 제가 참 좋아해요. 한쪽에서 보면 제 작품은 기하학적인 추상 영역에 들어가요. 선과 색만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요. 표현주의의 정반대에 있는 셈인데 또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만은 없단 말이죠. 물론 이런 시도를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의 경우도 범주화하기 힘들어요. 언뜻 보면 그리드로만 되어 있는 지루하고 따분한 작품 같지만, 그 안에는 매우 강렬하고 그 자체가 마치 살아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번 전시에 걸리지 않은 작품 중에 ‘Diana I(Renoir)’(2023)와 ‘Figure(after Rubens)’(2007-2019) 등 레퍼런스가 분명한 작품들도 있지요. 전 정말 그것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종합적으로, 전 회화 자체가 일종의 축적 매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회화 작품을 볼 때 그전에 봐서 기억에 남아 있는 모든 회화 작품의 이미지 위에서 받아들이죠. 제가 이렇게 페인트를 붓는 ‘레이어 연작’을 구상하게 된 이유예요. 그 행위 자체가 축적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회화의 미술사와 제 작품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듯이) 제가 아는 모든 회화사를 틀 속에 부어 굳히고 잘라서 이 작품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 행위 자체가 저로서는 회화적 영감과 단상들을 집대성해 틀에 넣어 포함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레퍼런스로 삼은 건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었죠. 일단 루벤스는 제가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인물 표현에 정말 탁월하죠. 움직임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가 그린 사람의 등 근육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죠. 특히 그의 화폭 안에 있는 것들에선 힘과 무게를 느낄 수 있는데, 전 이게 너무도 좋고 회화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물의 움직임은 조각적인 요소라는 생각도 들고요. 르누아르의 경우는 레퍼런스로 삼은 건 사실인데, 루벤스처럼 좋아해서는 아녜요. 객관적으로 훌륭하다는 건 알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죠. 르누아르의 작품 ‘Diana’를 레퍼런스로 삼았던 이유는 그가 인상주의, 즉 근대가 시작되던 시기의 화가였기 때문이에요. 그 전환의 시대에 르누아르가 취한 포지션이 아주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작품을 레퍼런스로 삼았지요.

‘Diana I(Renoir)’, 2023, latex paint on panel, 132.1 x 101.6cm.
제 인상이 맞았군요. 처음 작품을 보고 거의 학구적이라고 할 만큼 미술사의 여러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정도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일은 작가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한 50대는 되어야 성취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두 번째 생을 살고 계시나요?(웃음)
일단 저는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웃음) 저는 제가 정말 행운아였다고 생각해요. 예술고등학교를 다녔고, 다양한 미술 방법들을 실험해볼 기회가 있었죠. 디자인, 건축, 비디오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좀 강박적이고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땐 스튜디오에서 먹고 자며 몰두했지요. 젊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와 스튜디오 렌트를 둘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스튜디오였거든요. 이후에 일어난 일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꽤나 계획적인 성격인데, 제가 계획하지 못한 건 제 두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가지면서는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오히려 저를 밀어붙이는 힘이 됐어요. 또 하나는 다른 작가들과 함께 갤러리를 운영해본 경험입니다. 작가의 입장이 아니라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모든 게 행운이었어요.
당신 작품은 정말 완벽하게 논리가 뒷받침된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데, 언제 완성된 스타일이고 또 그전에는 어떤 작품을 했나요?
전 사실 대학 때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하긴 했어요. 지금처럼 층층이 쌓고 올리는 작업들이었죠. 다만 특수 제작된 절단기가 없어 제대로 절단하진 못했죠. 전시도 못 했고요. 물론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작품들도 하긴 했어요.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한 셈이죠. 졸업 이후에 열린 첫 전시회 때도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긴 했고요. 사이즈는 훨씬 작았지만요. 지금처럼 큰 화폭을 채우려면 거대한 머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프 쿤스와 래리 푼스를 다룬 <쿤스 앤 푼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한 작가가 평생 하나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도 힘들고 해내지 못하는 작가도 상당수다’라는 내용의 대사가 나와요.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 하나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완성했어요. 그다음이 걱정되진 않나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어쩌지? 소재가 전혀 생각나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었죠. 재밌는 게 지금은 오히려 반대예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가진 생각들을 평생 다 해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요. 회화뿐 아니라 설치, 사진,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도 생각 중인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당신에게 평면이란 무엇인가요?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게 평면이란 거짓말이죠. 허상이에요. 정말 평면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Credit
- EDITOR 박세회
- PHOTO 리만 머핀
- ART DESIGNER 김동희
CELEBRITY
#마크, #류승룡, #이주안, #류승범, #백현, #카이, #정우, #이수혁, #안효섭, #엔믹스, #육성재, #양세종, #윤성빈, #추영우, #차은우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