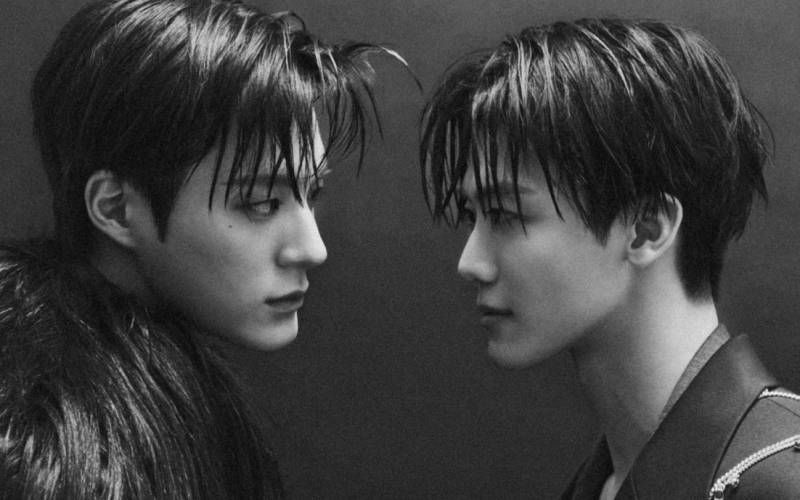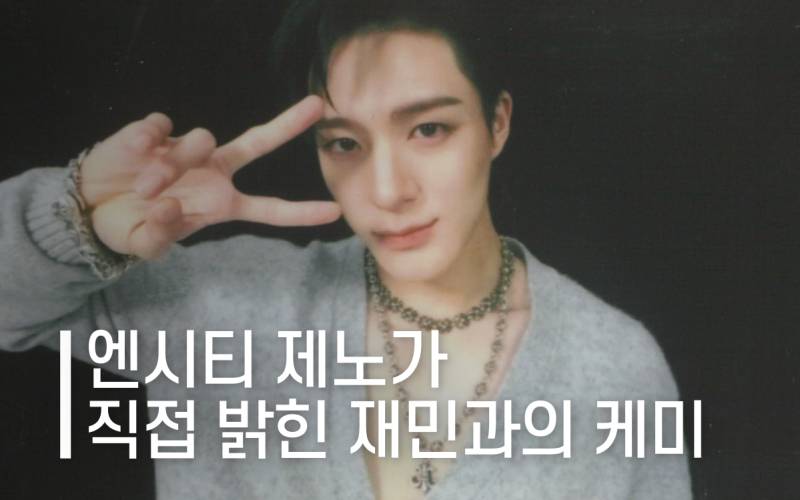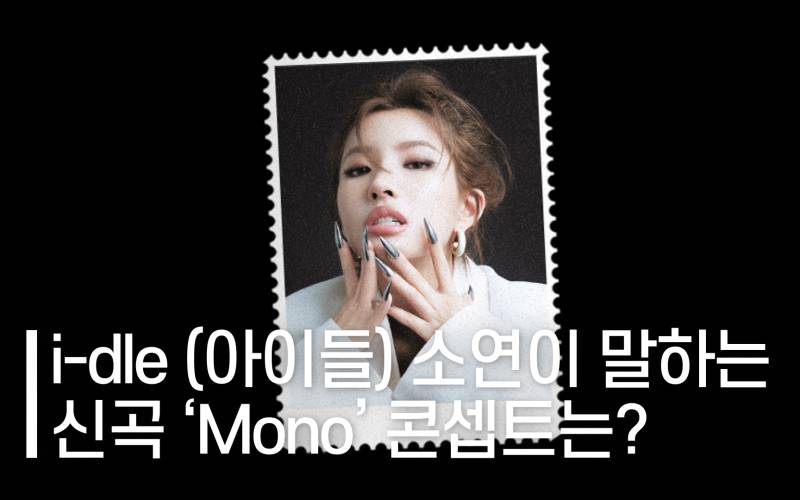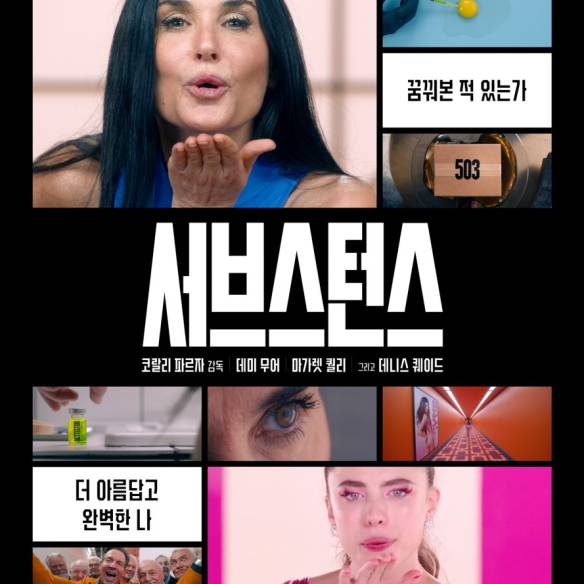LIFE
이강승, 베니스에 씨앗을 심다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한 이강승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의 씨앗들은 이제 곧, 아니 벌써 피어나고 있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오래전 구찌와 함께한 전시 <이 공간, 그 장소 : 헤테로토피아>의 전시 공간을 작품 ‘Covers(Queerarch)’가 가득 채우고 있던 게 기억나요. 압도적이었죠.
막상 전 팬데믹 때라 전시장엔 못 가봤어요. 그 전시는 예술가로서의 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굉장히 많이 배제하고 그 방대한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만든 작업이었어요. 국내 최초의 동성애 잡지 <버디>를 비롯한 <어드보케이트(Advocate)> <더 가이드(The Guide)> 등의 매체, 주류의 역사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의 서사를 최대한 잘 보여주기 위해 그 커버들을 스캔해 방 안을 가득 채운 작품이었요. 2015년부터 해온 ‘Covers’라는 작업과 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자기 자신을 표지 속에 숨기는 걸 ‘커버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일종의 페르소나 뒤에 숨는 거죠. 동성애자의 경우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애매모호하게 숨기는 걸 커버링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쓰는 ‘커버링’은 더블 앙탕드르(double entendre,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어구)인 거죠.
전 소묘 작업들을 보면서 여러 번 울컥했어요. 예를 들면 ‘Briefly Gorgeous’에서 고 변희수 하사와 고 김기웅 씨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소묘나, 쳉퀑치가 찍은 션 매쿠웨이트의 폴라로이드를 흑연으로 그린 작품을 볼 때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가가 이런 노동집약적인 소묘를 그릴 때는 감정을 담아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분리된 프로세스예요. 감정은 그전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금실로 자수를 한다거나(예를 들면 ‘Skin’ 등의 시리즈), 드로잉을 할 때는 오히려 기계적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은 기술과 노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예술적인 과정과 기술적인 과정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복적인 작업이 띠는 독특한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퀼트가 그렇죠. 퀼트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여서 코뜨기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 작업 중에서 노동집약적인 소묘나 자수 등은 마치 퀼트와 같아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더라도 동시에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감정이 일기보다는 뇌 속에서 명상과 비슷한 과정이 벌어지는군요.
예. 명상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연구 조사에 대한 영감일 수도 있고요.

‘Untitled (Constellation)’, 2023, 15x300x75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Commonwealth and Council.
전 ‘강승 작가님의 소묘 과정은 기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기도와 비슷한 과정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대상을 정하고 과정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 개념으로 제 작업에 접근하기 때문에 천과 자수, 종이와 흑연 등의 미디엄을 선택한 거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물론 100% 개념적인 건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종종 그런 걸 분리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제 작업 방식, 쉽게 말하면 제 작업 방식 설명서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노동집약적인 부분과 공예적인 완성도에 집중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그 어떤 해석도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제게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기술적이고 공예적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설명서로 남겨진 솔 르윗의 벽화를 생각해봐요. 지시문대로 하더라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어쨌든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가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제 작품은 노동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고른 미디엄이에요. 흑연 소묘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들이 전부 보여요. 바느질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관객들은 그 선과 한땀 한땀 보면서 제 노동을 상상할 수밖에 없죠. (작품의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담은 이야기를 현재로 불러와 함께 얘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자르디니의 전시에선 싱가포르의 포트로드 해변과 미국의 엘리시안 공원에 있는 씨앗과 식물들을 그린 드로잉을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전시장 바닥에 가지런히 늘어놨어요. 전 그 방식이 너무도 상냥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술에는 너무도 많은 방법이 있어요. 쇼크를 줘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운다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든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든지요. 저는 개념적이면서도 ‘서틀’한 예술에서 감명을 받아요. 그런 작업이 오래 지속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술과 전시는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술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죠. 제 작품이 쳉퀑치나 오준수의 존재에 대해 공동이 경험하고 그에 대해 다시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공동의 경험을 위한 씨앗이군요. 이번 전시에서 본 문구가 생각나요. “넌 날 묻으려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씨앗이라는 걸 잊었지”라는 문구요.
“What didn’t you do to bury me, but you forgot I was a seed.” 그건 그리스의 디노스 크리스티아노풀로스의 시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당신의 작품들이 그런 콘텍스트들을 알기 전에도 이미 조형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흔히들 제가 연구조사 위주의 작가라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 동시에 시각미술가죠. 그래서 작품이 시각미술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무용 등의 다른 예술과는 다르게 시각예술이 갖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작업을 봤을 때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이유예요. 심리학 용어로는 어펙트(Affect) 한국어로는 ‘정동’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그런 현학적인 말들의 근원은 느낌이에요.
데릭 저먼의 정원은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인위적으로 예쁘게 가꿔놓은 정원이 아녜요.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에 많은 것을 맡기고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그 해안가가 전부 자갈밭이라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광활하게 펼쳐진 자갈 해변에 펜스도 없이 갑작스럽게 꽃과 식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보존되는 지역이라 누구나 가볼 수 있어요.
당신에게 씨앗이란 뭔가요?
씨앗은 피어날 가능성을 지닌 이야기들이에요. 상황만 맞으면 200년이 지나도 다시 피어나게 될 어떤 존재들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한 리버풀처럼요?
맞아요. 씨앗을 생각할 때 마리아 테레스 아우베스라는 작가의 ‘Seeds of change’라는 작업을 생각해요. 배를 바다에 띄울 때는 배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밸러스트’를 설정해줘야 한대요. 일부러 바닥에 무거운 짐들을 부려서 무게중심을 맞추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 식민 시대 때는 흙이나 돌로 그 무게를 맞추곤 했죠. 노예상선들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흙을 배에 채운 채로 유럽의 항구에 도착해 그 흙과 돌들을 앞바다에 버렸어요. 아우베스는 1999년부터 마르세유, 리버풀, 됭케르크, 브리스틀, 레포사리 등의 앞바다에서 흙을 퍼 올려 샘플을 채취하고 그 안에서 씨앗을 찾아 심었어요. 그리고 휴면 상태에 있던 씨앗들이 아프리카의 식물을 발아했죠. 사실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정말 말 그대로 전시장에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자르니디’라고 하는 비엔날레 베뉴의 뜻이 그냥 문자 그대로 ‘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Credit
-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lery Hyundai
- ASSISTANT 신동주
- ART DESIGNER 박인선
MONTHLY CELEB
#카리나, #송종원, #채종협, #롱샷, #아이들, #제노, #재민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