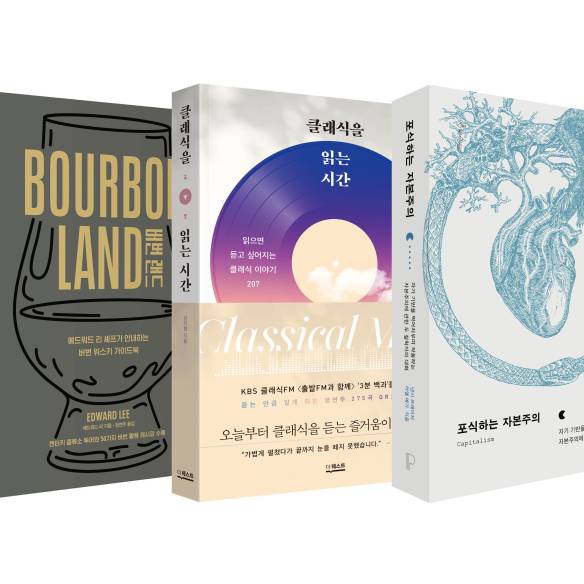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비엔나관광청이 새롭게 낸 캠페인 주제는 자그마치 '죽음'이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있고 싶은 곳’. 비엔나관광청이 내건 새로운 홍보 캠페인 슬로건은 이랬다. 3박 4일 동안 비엔나에 머물며 오직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곳들을 떠돌아다녔다. 지극히 명랑한 태도로.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무덤인 카푸친 크립트 내부.
최근 비엔나관광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캠페인의 슬로건은 이랬다. ‘비엔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있고 싶은 곳(Vienna: The last place you want to be)’. 역시나 비장하고 진중하게 들리는 캐치프레이즈지만, 한 꺼풀 들어가보면 묘한 뉘앙스를 발견하게 된다. 캠페인 영상 속에서는 루니 툰 캐릭터풍으로 그려진 하루살이가 비엔나 시내를 헤집고 다닌다.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카페, 공동묘지, 트램, 와이너리까지. 비엔나 곳곳을 둘러본 하루살이는 일몰 때가 되어서야 와인 테이블 위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하루살이의 사체 위로 저승사자가 등장하지만 저승사자도 곧 와인병에 깔려 사망한다. 좀 별난 기획자가 비엔나의 보편적 감성에서 돌출된 캠페인을 만든 것 아니냐고? 해볼 만한 의심이지만, 비엔나 중앙묘지 같은 곳을 거닐며 파격적일 만큼 아방가르드한 묘비들을 구경하거나 원내 장례 박물관에서 꼼꼼히 아카이브한 물건들을 훑다 보면 알게 된다. 비엔나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대체로 그 오묘한 유머 감각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렌투룸 내부에서 전시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에두아르드 윈터 큐레이터.
카푸친크립트 역시 비엔나의 흥미로운 묘지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카푸친 수도회 성당의 지하실에는 마치 포도주 저장고처럼 구획된 실내에 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으니, 그 정체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무덤이다. 별다른 사전조사 없이, ‘상징적인 장소일 뿐 설마 실제 시신은 다른 곳 어딘가에 묻혀 있겠지’ ‘시신이 이곳에 있다면 해부를 해서 부패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한 상태로 넣었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품고 간다면 그곳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장소가 된다. 옷을 차려입고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아무 처리도 없이 그대로 관에 넣은 시신들이 아직도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카푸친크립트의 안내 직원은 웃음 띤 얼굴로 “오래됐으니까요” 하고 답했다. “옛날에는 아마 이 공간 전체에 시체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티롤의 안나 황후가 남긴 유언을 바탕으로 16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이 공간은 2011년 타계한 오토 황태자의 시신에 이르기까지, 다섯 세기에 걸친 역사를 품고 있다. 물론 풍부한 이야기들도. 안내 직원이 관을 둘러싼 여러 상징들을 설명할 때, 사망 당시의 그림과 관을 실제로 열어봤을 때 찍은 사진을 비교하며 챙이 넓은 모자가 사라진 부분을 짚었을 때, 지금껏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슬쩍 알려줬을 때, 관람객들은 비엔나 특유의 태도에 물들기라도 한 듯 그 공간의 무게를 잊고 농담을 하거나 소리 내 웃기도 했다.

비엔나 행동주의미술관에 걸린 헤르만 니치의 작품.
“어떤 측면에서는, 비엔나 사람들은 늘 죽음이라는 관념 가까이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오폴트 미술관의 PR팀 책임자 클라우스 포코르니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분명 평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테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가 늘 비엔나 중앙묘지에 데려가곤 했던 어린 시절부터 클림트의 그림들에 둘러싸여 사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계속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부분이 있는 거죠.” 클림트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매료된 화가였고, 명실공히 그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으로 표현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레오폴트 미술관의 입장권에는 그의 작품 ‘죽음과 삶(Death and Life, 1908)’이 그려져 있었다. 갓난아기 하나를 품에 든 다채로운 표정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패턴으로 뒤섞여 있고, 바로 곁에서 저승사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 비엔나까지 왔다면 이 그림을 꼭 실물로 볼 필요가 있다. 커다란 규모가 주는 박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짝 다가서면 보이는 ‘덧칠의 흔적’ 같은 부분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클림트는 1911년 로마 국제 미술 전시회에서 1등을 한 이 그림을 1915년에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액자에 들어간 채로 수정하는 바람에 프레임에 이렇게 페인트가 묻기도 했죠.” 비엔나에서 활동했던 클림트는 역시나 비엔나에서 눈을 감았다. 20세기 비엔나의 화가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관념이란 늘 가까이 있는 것이었을까? 에곤 실레의 그림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혹은 올해 초 문을 연 비엔나 행동주의미술관에서 엿볼 수 있는 육체와 파괴를 향한 온갖 시선들을 보다 보면, 분명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1200여 개의 해부학용 밀랍 인형을 포함해 고전주의 시대의 의료 유물을 구경할 수 있는 요제피늄, 고인이 머물렀던 생가를 당시 분위기까지 그대로 유지하려 노력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물관, 다뉴브강에 떠내려온 시체들을 안치한 ‘이름 없는 자들의 무덤’까지, 이외에도 비엔나 곳곳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영감으로 가득한 곳을 만날 수 있다. →

비엔나 중앙묘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명인들의 독특한 묘비들.
Credit
- PHOTOGRAPHER 오성윤
- ART DESIGNER 최지훈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