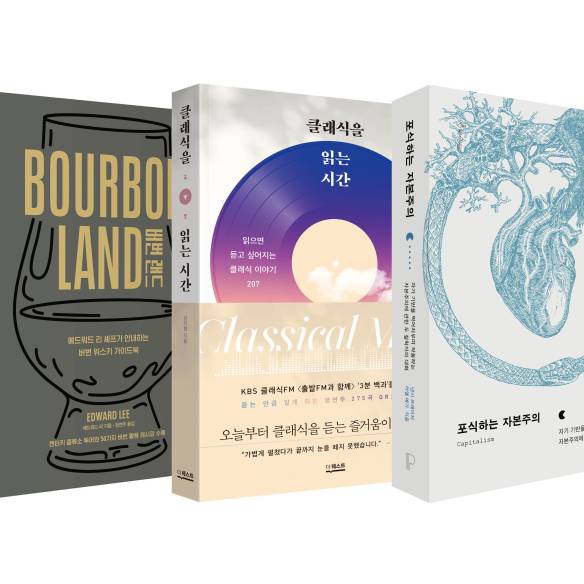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 우리의 마음속엔 미디어가 주입한 도시의 심상이 있다. <애틀랜타>를 본 사람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흑인이 힙합 뮤지션이거나 힙합 뮤지션의 친척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8 마일>을 본 에미넴의 팬이라면 디트로이트 다운 타운에 발만 디뎌도 총을 맞을 수 있다며 두려워할 것이다. 유튜브로 샌프란시스코 랜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 소굴이 되었다고 여길 테고, 라스베이거스가 여러 영화에서 다뤄진 방식을 생각하면, 그곳이 지난 20년 사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에스콰이어 코리아>는 다음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미국의 다섯 도시의 조금 다른 실상을 기록하기로 했다.
LONG ISLAND
뉴욕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뉴욕시를 구성하는 5개의 자치구(borough)는 제일 북쪽에 위치한 브롱스(the Bronx, 정관사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지명이다)를 제외하면 모두 섬이다. 맨해튼과 스테이튼아일랜드는 그 자체로 섬이고, 퀸스와 브루클린은 롱아일랜드 가장 서쪽에 있다. 그러니까 퀸스, 브루클린을 제외한 롱아일랜드의 나머지 지역은 뉴욕‘주’지만 뉴욕‘시’는 아니다. 이 섬의 애매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프렌즈>나 <사인펠드>처럼 맨해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시트콤을 보면 롱아일랜드는 중산층이 사는 따분하고 숨 막히는 교외 지역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이 롱아일랜드를 그저 화려한 뉴욕시의 베드타운 정도로 생각하기에, 별달리 존재감도 없다. 하지만 롱아일랜드는 ‘하와이와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lower 48’이라 부른다)’에서 가장 큰 섬이다. 면적이 제주도의 2배라고 생각하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다. 뉴욕을 벗어나 롱아일랜드의 동쪽 끝 몬턱(Montauk)까지 운전하면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I-495)를 이용해도 3시간은 달려야 한다. 롱아일랜드로 처음 이사 갔던 당시의 일이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한밤중에 맨해튼을 나와 퀸스에 들어섰다가 길을 잃었었다. 주유소에 들러 “I-495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은 주인은 나를 잠시 멍하니 보더니 내가 들어본 가장 찐한 뉴욕 억양으로 “You mean, L.I.E.?(L.I.E.를 얘기하는 거요?)”라고 되묻더니 표현을 정정하고는 방향을 일러줬다.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아무도 I-495라고 부르지 않아요! 엘.아이.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여한 도로명(I-495)이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굳이 ‘롱아일랜드 익프레스웨이’의 줄임말인 L.I.E.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표현은 롱아일랜더를 구분하는 십볼렛(shibboleth)이고, 정체성의 일부다. 하지만 워낙 큰 섬이다 보니 정체성 운운하기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쪽 끝 퀸스, 브루클린 사람들은 스스로를 뉴욕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롱아일랜더라는 의식이 강하지 않다. 동쪽 끝에 있는 햄프턴(The Hamptons)과 새그하버(Sag Harbor), 몬턱은 맨해튼 부자들의 주말 별장과 저택들이 모인 휴양지이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의 정체성 역시 뉴욕 시민에 가깝다. 즉 ‘롱아일랜더’는 롱아일랜드 양쪽 끝을 제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흔히 뉴욕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세인 지역이라고들 하지만, 롱아일랜드 주민들 중에는 트럼프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롱아일랜드 서쪽 끝 뉴욕시와 동쪽 끝 휴양지를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블루칼라 거주지이고, 농사를 짓는 곳도 많다. 이 섬이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 대륙 동서의 해안가에 진보적인 주와 도시가 많고, 중앙부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는 구도와 똑같기 때문이다. 할리우드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역이 동부나 서부라서 중서부 지역 주들의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그냥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곳들이라 하여 ‘flyover states’라고 부른다), 심지어 뉴욕 시민들도 롱아일랜드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맨해튼 사람들은 햄프턴, 몬턱까지 주로 L.I.E.로 운전하거나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롱아일랜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잘 모른다. 내가 살던 미들아일랜드(Middle Island)라는 타운은 이름 그대로 이 섬 중앙에 있는 곳이었다. 그리로 가다 보면 흑인들이 대부분인 동네도 지나야 하는데, 무단횡단이 흔해서 항상 긴장해야 했고, 그 지역이 아니어도 대부분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어서 전반적으로 침울한 분위기였다. 미국 특유의 볼 것 없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등장하는 스트립몰(strip mall, 작은 상가들이 모인 곳)이 있고, 그런 곳들 중에는 가난을 상징하는 전당포와 달러 스토어, 코인 세탁소가 있는 곳도 많다. 그렇다고 롱아일랜드 중심지역이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북쪽과 남쪽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부촌들이 많이 숨어 있고, 그곳 주민들은 맨해튼을 비롯해 뉴욕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끔찍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길고비치(Gilgo Beach) 연쇄살인 사건이다. 롱아일랜드 남쪽에 있는 해안에서 11구가 넘는 사람의 뼈가 몇 년에 걸쳐 발견되어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의 용의자는 작년에 체포되었는데, 롱아일랜드에서 살면서 맨해튼에서 일하던 부유한 백인 건축가로, 그가 죽인 피해자들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 성매매를 하던 가난한 여성들이었다. 롱아일랜드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해수욕장만큼 롱아일랜드의 빈부와 인종 구성을 잘 보여주는 곳도 드물다. 유명한 해수욕장들은 모두 남쪽에 있는데, 뉴욕에서 제일 가까운 롱비치(Long Beach)나 존스비치(Jones Beach), 길고비치에 가면 유색인종의 비율이 높고, 몹시 붐비고, 곳곳에서 귀를 찌르는 힙합 음악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남쪽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할수록 음악 소리는 잦아들고, 사람들은 적어지고, 백인이 많아진다. 도시에서 오기에는 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이동하다가 햄프턴에 도달하면 해변은 아예 외부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닷가에 진입하는 지점에 주민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퀸스와 브루클린을 제외한 롱아일랜드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지지 지역이 된 건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지만, 햄프턴을 비롯해 동쪽 끝에 사는 부자들도 절반 정도는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아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라는 것도 도시 노동자들의 얘기지, 부자들은 다르다는 얘기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의 부촌 알파인도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럼 그런 부자들이 사는 햄프턴은 어떤 곳일까? 내가 동부에 살면서 본 가장 부유한 동네다. 나는 롱아일랜드를 찾는 지인들에게 어차피 관광객은 햄프턴의 해변에 가기 힘드니 더 동쪽으로 가서 끝에 있는 몬턱의 해변에 가라고 권하지만, 그래도 햄프턴에는 꼭 들러서 천천히 운전하며 그곳 특유의 풍경을 감상하라고 권한다. 담은 없지만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넓은 땅 한가운데 오두막처럼 작은 집들이 있어서 ‘저게 정말로 부자들의 집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올드 머니, 즉 대대로 상류층이었던 사람들은 부를 집의 크기로 자랑하지 않는다. 적어도 햄프턴에서는 그렇다. 대신 집 마당에 칼더(Calder)나 세라(Serra) 같은 20세기 거장 조각가들의 거대한 작품이 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햄프턴도 변한다. 약 20년 전부터 뉴머니, 즉 근래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햄프턴에 몰려와서 특유의 작은 집들을 부수고 지역 문법을 무시한 거대한 맥맨션(McMansion)을 지으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햄프턴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자 몬턱으로 이동해 한때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던 그곳을 햄프턴 같은 부유한 휴양지 마을로 바꿔놓기도 했다. 차이가 있다면 몬턱은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찾아가 즐길 해안이 있다는 것. (동쪽 끝이다 보니 새해 첫날에는 꼭 일출을 봐야 하는 한국인들로 붐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롱아일랜드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nothing ever happens)” 곳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롱아일랜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 작가 이창래(Chang-rae Lee)의 소설 <Aloft(2004)>와 배우 폴 다노의 데뷔작인 영화 <L.I.E.(2001)>다. 롱아일랜드의 블루칼라 계층이 미국 남부처럼 가난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 가장 시끄러운 도시 뉴욕 옆에 있다 보니 이곳 주민들이 느끼는 무료함과 공허감, 우울함에 특유의 비애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진부한 표현이기는 해도–그곳에도 사람이 산다. 미국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에만 집중하다가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중서부와 그곳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동부 사람들도 진짜 롱아일랜드와 그 주민을 잘 모른다. 그런, 조금은 씁쓸한 의미에서 롱아일랜드는 미국의 축소판이다.
Who’s the Writer? 박상현은 <오터레터> 발행인이다. 여러 매체에 테크와 미디어, 문화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New York State Route 25
롱아일랜드의 전형적인 풍경을 보려면 L.I.E.를 따라 운전하지 말고 25번 주도를 따라 이동해보는 걸 권한다. 미국에 오래 산 사람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하이웨이지만, 외지인에게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상적인 미국 풍경을 보여준다. 이 도로 주변이 가장 평균적인 롱아일랜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Jones Beach State Park
길고비치는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곳과 바로 옆에 있는 존스비치는 매년 5월에 열리는 베스페이지 에어쇼를 구경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해변에 누워서 미국의 블루엔젤스 팀을 비롯해 각종 비행기가 해안선을 따라 굉음을 내며 낮게 비행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다. 귀마개는 꼭 챙겨야 한다.
Smith Point Beach
3시간 동안 운전해서 몬턱까지 갈 마음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스미스포인트해변을 권한다. 롱아일랜드 서쪽의 번잡함과 동쪽의 호젓함이 적당히 섞인 이곳은 1996년 JFK를 출발해 파리로 가던 TWA 800이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고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