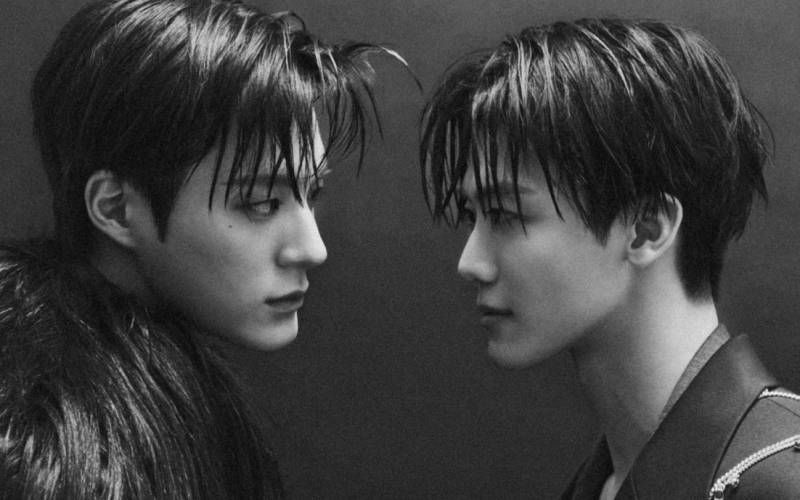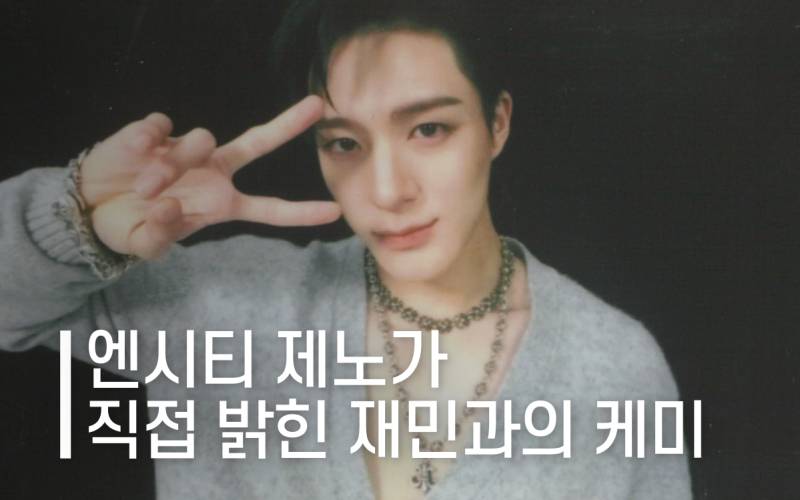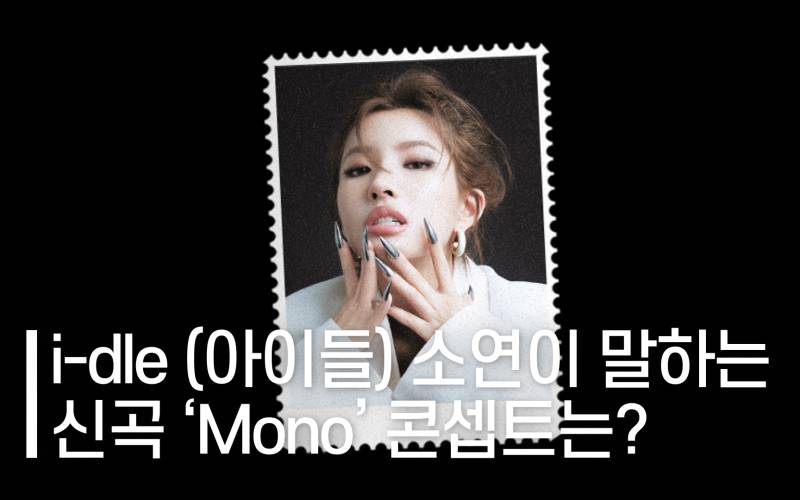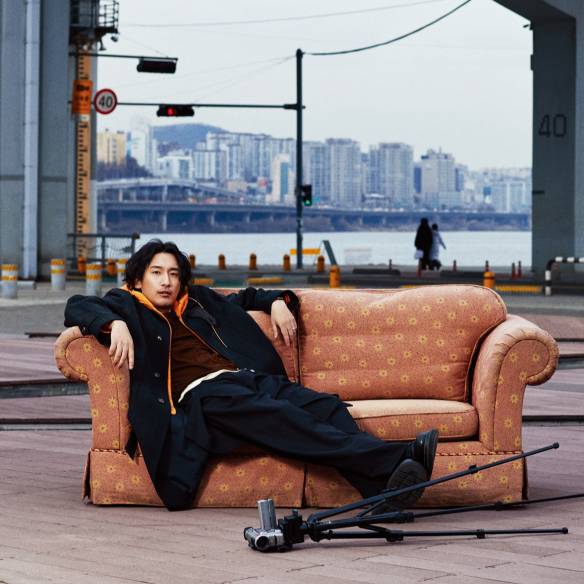저는 프리즈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프리즈 서울의 어떤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8월 중순부터 미술 기자들끼리 모이면 다들 프리즈 때 ‘어디 어디’ 갈 건지를 묻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자못 가라앉은 목소리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다른 기자는 “어휴, 아트페어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 페어만 봐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돌아다니겠어”라며 엄살을 떤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아트페어 프리즈 때 청담으로, 한남으로, 삼청으로 놀러 다닐 생각에 붕 떠 있다는 것을. 프리즈는 누군가에게는 삼성역에 있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수많은 박람회 중 하나일 뿐이지만, 미술 담당 기자인 내게는 명절이나 다름없다. 이 시즌이 되면 삼청동 거리를 걷다가 세계 큐레이터 파워 순위 1위라는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를 만날 수도 있고, 한남동 길거리를 걷다가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 조각가 안토니 곰리와 마주칠 수도 있다. 한스도, 안토니도(물론 그들은 내가 이름으로 호칭한다는 사실을 모르겠지만) 그 명성에 비해서 워낙 털털한 사람들이라 셀카를 요청해도 거부하는 법이 없다. 올해엔 본전시장에서 가죽 바지를 입은 피터 마리노와 버락 오바마의 딸 말리아 오바마가 키가 2m는 되어 보이는 마크 브래드포드와 나란히 거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즐겁지 않을 리가 없다.
“저는 이번 프리즈에서 곰리 씨가 군중들에게 셀카 습격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프리랜스 큐레이터이자 미술 전문 통번역가로 활동 중인 박재용 씨의 말이다. 메가 갤러리인 타데우스 로팍과 화이트 큐브의 <불가분적 관계(INEXTRICABLE)> 전시를 기념하는 VIP 리셉션 파티에서 주인공인 안토니 씨와 셀카를 찍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는 고작 2m를 이동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릴 만큼 애를 먹어야 했다. 에휴, 남이 하면 다 하려고 드는 한국인의 근성이란…, 이라며 혀를 쯧쯧 차지만 내게도 그와 함께 찍은 셀카가 있으니 남 흉을 볼 처지는 아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올해도 나는 “피곤해서 집에서 쉰다”고 해놓고 각 지역에서 프리즈 파티가 열리는 사흘 모두 기어 나갔다. 아주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 삼청동의 한 갤러리에서 한 손에 칵테일 글라스를 들고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려다가 “페어만 봐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돌아다니겠냐”고 엄살 떨던 기자를 만났다. 그의 손에도 들려 있는 수줍은 칵테일을 보며 나는 어색한 웃음을 보냈다. 내년에는 그냥 놀고 싶을 땐 놀고 싶다고 말하는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물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파티만은 아니다. 프리즈의 밤은 조금만 열심히 움직이면 지적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는 갈라 포라스-김의 강연이 그랬다. 갈라 포라스-김은 그동안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기관이 소장품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방식을 구조의 의지 혹은 욕망과 관계 지어 탐구해왔다. 그리고 이번 국제갤러리의 전시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박물관을 탐구했다. 개인적 수집 행위인 수석의 수집 방식과 분류 체계를 탐구하기 위해 그는 실제 수석 수집가들의 수석 작품과 그 작품을 수집한 이유를 갤러리 공간 중앙에 전시했다. 그리고 이 돌들을 둘러싼 벽면에는 그동안 탐구의 미술적 구현으로 활용해온 조선시대의 책가도 형식을 빌려 ‘균형 잡힌 돌’ ‘우주에서 온 돌’ 등 전통적인 수석 분류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으로) 수집한 평면의 돌들을 배열했다. 그가 던지는 물음은 명확하다. 사실 돌은 그냥 돌이다. 돌은 그저 자연의 물질, 규소와 산소가 특정한 형태로 결합된 화합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돌의 형상에서 기호와 상징을 찾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마치 언어와도 같이 자의적이다. “수집의 욕망은 결국 물질 자체에 내제된 게 아니라, 그걸 모으는 사람의 기대와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게 갈라 포라스-김의 강연 내용이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꼽자면, 단연 지미 로버트의 퍼포먼스다. 수십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바라캇 컨템포러리 지하 전시실에서 거대한 체구의 지미 로버트가 서서히 기어 나오며 외쳤다. “넌 그녀의 혀를 먹어야 해. 만약 그녀의 혀를 먹는다면 넌 강해질 거야. 네가 혀를 먹는다면 넌 새들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You must eat her tongue. If you eat her tongue, it will make you strong. If you eat a tongue you will speak a language of bird) 차학경의 시 ‘Apparatus’에서 인용한 강렬한 주문이 우리를 미혹했다. 공간에 영사되는 필름에선 UC버클리의 미술관인 BAMPFA(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에 있는 차학경 아카이브를 지미 로버트가 어루만지고 있었다. 지미는 슈퍼8 필름으로 촬영한 그 화면에 자신의 신체를 중첩시켰다. 마치 영상에 담긴 순간에 대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도식적인 이해로는 정리할 수 없는 수많은 레이어들이, 퍼포먼스와 영상이 합쳐진 이 작품 <Éclipser>(에클립세)에 쌓여 있다는 것을 감각한 것만으로도 뭔가 뿌듯한 심정이 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말로 다 풀어 쓸 수 있으면 예술이 아니지”라며 우리 자신을 위로했다.
그날 밤의 피날레는 갤러리 현대의 굿판이 장식했다. 해가 지자마자 수많은 인파가 갤러리 현대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오후 9시 30분께가 되어서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신 김혜경의 <대동굿 - 비수거리(작두굿)>를 보기 위한 인파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두가헌 앞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서 벌어지는 굿판을 보기 위해 빼곡하게 모여들었고, 김혜경 선생은 마치 수백 번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해본 디너쇼의 트로트 가수처럼 최소한의 몸짓으로 익숙한 감정을 자극하며 군중을 흥분 상태로 몰아넣었다. 백남준은 35년 전인 1990년 7월 20일, 정확하게 같은 자리인 갤러리 현대 마당에서 요셉 보이스의 넋을 기리는 굿 형식의 퍼포먼스 ‘늑대의 걸음으로 – 서울에서 부다페스트’를 벌인 바 있다. 만신 김혜경이 신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칼날로 뺨을 긋고, 항아리 위에 놓인 작두에 올라갔을 때는 수백 명이 동시에 탄성을 지르며 빠져들었다. 무신론자를 자처하고 무당과 굿과 사주팔자와 신점을 경멸한다고 평소 말해온 나였지만, 어느새 누구보다 깊게 빠져들고 있었는지 뒤에서 누군가가 “저건 날이 없는 작두”라고 소리내 말했을 때는 “불경한 놈”이라고 화를 낼 뻔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 굿 머스트 고온’(The Good Must Go On)이다. 굿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프리즈가 다섯 번째 해인 내년까지만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다. 프리즈 대표인 사이먼 폭스는 이번에 한국을 찾아 ‘키아프 서울’과 계약한 5년의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공동 개최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저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프리즈 러버인 나는 걱정이 앞선다. 설마 프리즈가 서울을 떠나진 않겠지? 그러나 어쩌면 문제는 계약의 연장이 아닌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불경기 속에서 참가하는 갤러리들의 전시 수준과 프리즈라는 이름의 디그니티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4년간만 보더라도 어떤 흐름이 눈에 보인다. “대형 갤러리 중에 솔로 부스를 마련한 곳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포커스 아시아 섹션 말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한 저널리스트의 말이다. 포커스 아시아 섹션의 부스들은 부스 가격이 비교적 경제적인 반면에 떠오르는 아시아 스타를 솔로 프레젠테이션 해야 하는 공간이니 논외다. 내 경험으로만 비춰봐도, 작년엔 갤러리 현대의 전준호나 갤러리 퀸(Galerie Quyhn)의 뚜안 앤드류 응우옌의 전시처럼 하나의 언어로 좌라락 펼쳐둔 솔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올해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여러 미술 관계자들이 가장 흥미롭게 뽑았던 태국 SAC 갤러리 정도가 아닐까? 프라팟 지와랑산은 솔로 부스 전시 <The Portrait of Asian Family>에서 한국의 동묘나 일본의 벼룩시장 등에서 찾아낸 1970~80년대 사진으로 인물들의 얼굴을 잘라 붙이고, 남녀를 뒤바꾸고, 신체를 섞어 붙이는 등의 포토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아시아적 가족의 새로운 포트레이트를 만들었다. 작년에 나는 우연히 폴 래스터와 르네 리카르도라는 뉴욕 출신 저널리스트 & 큐레이터 부부와 프리즈 기간부터 광주 비엔날레까지 함께 다니며 자주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내게 늘 “솔로 프레젠테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솔로 부스를 먼저 찾을 것을 부탁했다. “아트페어에 한 작가를 솔로 부스로 낸다는 건 그 갤러리가 작가의 미학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폴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솔로 부스가 없었던 올해에 우리나라 갤러리들은 소속 작가의 미학에 자신이 없었던 걸까? 갤러리스트들의 의견은 다르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한 갤러리스트는 내게 마치 왜 이리 아이처럼 구느냐는 듯 말했다. “경기가 안 좋으니 백화점식으로 팔릴 것만 꾸려서 나가야죠. 이런 시기에 미술관 전시를 페어에서 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몸을 사리는 이유는 한국 시장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에 팔린 작품들을 보면 정말 양극화되어 있어요.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거나.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작가의 정말 비싼 대표 작품들이 팔렸고, 그 밖에는 비교적 가격 문턱이 낮은 신진 작가의 작품들이 주를 이뤘죠.” 그는 이어서 얘기했다. “어찌 보면 한국 소비자의 특징이에요. 샀다가 다시 팔아도 팔릴 것 같은 것만 사요.” 경기 탓만은 아니고, 다만 한국 시장의 특이한 쏠림 현상 때문에 프리즈 서울의 다양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솔직한 상황이 아닐까요? 이걸 자꾸 부정하면서 부스만 240개인 홍콩의 아트바젤과 비교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 아트의 허브라며 정신 승리할 필요도 없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해봐야지요.” 프리랜스 큐레이터이자 아트 전문 통번역가인 박재용의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프리즈 서울이 아시아 아트 허브의 자리를 놓고 굳이 아트바젤 홍콩과 겨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홍콩에서 온 저널리스트들이 물어볼 때마다 “프리즈 서울은 볼 게 없다”고 대답하는 데는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갤러리스트는 이런 얘기도 했다. “아트바젤 홍콩에 가보면 실제로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국가와 기관 갤러리와 시민이 각자 아트바젤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나눠서 지원하는 느낌이에요.” 그의 얘기를 듣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키아프-프리즈 서울과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외 저널리스트들의 체류비를 부담해가며 초대하는 사업을 벌였다는 얘기를 떠올렸다. 지난 2024년에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만난 미국 저널리스트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다. “한국 정부 출연 기관에서 초청해 비행기도 호텔 숙박도 전부 해결해줬어”라며 그는 말했다. “난 어차피 회삿돈으로 취재하러 올 거였는데 말이지.” 나는 그렇게 해외 기자들을 초대할 돈으로 프리즈 서울이나 광주 비엔날레를 좀 더 멋지게 만드는 게 이득은 아닐지 생각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시상하는 서울 프라이즈를 만들어 수상 작가의 대형 작품을 프리즈 기간 동안 코엑스 광장에 설치한다든지 말이다.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훈수를 두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말은 이것이다. 하여튼 거버넌스가 문제야, 문제.
박세회는 <에스콰이어>의 피처 디렉터로 위스키, 와인, 아트, 음악을 취재한다.
Credit
- EDITOR 박세회
- WRITER 박세회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MONTHLY CELEB
#카리나, #송종원, #채종협, #롱샷, #아이들, #제노, #재민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