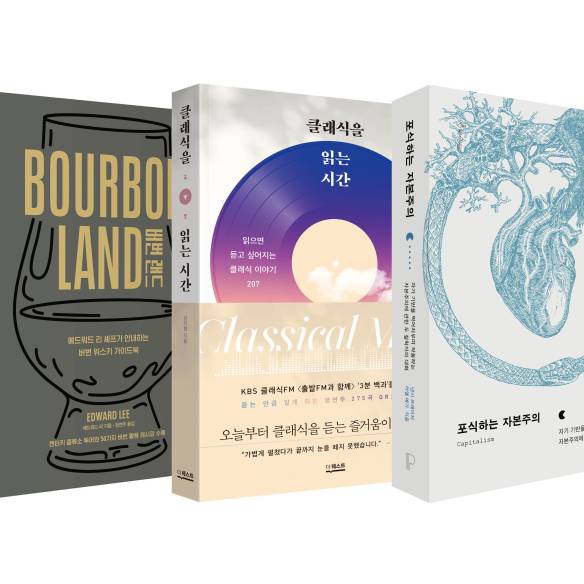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음악평론가 배순탁이 말하는 BBC 라디오의 아날로그 감성
라이브 앳 더 BBC.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라이브 앳 더 BBC
」
내가 방심했다. 우리 프로듀서가 열정왕이라는 걸 깜빡했다. 뭐, 며칠 뒤 BBC 측에 메일을 보냈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답장이 오겠어?’ 싶었다. 하하.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답장이 왔다. 그것도 매우 빠르고, 초대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답장이었다. “배 작가님, BBC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얘기를 듣자마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속담인지 찾아봤다. 국어사전은 역시 위대하다.
결정이 되고 난 뒤부터는 기대가 컸다. 음악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BBC는 성지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갔던 BBC 마이다 베일(Maida Vale) 스튜디오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비틀스를 필두로 콜드플레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중음악의 전설이 마이다 베일 스튜디오를 빌려 라이브를 녹음했다. 어떤가. 만약 당신이 음악업계 종사자라면 저 이름만으로도 괜히 두근거리지 않겠나.
이곳에서 내 역할은 당연히 중국집 배달만큼이나 신속, 정확하게 음악을 찾아 배열하는 일이었다. 뭐, 걱정은 전혀 없었다. 명색이 BBC 아닌가. 엄청나게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확신했다. 디지털로 전환된 거대한 음악 도서관에서 기분 좋게 방황하고 싶었다. MBC 라이브러리? 어디서 갑자기 MBC를 들이대? 아직 가보지도 않은 BBC 뽕에 한껏 취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 라이브러리의 폭과 깊이 모두에서 BBC는 내가 일하는 MBC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BBC에 이것도 없다고?’ 싶은 음악이 지나치게 많았다.
어디 라이브러리뿐일까, 시설도 꽤나 올드했다.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을 피해 방송을 해야 했기에 스튜디오가 지하 깊숙이 있는 것부터 문제였다.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느렸다. 이런 환경에서 어찌어찌 방법을 찾아내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냈으니 과연 대한민국 인터넷 전사의 능력은 세계 최강이다. 이건 함께 동행한 세컨드 프로듀서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이 지면을 빌려 그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얼마나 난감했으면 BBC의 벽을 뚫어버리고 싶다고 했었지, 아마.
비단 라이브러리와 인터넷만은 아니었다. 스튜디오 내부의 시설 전체가 비슷한 기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사전 답사하던 날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정말로 이건 못 쓰겠다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잘 보존해 사용하고, 최악일 때만 신식으로 교체한다.’ BBC 스튜디오와 MBC 1층 가든 스튜디오를 대놓고 직접 비교해볼까. MBC 라디오는 모든 게 최신 디지털식이다. 얼마나 최신이면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인 양방언 씨가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출연했을 때 “여기서 그냥 정규 앨범 녹음해도 되겠는데요”라고 했을 정도다.
BBC는 그에 비하면 훨씬 아날로그적이다. 1960년대에 주로 사용했던 오르간이 고스란히 놓여 있는가 하면, 고릿적부터 쓰던 마이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관해놓았다. 혹시 조지 6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킹스 스피츠>를 본 적 있나? 제2차 세계대전 중 조지 6세가 BBC에 와서 연설할 때 쓴 마이크도 여기에서 직접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생방송을 무사히 잘 마쳤으니 기적이 있다면 별게 아니다. 이런 게 바로 기적이다.
아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성심껏 협조해준 BBC 스태프에 대한 실례다.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오래되었어도 라디오에서는 괜찮다는 것이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Live at the BBC> 방송을 통해 나는 이 점을 다시금 절감했다. 라디오를 다룬 흔치 않은 만화 <파도여 들어다오>에 나오는 대사를 빌리자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계로도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점이 라디오의 멋진 부분인 거 같아요.”
하나 더 있다. 결국 라디오의 매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건 스태프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라는 점이다. 스태프와 음악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다. 물론 스태프가 일 잘하고 음악 선곡도 끝내주면 좋다. 아주 좋다. 여기에 스튜디오까지 하이엔드급으로 장만해놓았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DJ가 별로라면 별무소용이다. 메인 주방장의 실력이 수준 이하면 음식 맛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BBC에서 생방송을 끝내고 난 뒤 나는 거의 확신했다. 미래의 라디오에서 DJ의 존재감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어차피 라디오는 2000년대 이후 레드 오션이 되어버렸다.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활로는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만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퍼스낼리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 맞다. DJ다. 배철수 말이다. 지금도 어떤 청취자에게 때론 ‘너무 까칠하다’며 불만을 듣는 그는 아예 이걸 자신의 개성으로 삼아 30년 역사를 써 내려왔다. 사전 답사하던 중 BBC의 오래된 시설을 둘러보면서도 진심 이렇게 생각했던 걸 기억한다. ‘배철수 선배님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나의 믿음 그대로 어떻게든 잘돼서 전 스태프가 방송 잘 마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 우리 제발 서로 솔직해지자. 대체 언제까지 라디오에서 ‘듣기 달콤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 할 건가. 까칠하지만 필요할 땐 매력적인, ‘츤데레’ 같은 그런 DJ가 더 끌리지 않나. 대체 언제까지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유사 버전을 들으며 자기 위로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다 우리 사회가 ‘힐링’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강조해온 결과요, 역풍이다. 정작 휴가는 1년에 고작 일주일 주면서 말이다.
BBC에 다녀온 후 어느 날 tvN 예능 프로 <이서진의 뉴욕뉴욕>을 보면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가벼운 게 좋다. 짧게 치고, 킥킥거리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뚝 하고 끊기는 것. 그리고 역시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이런 흐름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매력적으로 불친절해야 한다’는 거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저 흐름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배철수 DJ를 떠올렸다.
음악이 나온다. DJ가 말한다. 청취자의 사연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아니다’ 싶은 경우 반론을 제기하는 데 주저함이라곤 없다. 다시 음악이 나온다. DJ가 이어서 말한다. 이번엔 잔잔한 ‘아재 유머’의 시간이다. 청취자의 킥킥대는 메시지가 문자 창을 가득 채운다.
2시간 내내 원고는 달랑 3장뿐이다. 금과옥조 같은 원고이지만 거의 단편소설급 분량의 원고를 매일 받는 DJ와는 차원이 다르다. 솔직히 1980년대 무대 위에서보다 콘솔 앞에 앉아 있을 때의 그가 훨씬 멋있다. 물론 내 기준이다. 이런 DJ와 가능한 한 오래 일하고 싶다. 무려 30주년이다. BBC에 다녀오면 BBC에서 일하고 싶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DJ를 향한 애정만 커졌다.
Who’s the writer?
배순탁은 음악평론가이자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다.
Credit
- EDITOR 김은희
- WRITER 배순탁
- DIGITAL DESIGNER 이효진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