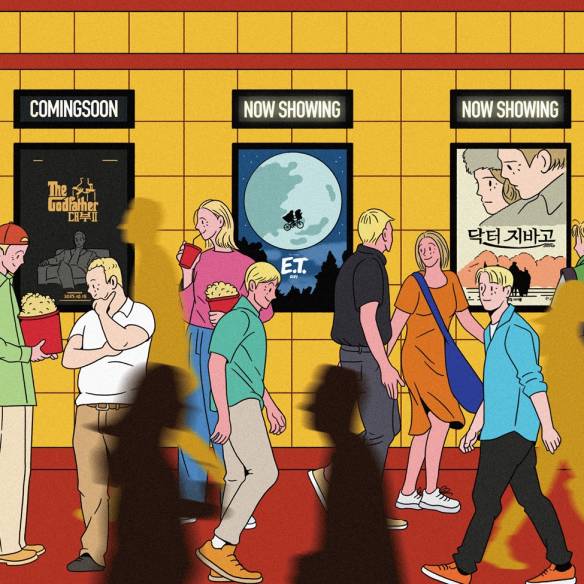LIFE
여덟 명의 여행 애호가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해외 공원의 기억 part.1
온 세상의 공원이 흐드러지는 5월. 여덟 명의 여행 애호가가 바다 건너 어느 공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털어놓았다. 직접 찍고 그린 이미지와 함께. 여전히 아름다울 그 공터들에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내 아름다운 공원들의 기억
」사이욕 국립공원 & 에라완 국립공원
변영근(일러스트레이터)

작은 시내를 뺀 나머지 깐차나부리는 대자연이다. 북서쪽으로 카오램 국립공원, 사이욕 국립공원, 에라완 국립공원까지 세 개의 커다란 국립공원도 자리 잡고 있다. 내가 가본 건 그중 두 공원, 쾌노이강이 흐르는 사이욕 국립공원과 쾌야이강이 흐르는 에라완 국립공원이다. 사실 계기는 사소했다. 처음 깐차나부리를 여행할 때 구글 지도 추천 관광 명소에서 보았던 곳이 사이욕 노이 폭포였다. 그리고 오토바이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에 ‘한번 가볼까’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좌우로 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길을 달리다 보니 폭포를 지나쳐 사이욕 국립공원까지 도달해버린 것이다. 입장료도 꽤 비쌌지만 입구 앞에 서니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다. 웅장한 나무들과 대비되는, 한산하기 그지없는 분위기 때문인지 국립공원은 어쩐지 소박해 보였다. 쾌노이강 다리에서 내려다보이는 폭포도 아주 작았다. 그 앞을 유람선 크기의 보트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는데, 탑승객들 모두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이 깨끗하고 소박한 공원에서, 이 한낮에. 하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그다음 해에 또 한 번 깐차나부리를 찾은 것도 이상하게 그 풍경에 매료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에라완 국립공원은 사이욕 국립공원 맞은편에 위치한다. 이 공원은 사실 꽤 유명한 관광지여서 방콕에서 당일 투어로 다녀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카오산로드 같은 곳에서 관광객을 모아 새벽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나야 깐차나부리 시내에 머물고 있으니 그리 급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더 자세히 둘러보고 싶어 공원 근처 숙소에서 이틀을 묵기로 했다. 시내와 멀고 관광객도 별로 없어서인지 물가는 다소 비싼 편이었지만 아름다운 나무들과 강을 침실 바로 앞에 두고 있으니 마음이 절로 평온해지는 느낌이었다.

7단계에 도착하면 산꼭대기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온몸으로 맞을 수 있다. 직격으로 떨어지는 물살이 꽤나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겹게 올라온 수고를 보상받는 시원함도 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오른 길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뿐. 돌아서 보니 어느새 하늘은 물의 색과는 상반되는 붉은빛으로 저물고 있었다. 높은 지대에서 탁 트인 풍경을 내려다보노라니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숙소까지 돌아왔을 때는 거의 ‘방전’ 상태였으나 근처에서 생선구이와 맥주를 시켜 한 입 먹으니 다시 활력이 샘솟았다. 그 즐거움이란! 물놀이나 산행 후에 먹는 맥주가 꿀맛이라는 건 보편적 진리지만 그 상황에 이를 때마다 매번 새롭게 감탄하게 되는 법이다.
사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전에 태국행 티켓을 예매했었다. 계획하기로 이번에는 카오램 국립공원을 돌아보면 어떨까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곧 확진자 수가 급하게 치솟았고 매일 뉴스와 항공사 상황을 보며 마음을 졸이다 결국 취소에 이르렀다. 다행히 항공사에서 전액 환불을 해주긴 했지만, 곧 방문할 예정이었던 깐차나부리는 이제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곳을 그려보곤 한다. 그 어딘가의 폭포에서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있을 내 자신을. 물론 그 상상 속에서 누구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다.
술탄 아흐메트 공원
이용한(시인, 여행가)

이 유서 깊은 블루 모스크와 성 소피아 박물관의 중간쯤에 자리한 공원이 하나 있다. 술탄 아흐메트 광장과 연결되어 있기에 으레 술탄 아흐메트 공원이라 불리는데, 고양이 마니아들에게는 그보다 ‘고양이 공원’으로 통한다. 입구에 들어서기만 하면 열댓 마리 고양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인사를 건네니까. 말이 인사지, 사실 손에 케밥이나 빵이 있는지, 아니면 고양이를 위해 따로 먹을 것을 챙겨 왔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공원에서는 빈손으로 온 사람은 고양이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고양이의 천국’이라 불리는 터키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더러 순전히 고양이를 보러 이곳을 찾는 여행자도 있다. 이스탄불을 다녀간 한국의 애묘인들 중 상당수는 고양이 여행 명소로 술탄 아흐메트 공원을 첫손에 꼽는다. 공원에는 대략 30마리 안팎의 고양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잔디밭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보다 먼저 벤치를 차지하고 느긋하게 그루밍 중인 고양이도 있다. 그러다가 누군가 케밥이나 샐러드 포장을 여는 순간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한데 몰려들기 시작한다. 실제로 처음 공원을 찾은 날 마주쳤던 광경도 케밥을 먹는 관광객을 포위한 10여 마리의 고양이였다. 고양이들에게 포위당한 한 여성은 자기 식사의 절반가량을 고양이들에게 바치고서야 풀려나기도 했다.

사실 고양이 천국이라 불리는 터키에는 곳곳에 당국이 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위치한다. 그리고 급식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밥 가방을 메고 다니는 캣헬퍼를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런 일,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연히 고양이들도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며 함께 어우러져 산다. 그냥 그런 풍경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인 곳도 있는 것이다.
마우어파크
최혜령(일러스트레이터)

두 번째 여행에선 의도한 차별점이 있긴 했다. 지난 여행보다 좀 더 오래, 여유롭게 지내며 ‘베를리너’의 감흥을 느껴보는 것이었다.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친구와 시나몬롤을 한 덩이씩 쥐고서 마우어파크로 향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항간에 베를린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일요일을 껴서 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마우어파크에서 열리는 대규모 벼룩시장 때문이다. 과연 이른 시간, 공원 입구 바깥에서부터 장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사람들이 보였다. 허둥지둥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스들 뒤로는 잔디밭과 길쭉한 나무들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새파란 하늘 아래 광활한 초록.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마우어파크의 벼룩시장에는 현지인과 관광객이 적절히 뒤섞여 만들어내는 특유의 흥이 있다. 그 속을 걷고 있으면 눈 돌리는 곳마다 빈티지 제품을 마주치는데, 어쩐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낡았지만 바랜 색이 어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옷가지들, 상자에 빼곡히 채워진 바이닐 레코드, 흑백사진 속에서나 봤던 큰 플래시가 달린 필름 카메라, 옹기종기 모여 있는 플레이 모빌… 물론 새것처럼 반짝반짝하진 않았지만 대신 그 안에는 각 셀러들의 확고한 소신이 묻어 있는 듯했다. 나는 평소엔 관심도 없던 타자기를 한참 만져보는가 하면 레코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너바나와 데이비드 보위의 앨범을 보며 반가움을 느끼기도 했다.
무수한 물건들 속에서 취향을 견주는 건 늘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다 보니 슬슬 다리가 저려왔고, 우리는 마켓을 슬쩍 빠져나와 잔디밭 쪽으로 향했다.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다. 설마 벌렁 드러눕게 될 줄은 몰랐지만. 물론 돗자리 없이 잔디밭에 드러눕는 건 내게도 어색한 일. 벌레가 기어오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껏 햇볕을 즐기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자니 문득 덩달아 드러눕고 싶어진 것이다. 과연 누워서 보는 하늘은 어쩐지 그 전과 달라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유럽이구나’ 새삼 실감 나게 했달까. 그때 봤던 색깔과 기억은 마치 사진으로 찍기라도 한 듯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낯섦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그 공원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때도 꼭 한번 잔디밭에 누워보고 싶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누울 자신이 있으니까.
오스틴 BMX 공원
양경준(사진가)

오후 4시쯤 되면 공원에는 보더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다들 무서운 속도로 스케이트보드를 밀어내고, 부딪치면 기다렸다는 듯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욕을 한다.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구와 부딪칠지 빤히 보이지만 누구도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틀지 않는다. 욕설이 주먹다짐으로 번지려 하면 그제야 다른 보더들이 달려온다. 조금 전까지 난폭하게 앞만 보고 달리던 그들이 어느새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한동안 공원에 질서가 갖춰진다.
처음에는 공원 옆 주차장 옥상에 올라 보더들의 사진을 찍었다. 멀리서 찍을 때는 두려운 게 없다. 다만 솔직해질 필요도 없다. 좋은 구도에 맞춰 사진 한두 장을 남겼고, 그런 스스로가 한심해질 즈음 공원으로 내려갔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하는 건 항상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때때로 그 두려움을 압도할 만큼 욕심나게 만드는 피사체도 있는 법이다. 나는 공원으로 내려간 후에도 속으로 100번쯤 망설이기를 반복했고, 결국 참지 못하게 되는 순간 다가가 입을 뗐다.

[관련기사]
여덟 명의 여행 애호가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해외 공원의 기억 part.2 보러가기
Credit
- EDITOR 오성윤
- DIGITAL DESIGNER 김희진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