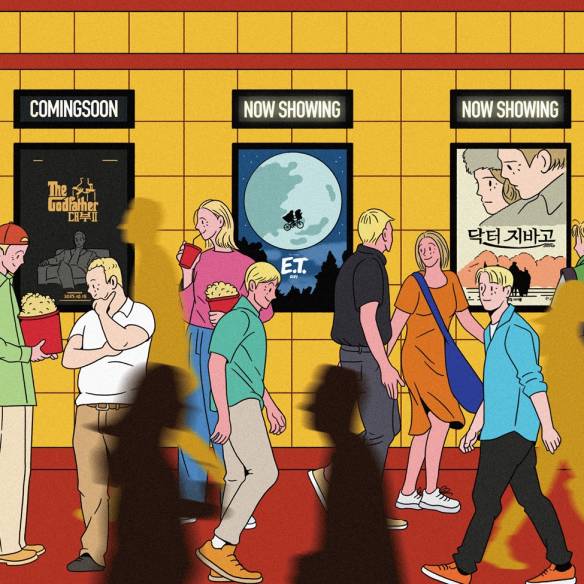LIFE
K-드라마의 연애법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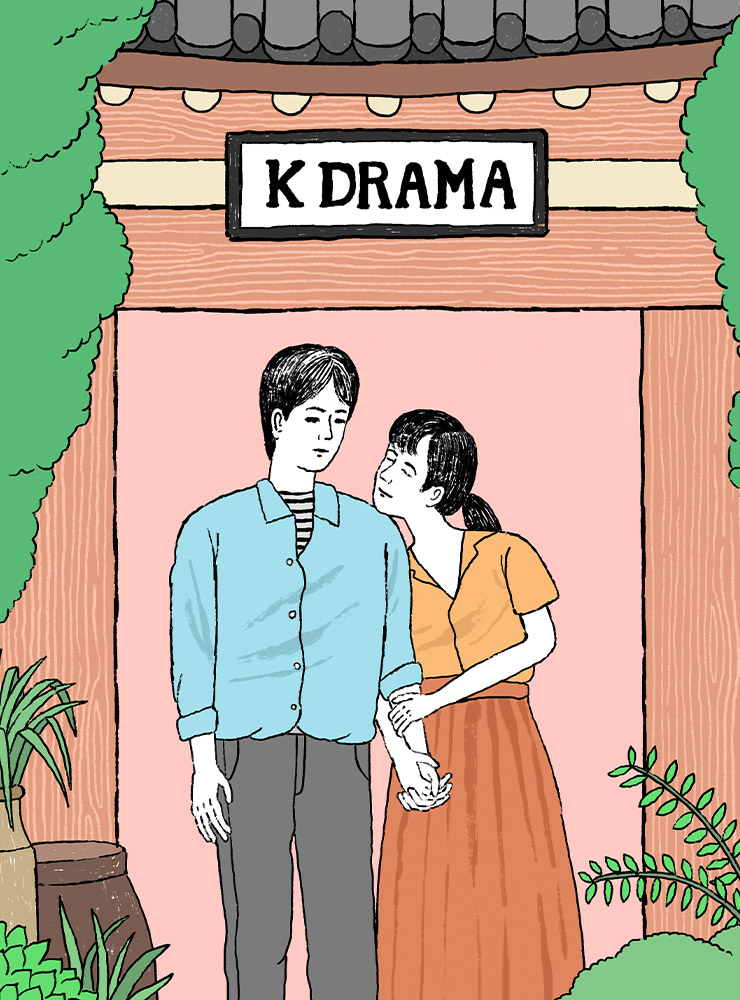
나의 첫 연애 드라마는 <질투>(1992)다. 그 시절 한국 드라마에서 청춘의 연애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80년대는 ‘어른의 드라마’ 전성기였다. 모두가 김수현이 쓴 <사랑과 질투>(1984)와 <사랑과 야망>(1987)을 봤다. 1980년대 고도성장기 가족의 서사를 다루는 그 드라마들은 당대의 연애 드라마라고 불릴 법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10대였다. 지나치게 끓어올라 서로에게 화상을 입히는 방식의 사랑은 어린 내가 이해하기에는 꽤나 벅찼다. 여러모로 그 드라마들은 ‘섹스’에 대한 은유로 넘치기도 했다. <질투>는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그건 오로지 연애 드라마였다. 오랜 친구로 지내던 대학 동창생들이 서로 다른 사랑에 빠진다. 서로의 짝을 질투하던 두 사람은 결국 진정한 사랑은 항상 곁에서 맴돌던 서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전설적인 엔딩이 시작된다. <질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최진실과 최수종은 “더 이상 질투하기 싫어”라고 외치며 키스를 한다. 카메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360도 빙글빙글 돌다가 뒤로 빠진다. 그러자 배우들을 둘러싼 스태프들이 촬영 종료를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에게 그 장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결국 연애 판타지일 뿐이야’라고 외치며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일종의 유희였다.
나는 어떤 면에서 <질투>가 ‘어른의 드라마’를 벗어난 한국 드라마의 첫 번째 연애 판타지였다고 확신한다. 이전의 드라마들은 가히 문학적 리얼리즘의 강건한 옹벽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남녀의 사랑은 언제나 파괴적으로 드라마틱했다. 10대와 20대를 위한 연애 드라마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수현 드라마 속에서 성공과 사랑을 갈구하며 전근대적인 시대를 돌파하던 연인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캐릭터들이 아니었다. <사랑과 야망>의 주연 배우 남성훈과 차화연의 캐릭터는 20대 시절로부터 출발한다. 많은 40대 이상의 독자들은 차화연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명문대생(그렇다. 당시에는 ‘명문대생 캐릭터’라는 게 따로 있었다) 남성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날 가져!”라고 외치며 옷을 벗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 장면을 기억한다. 함께 드라마를 보던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 중학생인 내가 그 장면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계셨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 드라마 속에서 20대들은 이미 어른이었다. 섹스를 하고 결혼을 하는 나이였다. 그건 시대의 정확한 반영이었을 것이다.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나보다 겨우 10여 년 빠르게 성인의 나이에 도달한 세대는 나의 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어른이 됐다. 30대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1990년대부터 세대의 성장 속도는 느려졌다. 우리는 더는 30대가 되기 전 어른의 세계로 빠르게 진입하지 않는다. 청춘을 최대한 연장하려 애쓴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 때문이기도 했다. 고도성장기가 끝날 무렵에는 30대 이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 20대를 더는 성년기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 연애 드라마도 <질투> 이후 완벽하게 다른 시대로 넘어갔다. 16부의 마지막 장면에서야 주인공들은 첫 키스를 나눈다. 그 이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된다. 키스는 아마도 섹스로 이어질 테지만 누구도 섹스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 연애 드라마는 기나긴 ‘전희’의 순간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2022년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심쿵 모먼트’들을 본다. 카메라는 닿을 듯 닿을 듯 닿지 않다가 겨우 닿은 두 사람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비춘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음악이 지나칠 정도로 달콤하게 깔린다. 지금의 20대는 <사랑과 야망> 시대의 10대에 더 가깝다. 성장을 유예당한 시대의 드라마 속 청춘들은 한 번도 서로의 몸을 탐해본 적 없는 순결한 소년 소녀처럼 군다. 물론 한국 연애 드라마도 장르적 진화를 거쳤다. 2000년대는 윤석호의 시대였다. <가을동화>(2000)로 시작해 <겨울연가>(2002)를 거쳐 <봄의 왈츠>(2006)로 마무리된 윤석호 드라마는 지고지순한 순애보였다. 2000년대가 끝나자 연애 드라마는 그저 연애 드라마로서 존재하기가 힘들어졌다. 서로 질투를 느끼는 연인의 이야기나 순애보만으로 16부작을 채우는 일은 더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애 드라마는 판타지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김은숙의 <시크릿 가든>(2010)으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박지은의 <별에서 온 그대>(2013)로 폭발했고 김은숙의 <도깨비>(2016)로 절정에 이르렀다. 김은숙의 <태양의 후예>(2016)와 박지은의 <사랑의 불시착>(2019) 역시 판타지 요소는 없지만 리얼리즘을 완벽할 정도로 제거한 일종의 ‘평행우주’ 속 사랑 이야기였다. 지난 20년간 한국 드라마의 순애보와 판타지와 평행우주 속에서 섹스는 점점 사라졌다. 나는 김은숙과 박지은의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하자. 거기에 어른의 연애가 있나? 주인공들은 감정적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다가 소셜미디어를 영원히 짤의 형태로 맴도는 ‘명언’들을 지나치게 쏟아냈다. 당신은 2016년에 <도깨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을 테지만 공유의 대사들을 다시 꺼내 읽으면 어쩐지 약간 낯이 간질간질해질 것이다.
2020년대의 연애 드라마는 김은숙과 박지은의 판타지로부터 벗어났다. 외계인과 도깨비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연애 드라마들은 20대의 연애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본격적인 19금 드라마라는 타이틀을 내건 <알고있지만,>(2021)에 기대를 걸었다. 한소희 캐릭터가 “우리 관계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너 병 같은 건 없지?”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청춘의 연애를 리얼리티 속에서 똑바로 바라보는 시대가 드디어 개막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있지만,>의 마지막 장면은 스산하게 현실적으로 끝난 원작과는 달랐다. 주인공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우리 사귀자” “후회 안 하겠어?” “후회하겠지. 그래도 해볼게”라는 고색창연한 대사를 주고받은 뒤 키스를 나눈다. 마치 지금까지 그들이 벌였던 썸과 가벼운 섹스는 잊어달라는 듯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타액을 탐하던 욕망의 키스와는 다른 순수한 사랑의 키스였다는 듯이. 그 장면을 보는 내 머릿속에는 1992년 어느 날에 본 키스 장면에서 울려 퍼지던 주제곡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한국 연애 드라마는 <질투>로부터 조금도 성장하지 않은 걸까.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자체 시청률을 갱신한 다음 날 나는 흥미로운 기사들을 봤다. 오랫동안 우정과 질투 사이를 오가던 주인공들이 드디어 고백을 했다. 백이진은 “사랑. 사랑이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그러자 사람들의 불평이 쏟아졌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문제는 둘의 나이 차이였다. 그들은 결국 스물다섯 스물하나에 사랑을 완성하겠지만 아직 극 중 여자 주인공은 열아홉 살, 남자 주인공은 스물세 살이다. 김태리는 대부분의 장면을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와 성인의 러브라인을 보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교복과 양복은 신중하지 못한 설정이라고들 했다. 나는 이런저런 비판들을 보다가 ‘그루밍 폭력’이라는 단어에서 잠시 멈춰 서서 고민했다. 아직 두 사람은 드라마 안에서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알아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건 폭력인가? 우리는 넷플릭스로 영국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주인공들이 벌이는 온갖 섹스 소동을 보면서 10대에게도 성적 욕망은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한국 연애 드라마의 청춘들은 여전히 무성애적인 존재로 머물러야 한다. 10대인 당신이 드라마 속에서 연애를 허락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 도깨비여야 한다. 판타지여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연애 드라마 속에서만은 영원히 자라지 않는 순결한 판타지 영역에 머물기를 자처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니 장담하건대,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되더라도 그들에게 허락되는 건 겨우 키스일 것이다. 1992년의 최수종과 최진실처럼.
Credit
- EDITOR 오성윤
- WRITER 김도훈
- ART DESIGNER 주정화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