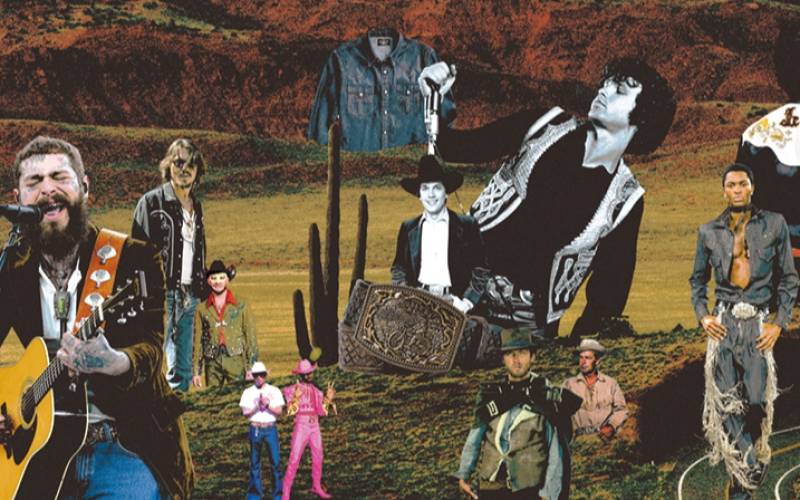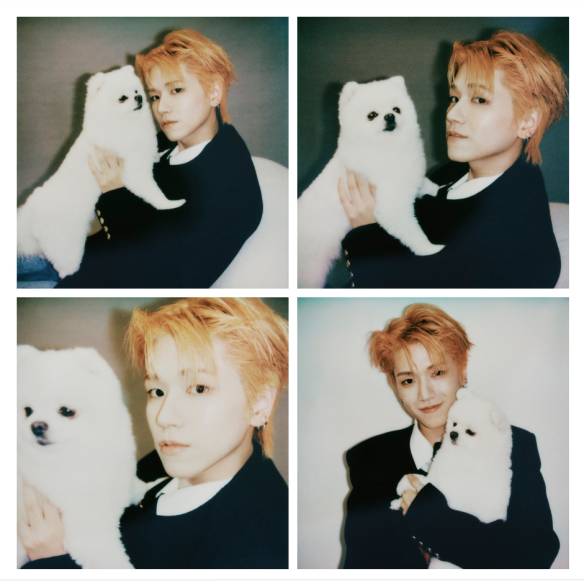STYLE
정상화 "작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상화가 고령토를 만들고 캔버스를 접은 날 한국 페인팅의 평면은 크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건 전혀 과장이 아니다. 평생 평면을 탐구한 단색화의 거장 정상화를 만났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선생님을 뵙는 날이 오네요.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말아요.
평생 평면을 탐구하셨습니다. 작가님께 평면이란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것도 어려운데?(웃음) 제 그림은 상하좌우로 흐르며,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또 들어왔다 나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호흡기관 같은 과정을 거쳐요. 제 캔버스는 호흡기관이고, 맥이 뛰는 심장이지요. 그림이라는 건 결국 행위 자극입니다. 제 감정에 따라 뇌에서 내린 명령으로 손이 움직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 평면, 절대적인 2차원적 세계 위에 내 손으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시각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평면은 호흡기관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업 방식인 고령토를 이용한 평면 작업들은 실제로 유기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작품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천을 잘라서 캔버스 틀에 메고, 타카를 박아서 고령토를 바릅니다. 고령토를 왜 발랐느냐. 평면 안으로 들어갈 순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자연적인 요소로 차용한 것이지요. 보통은 고령토를 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 많게는 열 번까지 발라 높게 쌓습니다. 평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쌓은 것이지요. 그걸 다시 틀에서 떼어내 뒷면에 일정한 간격의 수직, 수평, 사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천을 접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그리는 화면의 흐름에 따라 고령토의 파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물감을 메우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파편을 어떻게 뜯어내고 메울지는 결국 작가의 생각에 따른 것이죠. 그걸 조절하는 행위가 바로 나의 호흡이고, 나의 호흡이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의 평면이 되는 겁니다. 저 그림,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저 그림은 또 다른 평면이지요. 평면적인 것을 종이로 가져와서 또 다른 평면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요.(그는 인터뷰를 진행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두가헌’에 걸려 있는 자신의 그림을 가리켰다.) 저 탁본 작품은 저런 요철이 드러나는 원화 작품이 있어야 나오는 평면이고, 저기 저 검은 작품(다른 탁본 작품을 가리키며)은 원화가 없이 나오는 거지요.
어시스턴트 한 명 없이 모든 작업을 손수 하시는 이유는 작가의 호흡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겠어요.
큰 작품을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계속 작업을 해야 해요.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숨 놓고 또 하고 또 해요. 제가 작업할 때는 옆에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요. 혼자 문을 걸어 잠그죠. 제가 지금 아흔두 살입니다. 이제 큰 작품은 못 해요. 요즘은 작은 것만 깔짝깔짝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작가는 죽을 때까지 작품 안 하면 안 돼요.
연장들도 다 손수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캔버스에 줄을 긋고 접고, 고령토를 바르고 떼어내는 데 들어가는 도구는 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잘 쓰는 좀 힘 있는 대나무가 따로 있는데 그걸 날카롭게 갈아서 씁니다. 칼도 가끔 쓰는데 그것도 제가 만들었고, 아크릴 물감을 채색할 때 쓰는 붓도 만들었어요.
항상 전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전위란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이죠.
그거 없으면 우리 그림 못 그려요. 가령 컵이나 사과를 그린다고 해보세요. 천 명이 그리면 천 명이 그린 그림이 다 다를 거잖아요. 새로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없다가 있는 거예요. 또는 있다가 없어져버리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작가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건 작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가 생겨난 작품을 말하는 거니까요.
선생님 작품을 두고 누군가는 경작으로 또 누군가는 호흡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게 더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라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가의 창의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본다면 후자가 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요. 호흡이라는 표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 내제적인 논리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림 참 그리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때도 있으시지요?
(웃음) 있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난처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야 해요. 하기 싫으면 그만해야 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둘 때를 넘어서서 계속하게 되면, (작가의) 내용과 작품이 전혀 판이해져요.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정합적인 내적 논리가 지배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는 것 말고 미학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생각하고 짜내고 또 받아줘야 했죠. 받아둘 그릇이 없으면 공부는 못 해요. 40~50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나서야 그때 받아둔 미학들이 떠올라서 ‘아, 그때 그 얘기가 이걸 얘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작품을 하는 동안에도 내 머리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그걸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녜요. 내가 작업하는 것이 바탕이 돼서, 받아서 머리에 둔 것들이 재생되어 나오는 거지요. 아이고, 가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가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작가는 다 그래. 작가는 다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평론가들이 잘 기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평상시에는 이런 얘기를 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또 작가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다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자기’라는 것이 있어야 해요. 작가의 말이라고 그걸 다 받아주면 평론가는 뭐가 되겠어요. 그게 평론가적인 논리입니다.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근 70여 년 동안 그림 하나만 그렸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게 참 기교한 것이지요. 기교한 것이면서 또 기이한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이란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걸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할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체가 예술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논리를 세우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요. 그림은 형식을 앞서갑니다. 그림은 항상 앞서가요. 그리지 않은 논리는 거짓말이에요. 실체가 실현되는 게 앞에 가야죠. 그림을 그리는 게 앞에 가고 논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지 논리가 앞서는 그림은 없어요. 그런 그림은 못써. 엉터리야.
아…그렇군요. 정말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웃음) 그런데…작가를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Credit
- EDITOR 박세회
- ASSISTANT 송채연
- ART DESIGNER 최지훈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