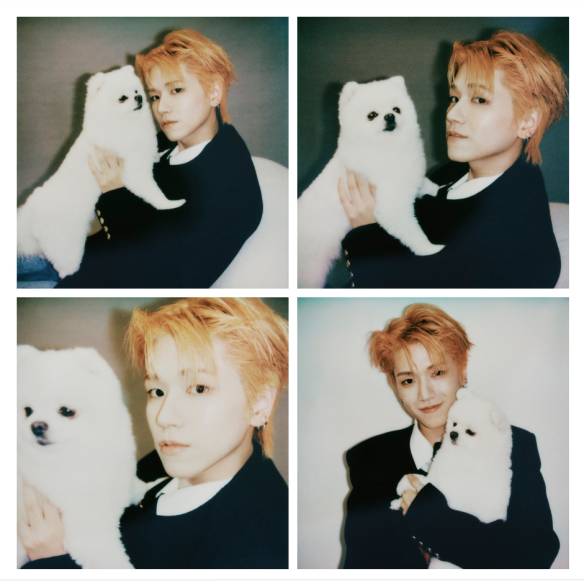「 Portrait of Henry VIII
」 Hans Holbein the Younger, c. 1537
‘헨리 8세의 초상화’ 한스 홀바인, 1537년경.
헨리 8세의 보석 사랑은 유명하다. 그는 온몸에 화려한 보석을 두르고 부강한 국력과 절대 권력을 과시했다. 당대 최고의 화가 한스 홀바인이 그린 초상화에서도 이러한 면모는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흰색 깃털로 치장한 모자엔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큼직한 스톤 4개와 진주 장식 핀이, 상의엔 붉은색 보석이 도열하듯 장식되어 있다. 이 모자와 상의는 이후의 초상화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며 헨리 8세의 시그너처로 자리매김한다. 커다랗고 둥근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다. 네크리스 체인은 헨리의 이니셜 H와 블랙 에나멜을 사선으로 칠한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펜던트 중앙에는 꼭짓점을 평평하게 다듬은 듯한 사각뿔 형태의 검은 보석이 박혀 있다. 이는 테이블 컷 다이아몬드로 추정된다. 당시 보석 연마술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에선 검은색으로 묘사되곤 했다. 양손 약지에 낀 보석 반지 또한 튜더왕조 시대의 아름다운 주얼리 디자인을 보여준다.
「 Portrait of Moritz Buchner
」 Lucas Cranach the Elder, c. 1520
‘모리츠 부스너의 초상화’ 루카스 크라나흐, 1520년경.
르네상스 시대엔 남자들도 화려한 주얼리를 착용했다. 새로운 보석 산지가 발견되면서 갖가지 젬스톤이 사용됐고, 주얼리뿐 아니라 의상, 벨트, 구두 등 전신을 치장하는 데 쓰였다. 이 시기의 수준 높은 장신구는 초상화에서도 발견된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 덕분에 당대 주얼리의 디자인과 스톤까지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모리츠 부스너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이었다. 고급스러운 원단과 모피 숄을 두른 남자의 눈빛에서 확고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왼손에 낀 세 개의 링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는 반지에 특히 힘을 줬다. 검지에는 문장이 새겨진 반지와 초록색 보석 반지를 겹쳐 착용했고, 약지에는 금반지를 꼈다. 이 시기엔 손가락 마디마다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 남자의 반지 중 문장이 새겨진 시그닛 링은 신분을 증명하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봉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 Portrait of Maximilian I
」 Albrecht Dürer, 1519
‘막시밀리안 1세’ 알브레히트 뒤러, 1519년.
근엄한 표정에서 권위가 느껴진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화다. 이 작품은 그가 사망한 해 그려진 것으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왼쪽 상단에 있는 황금양털 기사단 훈장과 왼손에 들린 석류다. 합스부르크가를 상징하는 쌍두 독수리 휘장 아래 걸려 있는 황금양털 기사단 훈장. 황금양털 기사단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기사단이었으므로 배지는 언제나 최상급 보석으로 장식했다. 한편 왼손의 석류는 부활의 상징이자 개인적인 엠블럼으로 해석된다. 모자 가운데 꽂은 멋스러운 브로치와 어깨에 두른 모피에서 유추할 수 있듯 막시밀리안 1세는 뛰어난 미적 안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럽 최고의 장인을 고용해 독특한 갑옷과 무기를 만들었고, 이를 잠재적 동맹국에 선물했다. 특히 갑옷은 예술품에 비견될 만큼 정교해 현재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다. 1477년 부르고뉴의 마리에게 청혼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넨 일화도 유명하다. 그는 다이아몬드 링으로 프러포즈를 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 Triple Profile Portrait
」 Lucas de Heere, c. 1570
‘세 남자의 옆모습 초상화’ 루카스 드 히어, 1570년경.
리본과 진주로 머리를 곱게 장식한 세 사람. 복장은 화려하고 피부는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데다 귀에는 드롭형 귀고리까지 달려 있다. 16세기 유럽의 지체 높은 귀부인들일까? 아니다. 1570년경 루카스 드 히어가 그린 이 초상화 속 인물은 사실 남자다. 이들은 바로 프랑스 앙리 3세의 총신, 미뇽(Les Mignons)이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고상한 사람’을 의미하는 미뇽은 당시 왕이 특히 아끼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이들의 역할은 왕의 곁을 지키면서 사근사근한 말과 행동으로 기분을 살피는 것.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치의 셋째 아들인 앙리 3세는 원래 지적이고 세련된 취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이후 동성애적인 성향과 과도한 사치, 미뇽들에게 베푼 지나친 정치적·재정적 총애로 지탄을 받았다. 그는 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한 향수를 뿌렸다고 전해지며, 그의 미뇽은 그림 속 주인공처럼 우아하고 패셔너블한 미청년들이었다. 엄격한 미적 기준으로 선발된 ‘왕의 남자’인 셈이다.
「 Portrait of a Goldsmith
」 Sofonisba Anguissola, 1566
‘금세공사의 초상화’ 소포니스바 안귀솔라, 1566년.
오른손에 금장 오브제를 들고 있는 금세공사. 탁자 위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금반지가 하나 놓여 있고, 열린 주얼리 박스 속에는 네 개의 링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칼라와 커프 끝을 흰색 러플로 장식한 옷, 체인 네크리스처럼 길게 늘어뜨린 레이스 끈은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패션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여성으로서는 흔치 않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화가, 소포니스바 안귀솔라의 작품이다. 초상화와 자화상, 종교화를 주로 그린 그녀는 한때 스페인의 궁정화가로도 활동할 만큼 재능이 뛰어났다. 초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소포니스바가 스페인 궁정화가로 일하던 시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스페인 궁정을 중심으로 활동한 금세공사가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그림 속 반지와 오브제, 벨트 버클을 보면 16세기 중반의 주얼리 디자인이 어땠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일례로 금세공사가 왼손에 끼고 있는 핑키 링은 X자 꼬임 중앙에 보석을 세팅했다. 지금 껴도 손색없을 만큼 감각적이다.
「 Portrait of a Gentleman in Armor
」 Juan Pantoja de la Cruz, 16th century 이 그림은 알바 대공작으로도 불리는 제3대 알바 공작 페르난도 알바레스 데 톨레도(Fernando Alvarez de Toledo)의 초상으로 추정된다. 스페인의 최전성기를 이끈 대귀족이자 군인, 정치가로 유명했으며, 16세기 유럽사에서 등장하는 알바 공은 대체로 그를 가리킨다. 가혹하고 압제적인 통치로 악명도 높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그를 당대 최강의 장군, 스페인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는 명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알바 공의 초상은 대부분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16세기에는 예술 작품에 비견될 만한 갑옷이 다양하게 제작됐다. 당시 유럽 왕족과 귀족들은 아름다운 갑옷을 제작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각과 양각, 상감 등 정교한 조각 기법을 사용한 것은 물론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보석을 장식하기도 했다. 알바 공작의 초상화에도 화려한 갑옷과 투구가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황금양털 기사 작위도 갖고 있었던 만큼 그의 목에는 황금양털 기사단 훈장까지 걸려 있다.
‘갑옷을 입은 알바 공작의 초상화’ 후안 판토하 델라 크루즈, 16세기.
「 Portrait of a Young Man
」 Alessandro Oliverio, c. 1510-1520
‘젊은 남자의 초상’ 알레산드로 올리베리오, 1510~1520년.
16세기에는 실용적인 주얼리도 유행했다. 그중 하나가 개인 위생용 주얼리다. 일단 알레산드로 올리베리오가 그린 ‘젊은 남자의 초상’을 보자.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은 망토를 걸친 그림 속 남성은 여러 줄의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목걸이엔 끝이 뾰족한 펜던트가 달려 있는데 진주와 유색 보석까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바로 이쑤시개다. 비슷한 시기에 한스 말러가 그린 ‘안톤 푸거의 초상화’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한쪽 끝이 뾰족하고 반대쪽은 스푼처럼 말린 장신구가 등장한다. 이것은 이쑤시개 겸용 귀이개 펜던트다. 실제로 16세기에는 이쑤시개나 귀이개를 목걸이에 매달아 착용하는 일이 흔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사용하고 각종 보석으로 정교하게 세공한 것도 있었다. 사진이 등장하기 전까지 초상화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신의 재력과 외모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으므로 혼담이 오갈 때는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금보다 개인 위생 관념이 취약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초상 속의 이런 주얼리는 재력과 청결함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을 것이다.
「 Portrait of George Villiers, 1st Duke of Buckingham
」 Michiel Jansz. van Mierevelt, 1625~1626
‘초대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스의 초상화’ 미힐 얀즈 반 미레벨트, 1625~1626년.
최근 패션 트렌드로 다시 떠오른 진주는 역사적으로 남자들도 선호한 보석이었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부유층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 진주의 인기는 이 시기의 그림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대 버킹엄 공작인 조지 빌리어스의 초상화다. 크고 화려한 레이스 칼라 아래로 치장된 수백 개의 진주알. 그는 치렁치렁하게 두른 네 줄의 펄 네크리스를 의상 오른쪽에 고정해 스타일과 활동성을 높이고, 가죽으로 보이는 옷에도 크고 작은 진주를 꿰매 장식했다. 가슴 아랫부분에도 여러 가닥으로 엮은 진주가 있다. 무척이나 호사스러운 차림이다.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동성 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조지 빌리어스는 잘생긴 외모와 빼어난 말솜씨로 왕의 총애를 받아 벼락 출세를 했다. 1614년 왕실에 입성한 그는 결국 버킹엄 공작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무능한 탓에 많은 실책을 범했고 결국 35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다. 영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배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 Charles I in Three Positions
」 Anthony van Dyck, 1635~1636
‘킹 찰스 1세의 초상화’ 안토니 반 다이크, 1635~1636년.
같은 인물을 삼면으로 표현한 이 독특한 작품은 영국 궁정화가 반 다이크가 그린 찰스 1세의 초상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레이스 칼라 위로 보이는 커다란 진주 귀고리. 이 주얼리는 그의 다른 초상에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실제로 그가 늘 왼쪽 귀에 동일한 귀고리를 착용했기 때문이다. 찰스 1세가 언제부터 이 귀고리를 착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세 무렵의 초상화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꽤 이른 시기부터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진주 귀고리를 무척 좋아했고 죽을 때까지 함께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빼지 않았고, 1649년 영국혁명으로 처형당할 때도 이 귀고리를 끼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단두대에 오르는 순간까지 귀고리를 빼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알게 된 군중들이 왕의 진주를 쟁취하기 위해 몰려들었을 정도. 찰스 1세의 진주 귀고리는 시신과 함께 그대로 보존되었다가 장례가 끝난 후 딸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대물림되다가 현재는 영국 할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