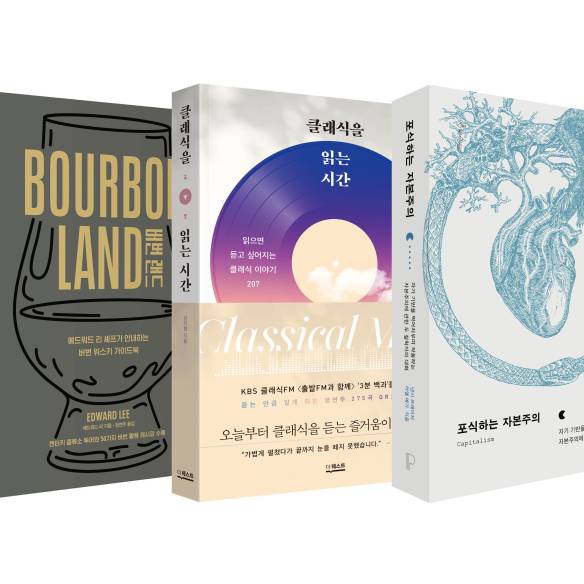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까치글방'의 서적들
까치가 물고 온 책.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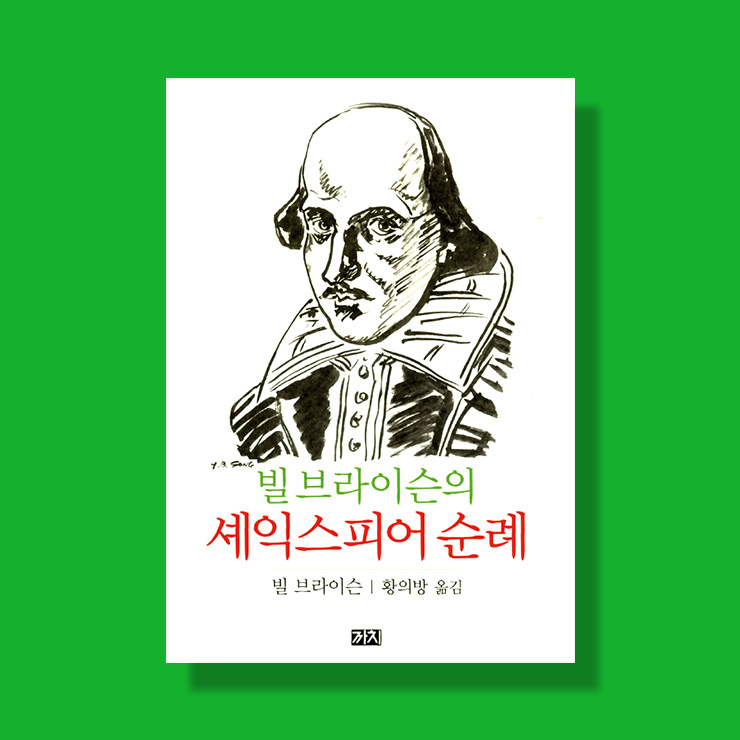
빌 브라이슨 <빌 브라이슨의 셰익스피어 순례>
“전문 서적을 꾸준히 내고 디자인과 편집 스타일을 고수하는 뚝심과, 확고하고 독특한 개성이 있는 곳이라서요. 출판인들에게는 이런 요소 때문에 일반적인 입지와 컬트적인 입지가 동시에 있죠.” 까치 창립자 박종만의 별세 기사가 퍼진 6월 22일 비룡소 편집자 김지호가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까치 책 하나쯤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가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빌 브라이슨의 셰익스피어 순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주변의 출판인들은 각자 자기의 까치를 가지고 있었다. HB 프레스 에디터 조용범 역시 묻자마자 까치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다 30대 중반에 출판에 입문했어요.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봤습니다. 제가 다닌 출판사는 디자인책을 많이 해서 ‘지면의 표정을 어떻게 다르게 할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까치의 그 책은 띠지의 앞뒤 내용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네’ 싶었습니다.” 까치 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이야기다. 살짝 웃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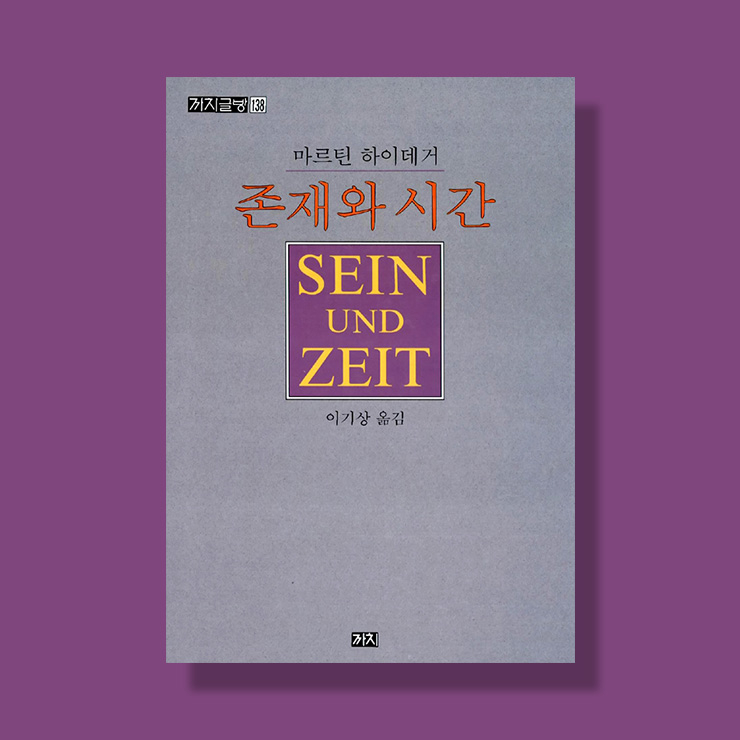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출판인들은 까치의 까치풍 표지가 촌스럽다고도 생각한 것 같지만 나는 이게 싫지 않았다. 까르띠에 탱크나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컨버스 척테일러나 펭귄 클래식 표지 레이아웃처럼 상징적인 디자인 원칙으로 보였다.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 LV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를 입은 개인은 때에 따라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로고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현대 디자인의 상징적인 요소다. 내게는 까치 표지가 그랬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면이 제게는 까치의 이미지였습니다.” 조용범의 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까치 책은 두껍고 요즘 책과 형태가 달라요. 여백도 별로 없고요. 좋은 책을 많이 내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건 근거 없고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다. 까치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500종 이상의 책을 발표했다. 책이 얇지도 않다. 여백이 별로 없다는 조용범의 기억도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쪽마다 한 글자라도 더 담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신국판보다 좌우로 3mm 키운 판형을 썼다.” <조선일보>에 실린 박후영 까치 대표의 말이다. 박후영은 고인의 자제다. ‘쪽마다 한 글자라도 더 담아’ 같은 생각을 하는 출판사는 은근히 별로 없다.
“신문에 많이 나오는 책을 내는 출판사, 얕볼 수 없는 책을 쓱쓱 내는 출판사 느낌이에요.” 출판사 어떤책 대표 김정옥은 이렇게 까치를 기억했다. “저는 박종만 대표가 돌아가신 후 기자들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인과 30세쯤 차이가 날 법한 30~40대 기자들이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아도 요즘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했다는 뜻이겠죠. 저도 출판업 종사자로 ‘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의 말처럼 <매일경제> 기자 김슬기, <조선일보> 기자 곽아람 등이 SNS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김슬기는 트위터에 “그분을 뵈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사히 신문>과 <뉴욕 타임스> 서평과 국내 신문 서평을 국내 출판인 중에 가장 열독하신다는 점”이라고 올렸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구마 겐고 등 일본 건축가 7명이 <아사히 신문>에 연재한 <세계의 불가사의한 건축 이야기> 같은 책도 나왔을 것이다. 이 책은 초판만 찍고 절판되었지만 중고 서점에서 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거래된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사뒀는데 영원히 펼쳐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 웨일북에서 <90년생이 온다>를 만든 편집자 김남혁에게도 좋아하는 까치 책이 있었다. 사두고 펼쳐 보지 않는 책, 이것도 까치 책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뭔가 더 알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 모든 일이 그렇듯 좋은 건 취하기 어렵고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책이 모든 답을 한 번에 주지는 못하지만 좋은 책은 좋은 음악의 악보처럼 분명히 뭔가를 읽어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까치는 그런 책을 만들었다. “저는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시간>을 좋아합니다.” 김남혁이 덧붙였다. 나는 언젠가 그가 했던 “어려운데 잘 팔리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라는 말을 기억한다. 까치는 그런 책을 계속 만들어온 회사다.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20세기 역사>
까치는 한국의 출판사다. 창립자 박종만은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잡지 <뿌리깊은나무> 편집부에서 일하고 1977년 까치를 설립했다. 첫 책은 차기벽의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많이 팔린 책은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와 빌 브라이슨의 책들이다. 박종만은 2020년 6월 14일 별세했다.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다 치른 후 언론에 소식을 전했다.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부고 기사를 냈다. 약속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기사의 주제가 똑같았다. 좋은 책을 많이 내 한국의 지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글을 다뤄온 자가 글을 다루는 자에게 인정받는 건 명예의 문제다. 출판인에게 좋은 책을 많이 냈다는 글로 남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박종만은 편집자 출신 출판인이다. 잡지 편집자 출신이다. (중략) ‘글 다루기’ 하나만큼은 제대로 익혔다.” <뿌리깊은나무> 전 편집장 김형윤이 박종만의 부고가 전해진 며칠 후 6월 27일 <중앙선데이>에 남긴 글이다. “<포크를 생각하다>를 쟁여두고 기사를 쓸 때 가끔 들춰 봐요. 까치 책은 믿음직한 자료라는 신뢰가 있어요. 희소성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잡지 에디터 출신 칼럼니스트 강보라의 말이다. 잡지인이 만든 출판사에서 나온 글이 다른 잡지인의 눈에 띄어 새로운 시대의 독자에게 끊임없이 전해진다. 불만과 불합리로 가득해 보이는 세상이어도 누군가의 손과 눈을 거쳐 좋은 것들이 조용히 이어진다. 앞으로도 까치가 좋은 책을 계속 내주시길 바란다.
WHO’S THE WRITER?
박찬용은 <에스콰이어> 전 피처 에디터다. 책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를 냈다.
Credit
- EDITOR 김은희
- WRITER 박찬용
- DIGITAL DESIGNER 이효진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