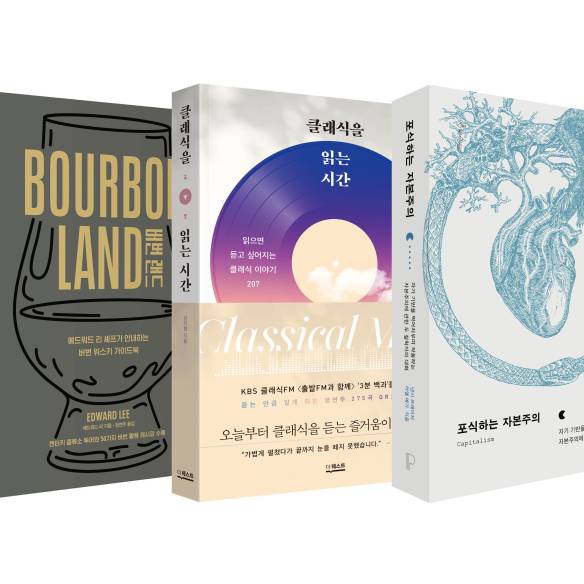프랑스 파리에 새로 문을 연 거대 미술관이 주목받고 있는 진짜 이유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옛 상공회의소 자리에 거대한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미술관은 단순히 그 규모와 소장품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84세의 슈퍼 리치 컬렉터, 프랑수아 피노의 꿈이 마침내 이뤄진 순간이기 때문이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어느 슈퍼 리치 컬렉터의 꿈
」여기, 슈퍼 리치인 남자가 있다. 1936년 프랑스 브르타뉴 촌구석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출세가 불가능할 만큼 절대적으로 공고한 프랑스의 계급을 뛰어넘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가 바로 프랑수아 피노(Francois Pinault). 이 글의 주인공이다. 발렌시아가, 구찌, 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등 명품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케링 그룹(Kering Group)의 설립자이자 전 회장인 그는 프랑스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르두트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포춘>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 세계에서 27번째로, 자국인 프랑스에서는 4번째로 재산이 많은 거부다. 그러나 그에겐 돈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자본 만능의 세상에서 오랜 시간 이루지 못한 숙원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세계 예술의 수도 파리에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할 미술관을 세우는 일이었다.

판테온 신전처럼 탁 트인 메인 홀을 장식한 우르스 피셔의 작품. 6개월간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양초 작품이기 때문에 매일 모양이 변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는 이미 조각상의 팔 한쪽이 사라져 있었다.
미술계에서 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피노가 한 아티스트에게 ‘파티에만 열중해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며 일침을 놓은 적이 있는데, 그 아티스트가 바로 현대미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장 제프 쿤스다. 단지 그가 돈만 많은 컬렉터였다면, 그가 쿤스에게 했던 일침은 우스갯소리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쿤스를 비롯한 미술계 인사들은 피노의 이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실제로 쿤스는 일침을 받은 후 심기일전해 작품 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빌처럼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며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부훌렉의 조각 설치 작품. 미술관 내 창가에서 보면 더욱 좋다. 특수 처리한 천 위로 파리의 햇살과 날씨가 아로새겨지니까.
이 정도의 집념과 열정으로 컬렉션을 꾸렸으니, 예술의 수도 파리에 자기 이름을 딴 미술관 하나 갖고 싶다는 열망이 들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다. 기실 ‘파리 미술관’에 대한 피노의 구상은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장소였다. 당시 피노가 점 찍은 장소는 파리 외곽 불로뉴의 세갱섬(Ile de Seguin)에 위치한 20세기 초반의 르노자동차 공장 부지였다. 버려진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도 없을 것 같지만, 피노의 계획은 초반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먼저 반대의 깃발을 들고 일어난 건 프랑스 정재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노조들이었다. 세계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된 자동차 공장에 럭셔리 그룹 총수가 개인 컬렉션을 모아두는 전시관을 세운다니, 대형 노조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인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던 불로뉴의 시장은 이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채 절차를 질질 끌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피노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개입을 망설였다. ‘지극히 프랑스적’이라고 할 만한 이런 상황이 이어진 끝에 피노는 5년여 만에 두 손을 들고 항복 선언을 했다. 세갱섬을 포기한 것이다.

이보다 우아한 벤치를 상상할 수 있을까. 금빛으로 반짝이는 부훌렉의 벤치는 건물 외관을 따라 곡선을 그린다.
프랑스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문화예술계에서 공권력이 강한 나라다. 세계적인 박물관인 루브르나 오르세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의 박물관 중 70% 이상이 모두 국립이거나 지자체 소속이다. 미국의 게티 센터나 구겐하임 같은 사립 미술관은 프랑스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프랑스에서, 게다가 쓸 만한 부동산을 찾기 극히 힘든 파리에서 개인 미술관을 세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까?

피노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일부러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작은 이 말하는 생쥐다. 다들 사진 찍는다고 난리인데, 사실 사진을 안 찍을 수 없는 귀여움이란!

앞에는 셰리 레빈, 뒤에는 루이스 로울러. 쟁쟁한 미국 상원 의원들을 플라스틱 컵으로 풍자한 셰리 레빈의 대작과 1950년대 미국인의 삶을 재구성해 담아낸 루이스 로울러의 작품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걸려 있다. 마치 미국의 그제와 어제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
프랑스에서는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미국 흑인 미술의 신화적 인물인 데이비드 해먼스(David Hammons)도 그중 하나다. 해먼스는 1970년대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다. 그는 아프리카의 미술 작품인 마스크를 모으는 백인 컬렉터를 조롱하기 위해 금속으로 가짜 아프리칸 마스크를 만들고, 산업이 되어버린 미국 프로 농구 NBA를 비판하기 위해 모조 다이아몬드 농구 골대를 만들었으며, 감옥 설치물에 ‘미니멈 세큐리티’라는 제목을 달아 미국의 흑인 문제를 정면에서 비판했다. 해먼스의 작품이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를 트위스트 시키듯, 피노의 파리 미술관 역시 문제의식 가득한 작품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대미술계의 아이러니를 조롱한다.

진짜 비둘기처럼 보이는 이 비둘기들은 마우리지오 카탈란의 작품이다. 유머러스한 카탈란의 특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러시아 컬렉터 추후킨의 인상파 작품을 프랑스로 옮겨온 추후킨 전시, 샤를로트 페리앙의 아카이브를 몽땅 털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던 샤를로트 페리앙 회고전 등을 열며 여타의 박물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예산과 규모가 필요한 대형 전시에 주력했다. 컬렉션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르노 회장의 컬렉션은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이나 쿠사마 아요이(Kusama Yayoi),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 등으로 현대미술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현대미술계의 안전자산 블루칩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루이 비통 재단은 ‘아케팅(artket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아트와 마케팅을 결합한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아르노 회장의 퐁다시옹 루이 비통은 프랑스 현대미술계를 쥐락펴락하는 전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 큐레이터 쉬잔 파제(Suzanne Page)가 전시 디렉터로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는 만큼 현란할 정도로 능수능란하며 프로페셔널하다.

NBA 팬이라면 데이비드 해먼스의 이 작품을 눈여겨보자. 크리스털로 둘러싼 농구대를 통해 NBA의 상업성을 현대미술 작품이라는 우아한 형태로 고발하고 있다.
피노 미술관은 루브르와 퐁피두를 잇는 박물관 벨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척에는 19세기에 새워진 초대형 백화점 사마리텐(Samaritaine)이 오너인 LVMH 그룹의 진두지휘 아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6월 23일 재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 미셸 페로가 재단장한 문화재급 건축물인 루브르 우체국이 위치한다. 세계 미술의 노른자인 파리, 그 파리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에 드디어 문을 연 피노 미술관을 보자니, 북한의 고향으로 소를 몰고 떠났던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오버랩됐다.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인생 말엽에 마침내 소원을 이룬다는 자본주의의 신화를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일 것이다.
PHOTO courtesy of Bourse de Commerce - Pinault Collection by Stefan Altenburge
PHOTO Aurélien Mole
PHOTO Marc Domage
PHOTO Studio Bouroullec
Credit
- EDITOR 김현유
- WRITER 이지은
- DIGITAL DESIGNER 김희진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