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ECH
챗GPT를 어시스턴트로 고용해봤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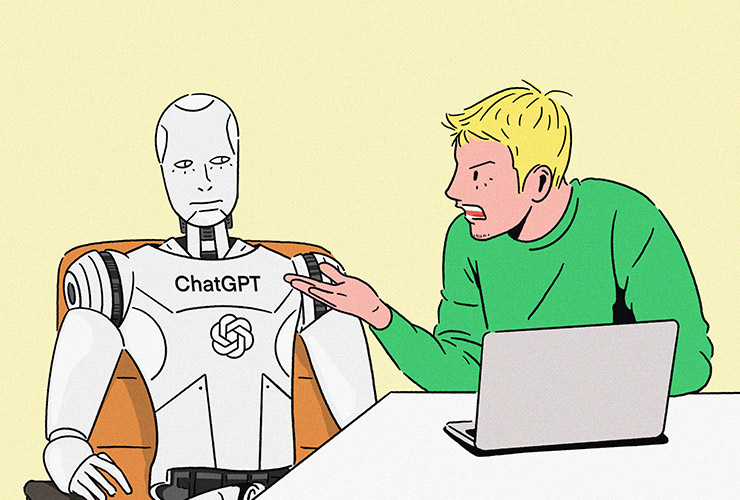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 중엔 이런 것이 있다. 팀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5개의 와인’ 또는 ‘지금 서울에서 당장 가보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하는 레스토랑 5곳’ 따위의 기획안을 들고 내게 오면, 에디터와 함께 이 기사를 어째서 지면에 실어야 하는지 편집장을 설득한다. 기획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을 5개만 꼽는 건 바쿠스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체 ‘맛있는’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누군가는 꽉 찬 육각형의 맛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컬트와인이 가장 많은 맛을 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루비처럼 빛나는 부르고뉴 피노 누아의 섬세함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최상의 맛이라고 주장할 텐데. 게다가 문장 그 자체에 어폐가 있다. ‘가장’이라 써놓고 5개를 꼽겠다는 건 대체 무슨 엉터리 소리인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5개의 와인을 꼽는 일은 취향의 싸움으로 변질된다. 그게 꼭 와인일 필요는 없다. 질문이 ‘지금 제일 핫한 여돌 노래 5곡’이거나 ‘당장 가봐야 할 서울의 라이브 클럽 11곳’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취향이다. 그런데 이 취향이라는 건 타인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팀원 A가 ‘지금 가장 연기를 잘하는 아이돌 출신 남녀 배우 5명’이라는 기획을 진행한다고 해보자. A는 연기돌 리스트를 뽑아 나와 상의할 것이다. 그런데 하필 나는 얼마 전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를 봤고, 그 드라마에서 아이돌 출신인 박지훈의 폭발적인 연기에 감탄한 나머지 엉엉 눈물까지 흘려버렸다. 아뿔싸. A가 가져온 리스트에는 박지훈이 없었다. 내가 보기엔 지금 최고의 연기돌인 박지훈이 빠져 있다면 그 리스트는 이미 죽은 리스트다. “<약한 영웅> 엄청 화제였는데 안 봤어?”라며 퇴짜를 놓을 것이다. A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재수가 없다. 한국에 있는 연기돌의 모든 작품을 다 보고 리스트를 짤 수는 없지 않은가? “안 돼 안 돼. 이 레스토랑은 오픈하자마자 이미 쿨타임 끝났어. 가볼 사람은 다 가봤다고”라며 리스트를 다시 고쳐 오라고 할 때마다 A는 물론 B와 C의 동공은 항상 격하게 흔들린다. 뭐든 아는 척하는 내가 얼마나 재수 없을까? 이해하고도 남는다.
챗 지피티를 어시스턴트로 삼아본 이유는 누군가 내게 ‘웬만한 어시스턴트보다 낫다’고 말해줬기 때문이다. 그래, 세상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챗 지피티니까 잘만 가르치면 리스트업은 기똥차겠지, 라는 기대도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 5곳’은? 챗 지피티가 답한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 사람, 트렌드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며 개인적인 주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평점이 높은 레스토랑, 인기가 높은 레스토랑, 최신 트렌드의 레스토랑 등을 찾아보세요.” 이 답을 처음 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그동안 ‘지금 가장 핫한’이라는 엉성하고 게으른 표현으로 에디터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2021년(챗 지피티가 습득한 데이터는 2021년까지다) 이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자주 언급되는 레스토랑 5개’를 꼽아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자 챗 지피티는 임정식 셰프의 정식당과 함께 시골밥상, 안국역에 있는 한식 뷔페를 추천했다. 영어로 질문을 던지니 ‘레스토랑’의 범주에 돼지국밥집이나 청국장집도 들어가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질문을 던지는 법을 고치며 ‘서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가진 복합적인 의미를 챗 지피티에게 전달해보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에서 자주 언급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5개’를 요청하자 그제야 50% 정도 흡족한 ‘밍글스, 라연, 정식당’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어 ‘2021년 이전에 인스타그램에 가장 자주 태그된 코리안 프렌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을 요청한 후에야 밍글스, 발우공양, 스와니에의 조합이 나왔다.
그러나 이 리스트는 결국 미슐랭 레스토랑의 교집합일 뿐이다. 잡지에서 낸 리스트에는 그 잡지의 리스트라는 걸 알아볼 만큼의 개성이 필요하다. 문득 한 DJ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곡의 신념에 대해 말한 게 떠올랐다. “스테이지에 있는 70%의 사람들은 모르고, 30%는 엄청 좋아하는 노래들의 조합으로 셋리스트를 짜지. 30%가 흥분해 날뛰면 70%의 사람들이 동조하며 스테이지 전체가 그 셋리스트에 빠질 수 있거든.” 잡지에서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느낌이 딱 이렇다. 이런 선곡의 감각을 챗 지티피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뒤로도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바꿔 던졌다. 2021년을 기준으로, 내가 챗 지피티에게 원했던 레스토랑의 이름은 아마도 윤식당, 이타닉 가든, 류니끄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천은 받았지만 당시로선 아직 못 가봤던 레스토랑들. 그 뒤로도 열심히 질문을 바꿔가며 가르쳐봤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답은 얻지 못했다. 나는 오히려 챗 지피티와 대화하며 내가 진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 사람, 트렌드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며 개인적인 주관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만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에스콰이어> 3월호에 오성윤 에디터가 5명의 필자에게 부탁해 받은 ‘5명 이상이 함께 가기 좋은 10개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집단 취향의 총체 같은 정보들 말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여러 것들이 아날로그로 새겨진 주관의 세계를 환원주의적 환상으로 채우려는 시도인지도 모른다. 위스키 원액을 배럴에 넣고 16년 또는 21년 동안 숙성하는 방식 대신, 배럴에서 추출한 물질을 위스키에 넣어 단 5일 만에 위스키와 비슷한 스피릿을 만들겠다는 ‘비스포큰 스피릿’이 바로 이런 환원주의적 환상의 대표적인 예다. 나는 챗 지피티의 작동 방식에서 환원주의의 환상이 뚫어둔 구멍을 발견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오류들이다. “서울에서 가장 자주 인스타그램에 태그된 레스토랑 다섯 곳을 알려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챗 지피티가 꼽은 레스토랑 중에는 에크리튀르가 있었다. 에크리튀르는 홍콩에 있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다. “서울에서 작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클럽의 이름을 알려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클럽 리얼라이즈를 언급했다. 클럽 리얼라이즈는 부산에 있다.
나는 이런 오작동이 ‘환원할 수 없는 것’을 환원하려다 생긴 구멍이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웹에 저장한 텍스트 정보는 현실을 기호화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는 현실과 사건의 실체를 더 앙상하게 가끔은 왜곡해 표현한 문자 기호들의 집합이다. 이 집합을 학습해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재조합해내는 챗 지피티의 구조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2월 9일 세계적인 사이언스 픽션 작가 테드 창은 <뉴요커>에 챗 지피티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썼다. ‘챗 지피티는 웹에 있는 텍스트를 손실 압축(lossy compression) 형태로 읽어들이는 것이다. 결국 챗 지티피는 웹의 희미한 제이펙(JPEG) 이미지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챗 지피티에 관해 정확하게 정리한 표현은 없었다. 손실 압축의 특징은 비가역성이다. RAW파일을 JPEG으로 합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JPEG에서 RAW파일을 복원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대학원생들은 챗 지피티가 논문의 원문을 인풋으로 초록을 써 내려가는 것을 보고 환호의 함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초록을 보고 논문을 써낼 수는 없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나는 챗 지피티와 헤어졌다. 배우 이종석과 인터뷰를 하는 날이었다. 인터뷰 가는 길에 혹시 몰라 이종석에 대해 물었다. 챗 지피티가 답했다. “(전략) 2014년에는 <피 끓는 청춘>에서 라이벌 갱에 속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고등학생 박수하 역을 맡아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아니잖아. 박수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나는 성격이 나빠서 그렇게 구멍이 많은 어시스턴트와는 일하지 못한다.
박세회는 <에스콰이어 코리아>의 피처 디렉터이자 소설가다.
Credit
- EDITOR 김현유
- WRITER 박세회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CELEBRITY
#리노, #이진욱, #정채연, #박보검, #추영우, #아이딧, #비아이,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하늘, #옥택연, #서현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