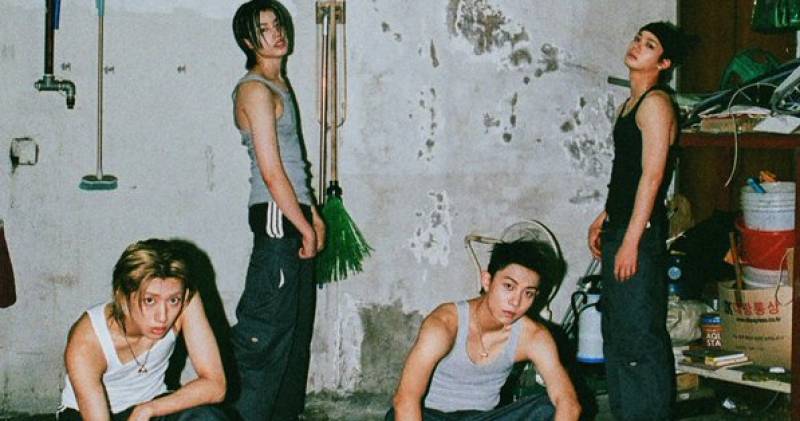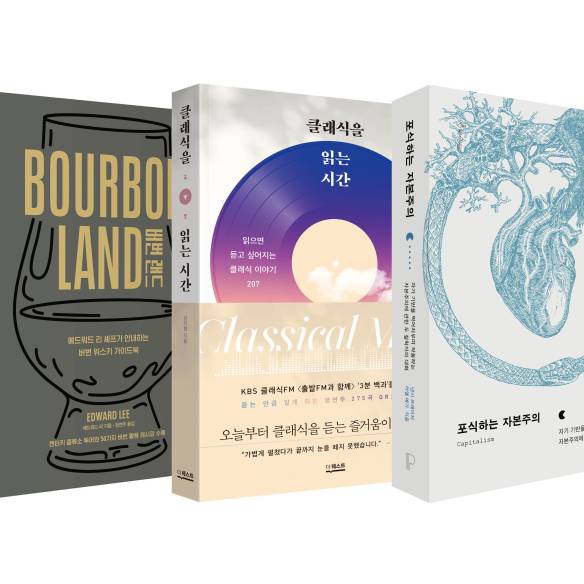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21세기 시위를 위한 문예선동 명곡의 조건
다시 만난 세계의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답은 나와 있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몸짓이라는 게 또 있었다. 민중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걸 몸짓이라고 했다. 정제된 말로는 문선이다. 문예선동이다. 문예로 선동을 한다는 뜻이다. 낯선 자들과 민중가요 외우는 건 괜찮았다. 몸짓은 정말이지 견디기가 힘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엑스세대다. 고등학생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의 춤을 따라 추며 자랐다. 갑자기 탈춤 같은 몸짓을 하라니 영 어색했다. 촌스러웠다. 엑스세대는 촌스러운 건 뭐든 죄악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한국의 첫 세대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MZ세대 여러분의 취향은 사실 내 세대에게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다. 모든 세대로부터 광역적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고 생각 없는 세대’라고 욕먹은 경험으로 따지자면 MZ 여러분은 내 세대를 능가할 수 없다. 소셜미디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엑스세대는 겹치는 세대였다. 절반은 몸짓이나 민중가요나 학생운동이나 다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나 읽는 놈팡이였다. 절반은 여전히 대학은 세상을 변혁하는 혁명의 근원이라 생각하며 <라틴 아메리카 혁명사> 같은 걸 읽는 정신적 운동권이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나는 둘 모두를 섞은 존재였던 것 같다. <라틴 아메리카 혁명사>를 읽으며 미제국주의에 분노하다가 <상실의 시대>의 책장을 덮으며 감동에 휩싸이곤 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 딱 잘라서 하나의 존재라고 정의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어쨌든 89학번이나 90학번 운동권 선배들은 엑스세대를 싫어했다. 대학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는 신입생들을 영입하는 것이었는데, 예전만큼 영업, 아니 영입하기가 힘들었던 탓이다.
사실 나도 운동권이 될 상당한 조건은 갖추고 있었다. 나 역시 ‘남들과 다르게 깨어 있는 나’를 사랑하는 대2병이었다. 그런 나를 전시하기에 운동권에 참가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었다. 문제는 역시 민중가요와 몸짓이었다. 나는 그걸 견디기에는 미제국주의의 상스러운 음악을 카피한 대중가요의 새로운 세련됨에 흠뻑 젖어 있었다. 게다가 나는 ‘게스’ 로고가 새겨진 스웨트셔츠를 입고 말보로 라이트를 피웠다. 그것만으로도 운동권 선배들에게는 기피 대상이었을 것이다. 과방에서는 미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 시대였다. 수업을 마치고 캐비닛에 책을 넣기 위해 단과대 건물로 갈 때마다 개량한복을 입고 잔디밭에서 몸짓을 연습하는 친구들이 보였다. 그중 하나는 1년 뒤 우루과이라운드 반대 시위를 하다 화염병을 잘못 밟고 넘어져 백골단에게 두들겨 맞은 뒤 구속됐다. 몇 달 뒤 그 친구는 감방에서 나왔다. ‘열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나는 냉소적인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냉소적인 사람 맞다. 다만 타인의 열정에 냉소하지는 않는다. 이 드라마틱한 나라의 드라마틱한 정치, 사회적 변화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지금도 한남동에서 은박지를 뒤집어쓴 채 한파를 버티며 운동하는 그들은 집에서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는 나보다 훨씬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변명하자면 성인이 된 후 나도 몇 번의 시위에 나갔다. 노무현 탄핵반대 시위는 마감도 끝내지 않고 뛰어나간 탓에 편집장으로부터 큰 꾸중을 들었다. 30대 초반이었다. 막내 기자였다. 일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던 초보 직장인이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시위에 참가했다. 문제가 있었다. 민주노총이 차려놓은 연단에서 연사들이 몸짓을 하며 열정적으로 토해내는 민중가요 중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아니, ‘바위처럼’을 빼고는 하나도 없었다. 삼다수에 끼얹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된 기분이었다.
솔직히 말하자. 민중가요는 어느 순간 시대를 놓쳤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시위의 주체가 달라졌다. 주체의 세대가 달라졌다. 내가 대학 때 배운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더는 부를 수 없는 노래다.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라니. 소련은 없다. 붕괴했다. 북한을 더는 헤어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세대가 왔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를 타고 가고 싶어 하는 젊은이도 더는 없다. 그보다는 도쿄행 항공권을 끊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다. 그렇게 민중가요가 멈춰 선 시점에 케이팝이 새로운 민중가요가 됐다. 총장 퇴진 시위를 벌이던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다. 나는 그것이 옛 민중가요의 죽음이자, 새로운 민중가요의 탄생을 선언하는 시대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화여대 시위대는 자신들의 투쟁이 운동권과는 관계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의 시위는 조직이 있었다. 모든 시위는 총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화여대 시위대는 달랐다. 운동권 혐의를 받은 학생의 발언을 막았다. “운동권 나가!”라는 직접적인 구호와 함께 막았다.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시위 출입도 제한했다. 순수한 학생이 아닌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두고 진보 매체들은 혀를 찼다.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라거나 ‘비민주주의에 기댄 느린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바위처럼’이 아니라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철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의 ‘꿘혐오’가 싫었을 것이다. 운동권과 벌레를 합성한 ‘꿘충’이라는 단어가 혐오스러웠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이 글에서 운동권이 왜 몰락했는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내놓을 생각은 없다. 이유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세대가 달라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운동권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가 낯선 것이다. 운동권의 가장 큰 언어는 노래다. 노래는 시위의 필수 조건이다. 노래는 시대를 반영한다. 한때 민중가요는 시대를 반영했다. 1990년대 이후로 민중가요는 성장하지 않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구호가 필요하다. 목소리가 필요하다. 노래가 필요하다. 노찾사나 윤민석보다는 대중가요에서 언어를 찾아야 한다. 존 레넌의 ‘Imagine’이나 오아시스의 ‘Roll With It’, 첨바왐바의 ‘Tubthumping’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은, 차트를 휩쓸었던, 한 세대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새로운 민중가요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새로운 민중가요는 탄생하고 있다. 한남동 집회가 증거다. 조직의 힘이 아니라 개인의 힘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의 ‘위플래시’, 로제의 ‘아파트’가 흘러나왔다. 민주노총 아재들이 카톡방에서 샤이니의 ‘링딩동’과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를 공유하며 외운다는 소식도 있다. 새로운 민중가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자, 당신은 이 노래들에 민중가요의 자격이 있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가사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노래가 왜 투쟁가가 되어야 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게 다 요즘 노래를 안 들어서 그렇다. 지금 케이팝에서 중요한 건 가사가 아니다. 박자다. 리듬이다. 비트다.
그렇다면 몇 가지 제안을 해보자. 어떤 케이팝이 새로운 민중가요로서 아름답게 기능할 수 있을까. 일단 영어 가사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나이 든 양반들은 영어 가사 따라 하는 게 힘들다. 지나치게 변칙적인 박자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따라 부르기 쉽다. 아주 미묘하고 간접적이나마 시위에 어울리는 가사가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따져보자면 ‘다시 만난 세계’만 한 노래가 없다. 영어도 없고 변칙적인 리듬도 없으며 메시지도 희망차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라는 가사는 21세기 민중가요로 완벽하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역시 그렇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늘 밤은 삐딱하게’라는 가사는 세상에서 가장 안온하게 살아온 사람의 심장마저 삐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강건한 버니즈로서 나는 뉴진스의 ‘Hype Boy’를 추천하고 싶다만,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영어 가사다. 영어 가사가 좀 있지만 ‘Ditto’는 시위에서 울려 퍼지면 꽤 근사할 것이다. ‘라타타타 울린 심장 라타타타’라는 가사는 모든 세대의 심장을 울리는 힘이 있다. 문제는 ‘Stay in the Middle’이라는 가사다. 이건 ‘중도를 사수하라’는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아니 뭐 어떤가. 사실 지금 시위에 열정적으로 나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정치적 중도로 규정하니까.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은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소구할 법하다. 트와이스의 ‘Cheer Up’도 응원가로서 훌륭하다. 문제는 “여자가 쉽게 맘을 주면 안 돼”라는 젠더 의식의 초라한 가사다. 이것만 ‘국민이 쉽게 맘을 주면 안 돼’ 정도로 바꾸면 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권하고 싶은 새 시대의 민중가요는 오마이걸의 ‘비밀정원’이다. 일단 영어 가사가 압도적으로 적다. 따라 부르기도 쉽다. ‘아마 언젠가 말이야/ 이 꿈들이 현실이 되면/ 함께 나눈 순간들을/ 이 가능성들을/ 꼭 다시 기억해 줘’라는 가사는 광장을 채운 모두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약간 처연감을 주는 단조라는 점 또한 증명된 문선 명곡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공통점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역시 소녀들의 시대다. 소녀들이 세상을 바꾼다. 소년들도 좀 분발하자.
김도훈은 글을 쓰는 사람이다. <씨네21> <GEEK>과 <허프포스트>에서 일했고 에세이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를 썼다.
Credit
- EDITOR 박세회
- WRITER 김도훈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CELEBRITY
#리노, #이진욱, #정채연, #박보검, #추영우, #아이딧, #비아이,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하늘, #옥택연, #서현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