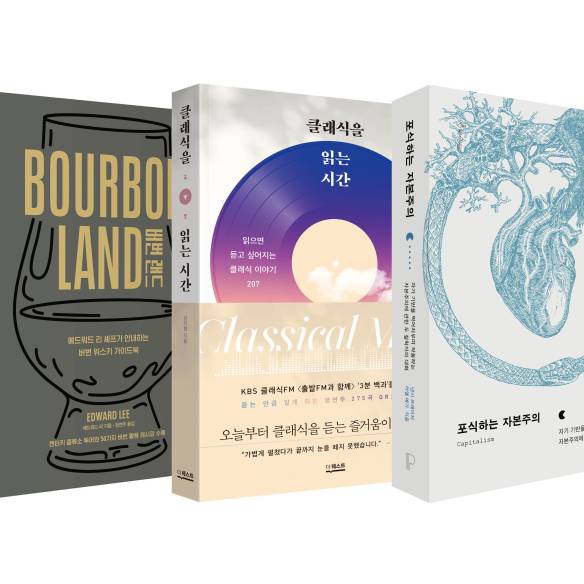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서점을 운영하는 시인이 부려놓은 메모 조각
시인이 직접 정리한 다양한 책들의 독후 기록.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서점지기의 문장들
」

나 잠깐만 죽을게 단정한 선분처럼
<수학자의 아침>, 김소연, 문학과지성사, 2013
빈곤했던 겨울이 끝나간다. “아침 날이 참 좋아. 오늘의 네가 그러하길”이라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찾아오는 이가 없어 시무룩했던 며칠이었다. 가방을 추어올리고 씩씩하게 버스를 탔다. 궁 앞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잠깐 죽었던 겨울. 어떤 나란함이 우리를 가로질러갔을까. 대책 없는 긍정 앞에서 나는 또 별수 없이 마음을 수그린다. 오늘은 더 나아질 것이다. 서점을 찾아오는 독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미루는 일 없이 잘 마칠 것이다. 꼭꼭 씹어 밥을 넘기고 기분 좋게 이 길을 되짚어 집으로, 나의 포근한 침대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잠깐 죽었으니, 열심히 살아 있을 것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듯 어제까지 읽었던 페이지를 다시 펼친다. 기우뚱, 버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미색 낱장 위에 떨어지는 볕의 온기. 봄이다.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다.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 한길사, 1996
밤의 책장은 고민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수많은 책 중에서 나의 문장을 찾아내고 싶다. 그 문장은 나를 흔들어 깨워줄 것이 분명하다. 간절함에 사로잡혀, 독자들이 빠져나간 어두운 서점, 서가 앞을 서성이고 있다. 책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비밀을 품은 채 그저 가만할 뿐이다. 내 손이 닿을 때까지. 그 손이 펼쳐낼 때까지. 그러나 마침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책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멈춰 있던 흥건한 시간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필연적 우연. 그러니까 내 책을, 내 문장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다. 어젯밤 나는 한나 아렌트의 책을 꺼내 들었다. 서서 읽다가 주저앉아 읽다가 마침내 그것을 들고 나의 자리로 돌아와 스탠드 불빛을 밝혔다. 서점 내부의 그림자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데, 나는 그가 부려놓은 문장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세계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유해야 한다. 이 세계가 아름답고 웅숭깊어지도록.

나는 꽝꽝 언 들을 헤매다 들어온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울고 들어온 너에게>, 김용택, 창비, 2016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책을 덮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두 사람이다. 남자와 여자. 일행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거리를 둔다. 거리를 두고 시집을 살핀다. 한 사람이 왼쪽 서가로 가면 다른 이는 오른쪽으로 가고 때로 그 위치를 교환한다. 그들이 침묵을 이어가는 동안 나는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세계의 크기와 모양이 궁금하다. 어떤 필요에 의해 저들은 저토록 열심인 것일까. 그들이 각자 한 권씩 시집을 들고 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 계산을 마친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로의 시집을 건넨다. 아주 작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교환하면서. 나는 그 축하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 바보같이 하하 웃은 것은 물이 흐르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기 때문이다. 어떤 따뜻한 손이 내 속 무언가를 덥혀 나는 그런 소리이다. 이것 역시 봄이 아닐 수 없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난다면 어떤 춤을 추면서 너와 나는 둥글어질까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허수경, 문학과지성사, 2016
먼 나라에 살면서 시를 쓰고 있는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이곳은 저녁. 그곳은 새벽. 나는 나의 서점에서 친구는 친구의 서재에서 조용하다. 그는 쓸쓸하다 한다. 나는 나의 것과 그의 것을 견주어, 친구가 겪고 있을 감정의 크기와 넓이를 가늠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자주 ‘모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외국에서 모국어로 시를 쓰는 일이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 그는 이곳이 마냥 그립다 한다. 모든 것을 여기에 두고 온 것만 같다고. 이 역시 나는 알 수 없는 이야기. 아마도 평생 그렇겠지만, 그러니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나는 그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다. 언제 돌아오니, 하려다가 그만둔다. 그에게는 돌아오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의 집은 거기니까. 마음을 둔 곳을 고향이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것은 그저 통증을 더해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대신 나는 읽고 있던 시집의 한 문장을 건넨다. 아주 오래 타지에 살았으며,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시인의 것이다. 그곳이 어디이든 너와 내가 시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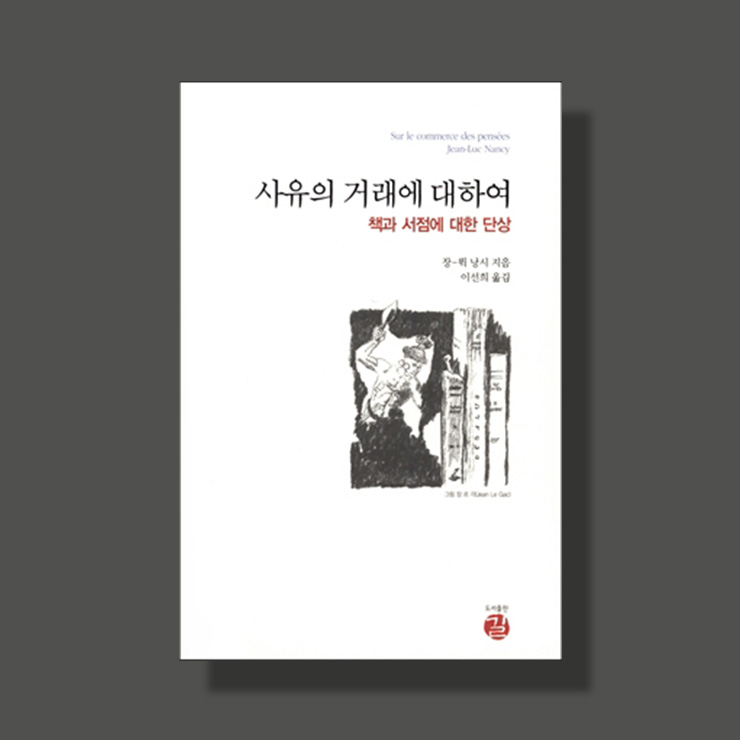
서점은 언제나 대로변에 있다. 그것은 책에서 책으로 말고는, 어느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길이며, 그 자신에게만 이어지는, 무한히 재인쇄되는 흔적과 활자만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감동적이면서도 섬세한 사유의 거래가 끊이지 않는 큰 길이 있다.
<사유의 거래에 대하여>, 장-뤽 낭시, 길, 2016
다시 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밤이다. 독자가 더 찾아와서, 더 많은 시집이 팔려서 어제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많이 읽었고 더 많은 밑줄을 그었다. 책은 책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커다란 창문 너머에,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나선계단에도 사람은 있고 그들은 모두 책이다. 그럼에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고민은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질문은 한없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매번 다시 밤의 책장 앞을 서성이며 운명적으로 만날 나의 문장을 찾아 책을 빼고 도로 꽂아두며 방황할 것이다.
「
이달의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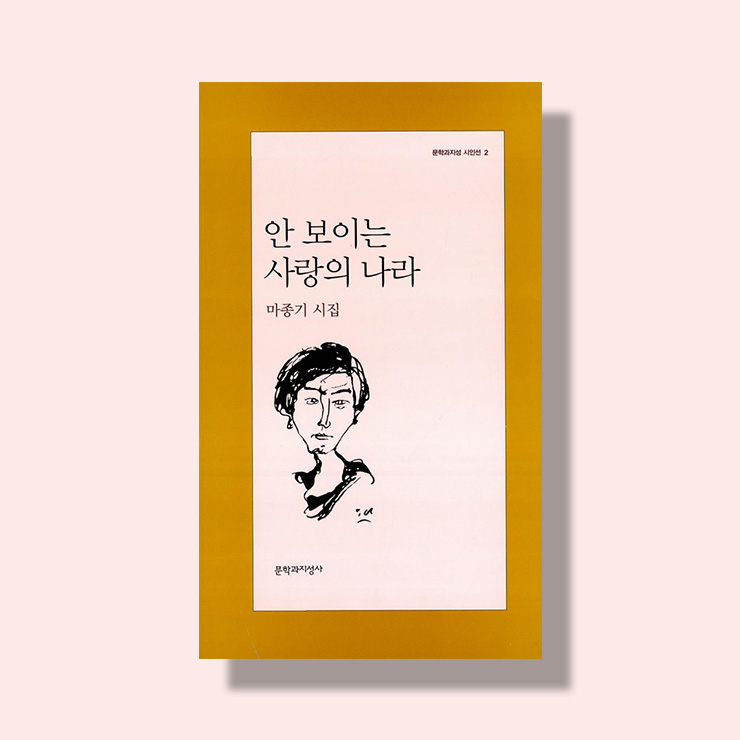
Credit
- EDITOR 김은희
- WRITER 유희경
- WEB DESIGNER 이효진
이 기사엔 이런 키워드!
- 시인
- 서점
- 이달의 시집
- 안보이는 사랑의 나라
- 마종기
- 수학자의 아침
- 김소연
- 인간의 조건
- 한나 아렌트
- 울고 들어온 너에세
- 김용택
-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 허수경
- 사유의 거래에 대하여
- 장-뤽 낭시
CELEBRITY
#리노, #이진욱, #정채연, #박보검, #추영우, #아이딧, #비아이,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하늘, #옥택연, #서현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