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10살 남자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
투명함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투명함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
© PER HOLM KNUDSEN
“우와, 진짜 크다!” 대여섯 살 때였나. 한참 정신없이 물장난을 치다 욕조에서 일어난 나의 허리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첫째는 그렇게 외쳤다. 단언컨대 사내아이 둘을 키운 지난 10년 중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다. 자신과 타인의 몸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있거나 없거나 크거나 작은, 그 차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그것. 다만 아이들만의 일도 아닌 것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 중,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악인이 자신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악의 거장’쯤 되는 인물의 간악한 사람됨을 평하며 꽤나 쓸쓸하게 내뱉은 표현을 대강이나마 기억한다. “그건 XX 크기 같은 거야. 애초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지.”
어찌할 도리는 없을지라도 언젠가의 우리처럼 녀석은 길이를 재고 어딘가에 기록을 해둔 모양이었다. 자기 물건의 크기를 알았다면 응당 더 넓은 세상과 비교하고 좌표에 객관적 자리매김을 해야 할 터. 무심코 들여다본 아이의 키즈폰 구글 검색어 목록에 ‘10살 남자 고추 크기’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다.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작든 크든 별 상관없다. ‘앞으로 얼마나 클지 누가 알겠냐’, ‘아빠가 너만 할 땐 너보다 더 작았다(물론 기억이 날 리 만무하다)’, ‘잘 씻는 게 먼저다’ 등등의 이야기를 농담을 섞어가며 생각나는 대로 주워섬겼고, 아이는 혼날까 잔뜩 움츠렸던 몸을 비비 꼬며 배시시 웃었다. 하지만 녀석의 호기심은 간단히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퇴근 후 부랴부랴 밥을 차려 먹고 언제나처럼 느긋하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할 땐 유튜브지. 그릇을 세제물에 불려놓고 아이패드 유튜브 검색창을 클릭했다. 나와 아내가 찾아볼 리 만무한 이전 검색어들이 주르륵 등장했다. 기가 막혔다. 남자. 고추. 마녀. 손. 하얀 물.
‘네가 무언가를 검색하면, 그리고 무언가를 보면 기록에 남는다.’ ‘엄마, 아빠는 그걸 다 알 수 있다.’ 처음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녀석은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기 물건 크기가 작은지, 보통인지, 큰지 정도를 알기 위해 시작한 검색이 점차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모양이다. 머리가 하얀 마녀 같은 여자가 남자의 고추를 잡고 흔들었고, 거기서 하얀색 물이 나오는 만화를 보았다고 했다. “자꾸 그 생각만 나고, 다시 보고 싶어. 멈추고 싶어요. 멈춰줘요, 아빠.” ‘움짤’ 정도에서 발견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 한동안 고민하고 힘들었을 텐데 녀석이 나와 아내에게 그런 내색을 비치거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건 아무래도 걱정이었다. 일단 성교육이라는 걸 해봐야겠구나. 그런데 당최 어떻게?
“너 이놈의 자식, 손모가지를 분질러버린다!” 중학생 시절, 내 PC에 이른바 ‘야겜’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는 벌개진 얼굴로 그렇게 소리쳤다. 내가 학원에 간 사이 아버지 친구분 가족이 집에 놀러 왔고, 내 또래 아들내미 하나가 컴퓨터를 켜서 이리저리 만지다 문제의 게임을 실행시킨 모양이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날벼락을 맞은 나는 그 길로 자연스럽게 다시 밖으로 나왔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부친은 그 후로 그 일을 다시 입에 담지 않았다. 내 손모가지도 멀쩡했다. 학교에서도 이른바 ‘성교육’이란 걸 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긴 선생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남자와 여자의 성기 해부도를 보여주며 각각의 명칭을 설명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나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난 우리는 소중한 존재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고…. 아이들이 킥킥대면 선생들은 괜히 화를 내곤 했다. 뭘 어쩌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누구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나 역시 웃어른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묻지 않았다. 오직 기억에 남은 건 “딸딸이 치는 건 좋은데 손은 깨끗이 씻고 쳐. 병 걸린다”라던 멋쟁이 생물 선생의 이야기. 솔직하고 강렬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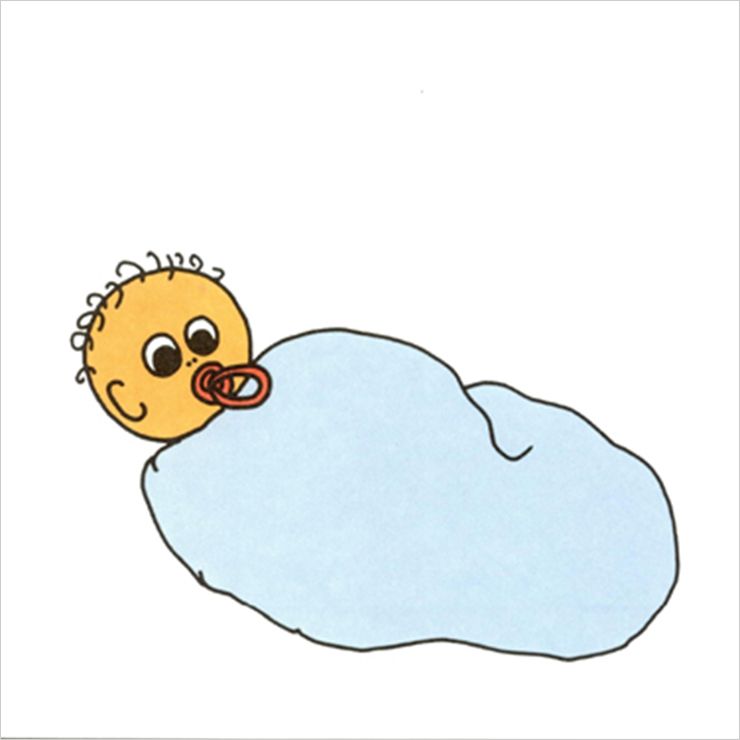
© PER HOLM KNUDSEN
그리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도 성교를 하는지, 자기도 그리 태어났는지, 지금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지금도 재미있는지.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사람들로 가득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을 땐 특히 그랬다. 그래도 적잖이 마음이 놓였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그리고 쓴 덴마크의 작가이자 심리치료사이며 성 연구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아주 평범한 그림책이에요. 특별할 때만 꺼내 보는 책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두고 보는 책 말이지요.” 이 책은 1971년에 처음 나왔다. 나 같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그 아이들은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으리라.
친구 집에서 처음 포르노를 보고, 처음 자위를 했을 때 궁금한 것들에 대해 알기 위해 읽을 만한 책이 있었다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 후로 내게 닥쳐온 수많은 답 없는 질문을 소리 내 말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뾰족한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 아이는 그러길 바라고, 답은 주지 못하더라도 다만 들어줄 수는 있기를 바란다. “딸딸이 치는 건 좋은데 손 씻고 쳐. 병 걸린다” 같은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머릿속이 하얗게 되기는 하지만.
WHO’S THE WRITER?
정규영은 <GQ> <루엘> 등의 피처 에디터를 거쳐 지금은 출판사 모비딕북스 편집장으로 있다.
Credit
- EDITOR 김은희
- WRITER 정규영
- DIGITAL DESIGNER 이효진
CELEBRITY
#리노, #이진욱, #정채연, #박보검, #추영우, #아이딧, #비아이,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하늘, #옥택연, #서현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