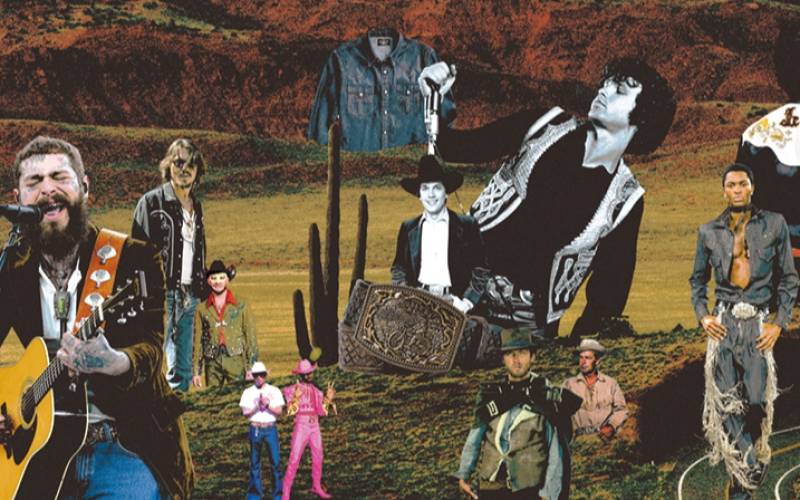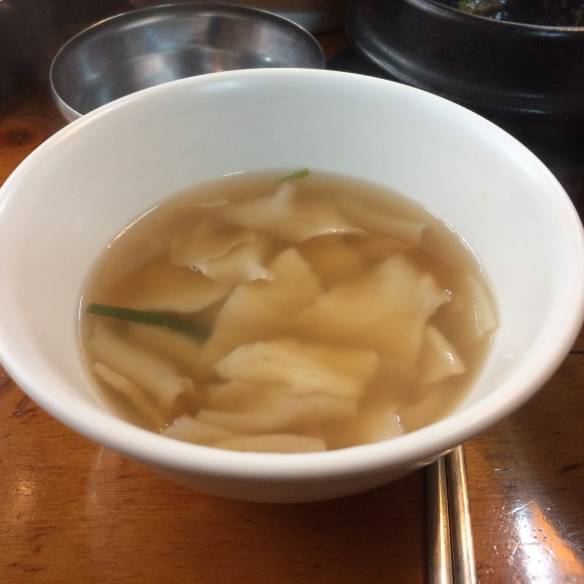FOOD
너무 두꺼워서 혹은 너무 무거워서 손이 안 가는 책들
못 읽거나 안 읽거나.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못 읽거나 안 읽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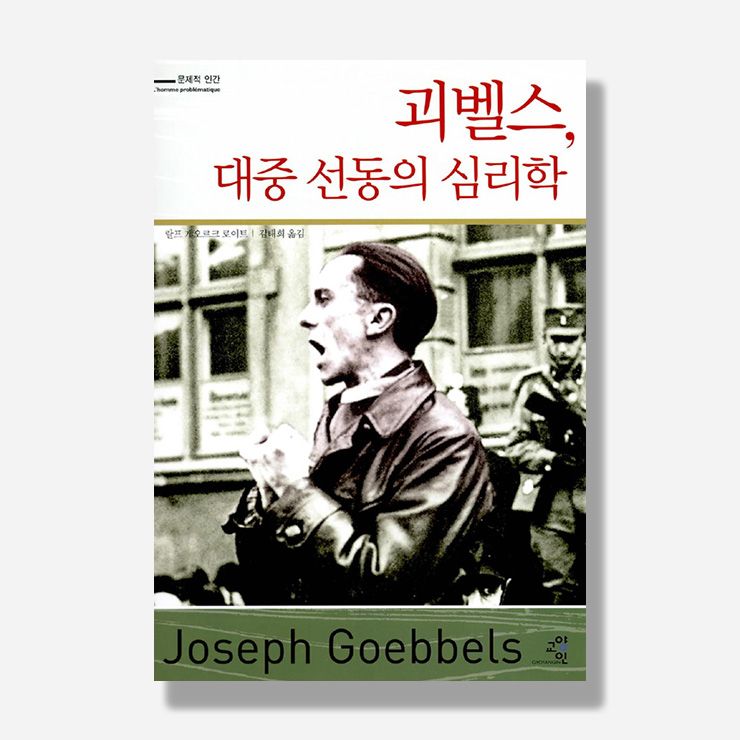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의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그때 산 책 중 하나가 노먼 메일러의 <숲속의 성>이다. 메일러는 평전과 논픽션과 픽션을 아름답게 섞은,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라 할 만한 글의 대가다. 영미권 잡지의 피처 기사를 뒤적거리다 보면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이름이기도 하다. 나 역시 메일러가 무하마드 알리를 다룬 책 <챔피언>을 즐겁게 읽었다. <숲속의 성>은 그런 메일러가 히틀러를 주제로 쓴 책이다. 아니, 이런 걸 안 살 수가 있나. 게다가 70% 할인인데. 하지만 사놓고 펴보지도 않았다. 이 원고를 쓰는 어느 일요일 밤에야 한번 펴봤다. 새 책을 펼 때 나는 ‘쩌억’ 하는 소리가 빈 방에 울렸다. 너무 좋을 게 뻔한데 안 보게 되는 책이 있다.
어떤 건 너무 두꺼워서 손이 안 가기도 한다. 도서정가제 기간에 산 책 중에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의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도 있었다. 요제프 괴벨스의 평전인데 총 1054페이지 분량이다. 이런 책을 보고 있으면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벤치프레스 앞에 선 기분이 든다. 원고를 쓰는 도중 확인해보니 나는 이 책을 45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다.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은 제목 때문인지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도 잘 팔린다. 이 책을 산 다른 분들은 다 읽었는지 궁금하다.
다 읽지 못했지만 처분하지 못하는 책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역시 두께다.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근처에는 <문 앞의 야만인들>이 꽂혀 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은행에서 일하다 지금은 미국으로 떠난 지인이 집을 정리하며 ‘꼭 읽어보라’는 말과 함께 내게 준 책이다. 사모펀드 KKR이 전통의 제조 기업 RJR 내비스코를 인수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2007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경영 도서를 묻는 설문 조사를 했을 때 2위를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 1위는 <국부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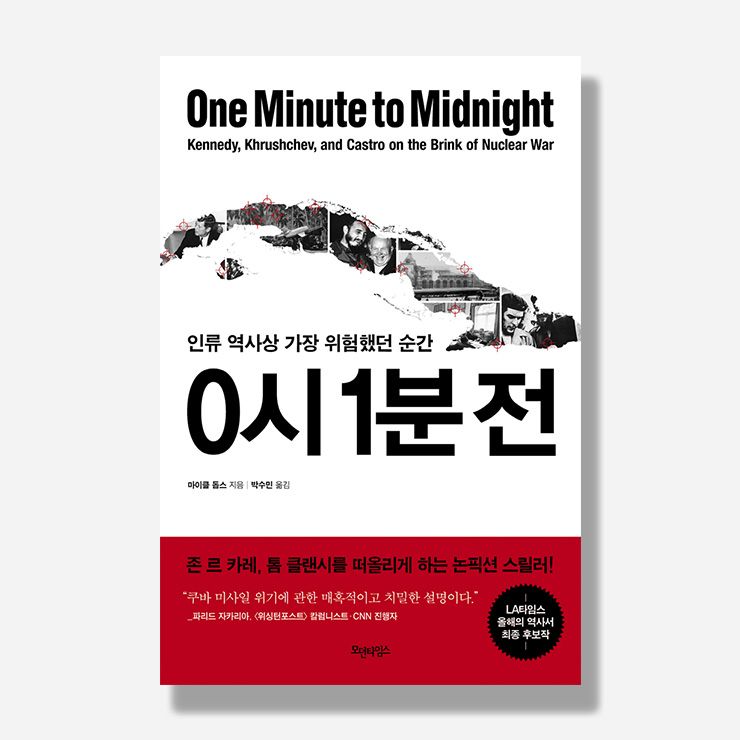
마이클 돕스의 <0시 1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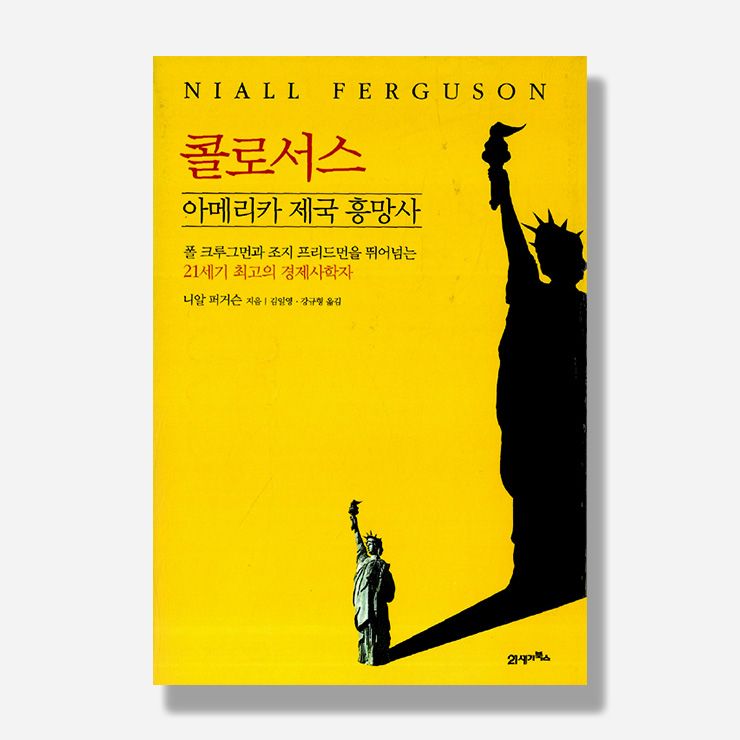
니얼 퍼거슨의 <콜로서스>
반대 경우도 있다. 한때 책 담당 에디터를 한 적이 있다. 책 담당을 하면 전문 통신사를 통해 봉투에 내 이름이 적힌 책이 무더기로 들어온다. 한번은 궁금해서 목록으로 만들어봤더니 1년에 500권 넘게 들어왔다. 홍보용 책은 어떻게든 소개되지 않으면 갈 곳을 잃고 버려진다. 그때 재미있겠다 싶어 틈틈이 챙긴 책들이 있다. 짐 바우튼의 <볼 포>는 연봉을 알렸다가 MLB에서 엄청난 따돌림을 당한 짐 바우튼의 이야기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노동권 확립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에마뉘엘 카레르의 <왕국>은 2014년 프랑스에서 화제가 된 초기 기독교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다.
왠지 이쯤 되면 내가 이 책들을 어떻게 읽었을지 감이 오지 않나? 이런 책들은 초반 약 70페이지까지는 놀랄 정도로 흥미롭다. 그런데 뭐랄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한 개를 다 먹기 힘든 카스텔라처럼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건 책이 아니라 독자인 나의 문제다. 당시 나의 평정심 문제, 아니면 나의 절대적인 지력 또는 의지력 부족 문제. 혹시나 책을 읽는 여름 별장 같은 거라도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읽을 텐데 내게는 아직 별장과 시간이 없다. 다행히 두껍고 재미있는 책은 책장 안에 넘칠 듯 쌓여 있다.
책을 사는 데에도, 버리는 데에도, 버리지 못하는 데에도 각자 이유가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뭔가 신성한 상징물로 여기기도 한다. 나는 그 생각엔 반대다. 옷이나 다른 물건과 책은 별로 다르지 않다. 책이 안 신성한 게 아니라 다른 물건 역시 책만큼 신성하다. 대신 나는 책을 좋아한다. 소중한 책은 내가 다 읽고 못 읽고를 떠나서 버리지 못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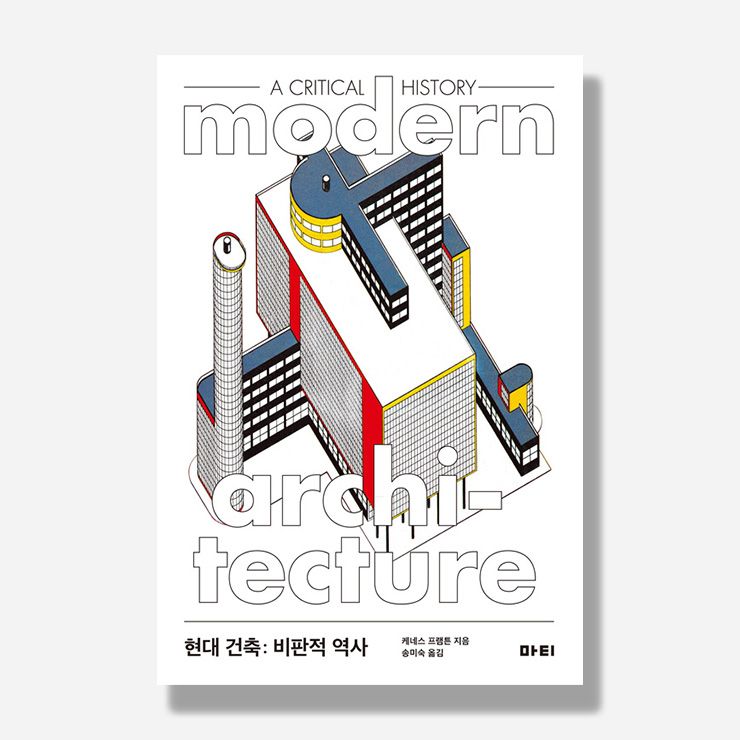
케네스 프램튼의 <현대 건축: 비판적 역사>
특히 이런 전문 서적은 후반 작업이 아주 고되다. 전 세계 건축가 이름의 철자를 틀리지 않게 쓰는 것, 각 도판에 알맞은 캡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 영문 참고 문헌을 빼놓지 않고 성의 있게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정신의 스쿼트 1000개 같은 고된 노동이다. 이런 책을 샀다면 좀 재미없고 딱딱하다고 해도 어떻게 버리나. 응원의 의미로라도 책장에 모셔둘 수밖에. 나는 책이 좋아서 책을 즐겁게 읽다가 책과 비슷한 뭔가를 만드는 걸 직업 삼게 됐다. 독자일 때는 모르던 요소가 보이는 건 가끔 슬픈 동시에 대부분 기쁜 일이다.
열지 않을 테지만 버리지 못할 마지막 책들은 내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폐간된 잡지들이다. 2010년의 <오프>라는 여행 잡지와 2014년의 <젠틀맨>이라는 남성 잡지를 아시는지? 당신은 몰라도 내가 안다. 내가 폐간호 혹은 거의 폐간 직전까지 참여한 잡지니까. 매번 이사할 때마다 허리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들고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버리지 못하겠다. 한때 월간지 에디터였던 자의 카르마의 무게랄까.
WHO’S THE WRITER?
박찬용은 <에스콰이어> 전 피처 에디터다. 지금은 매거진 <B>에서 일한다.
Credit
- EDITOR 김은희
- WRITER 박찬용
- DIGITAL DESIGNER 이효진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