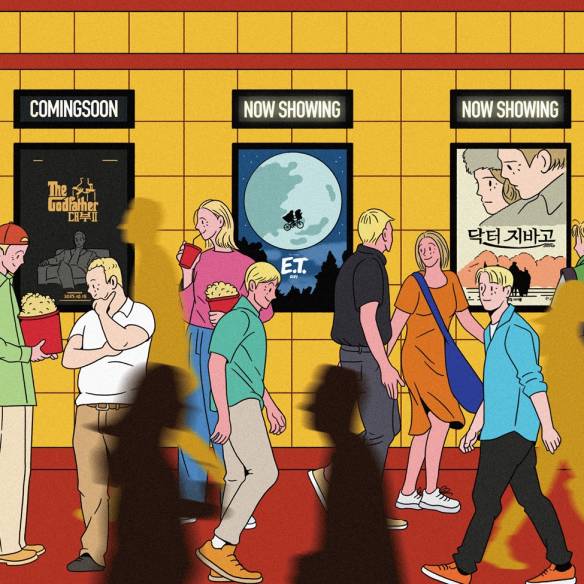LIFE
왜 어떤 책들은 중고 시장에서 터무니 없이 비싸지는가?
양서지만 2쇄를 찍지 못하고 절판됐다. 역시 프리미엄이 붙었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책의 리셀가
」
<베테랑>은 정말 재미있다. ‘베테랑’은 소설집 이름이자 이 책의 첫 소설이다. 런던 어느 동네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 한 노인이 죽는다. 안타깝지만 흔한 동네 싸움이다. 그런데 그 뒤로 과거와 현재와 일상과 대의와 정의와 편법이 엇갈리며 온갖 이야기가 독자의 머릿속을 휘감는다. 오래된 위스키의 향처럼 단순한 듯 오묘한 대가의 솜씨다. 그러나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중편소설 모음의 운명은 한때 남대문 수입 상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니치 싱글 몰트위스키의 운명과 비슷했다. 이 책은 품질을 떠나 한국에서 팔릴 책이 아니었다. 내가 갖고 있는 한국어판 <베테랑>은 1판 1쇄다. 2쇄를 못 찍었을 거라는 데에 맥켈란 12년산 한 잔쯤은 걸 수 있다.
책과 작가와 회사의 운명이 다 다르다. <베테랑>을 출판한 동방미디어는 2007년 이후 신작이 없다. 프레드릭 포사이드는 사실 꽤 유명한 작가다. 전 세계적으로 7000만 권 이상의 책을 팔았고 2015년에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 후에도 또 신작 소설을 낼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다. 다만 한국어판으로는 2010년 작 <코브라> 다음으로 나온 책이 없다. 한국어판 <베테랑> 시세만 이상하게 높다. 2020년 8월 알라딘 중고 서점 기준 중고 <베테랑>의 가격은 최하 2만8천원이다. 2003년 출판 당시엔 9천5백원이었다. 수익률로 치면 300%쯤 된다. 출판사도 사라지고 작가도 한국 출판계에서 잊혔지만 왜인지 모를 이유로 이 중편집 한 권만 정가 이상의 리셀가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부르는 게 값인 책도 있다. 존 르 카레의 1986년 작 <완전한 스파이>가 그렇다. 이 책은 놀랍게도 원서인 <A Perfect Spy>가 출판된 1986년 9월에 한국어판이 출시됐다. 더 놀랍게도 해외 에이전시와 정식 계약까지 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영문 서적의 일어판 번역본을 정식 계약도 없이 막 베껴서 중역 출판하던 게 당시의 출판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저작권 개념이 희박한 정글 같은 과거가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한국어판 <완전한 스파이>의 문제는 상·하권 중 하권에 있다. 어느 헌책방에 가도 하권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도 찾아보시길.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올 거다. 나도 우여곡절 끝에 상권만 손에 넣었다. <베테랑>의 중고 시세 이야기를 해준 지인은 "<완전한 스파이> 하권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라는 말도 했다. 혹시 오래된 책장에 나라기획판 <완전한 스파이> 하권이 있다면 기뻐하셔도 좋다. 위스키 한 병쯤은 마실 수 있을걸.
지난달 이 지면에서 까치 출판사를 다룰 때 언급한 <세계의 불가사의한 건축 이야기>는 정말 잘 만든 책이다. 나는 일본의 창작보다 평론을, 도전적 선언보다 비교 분석을, 무엇보다 꼼꼼한 색인을 좋아하는데 이 책이야말로 일본인의 그런 장점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세계의 훌륭한 건축물이 짧고 인상적인 글과 아주 잘 짜인 색인으로 소개되어 있다. 한국의 출판 명가 까치 역시 이 좋은 콘텐츠를 충실히 제작했다. 종이 질도 좋고 도판 사진도 훌륭하고, 옷으로 치면 새빌 로의 양복점에서 만든 튼튼한 재킷처럼 보수적으로 좋은 책이다. 그러나 역시 2쇄를 찍지 못하고 절판됐다. 역시 또 프리미엄이 붙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된 나는 어떻게든 이걸 사겠다고 마음먹었다. 1권은 정가보다 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구했다. 반면 2권의 리셀가는 최저 1.5배, 많게는 3배까지 뛰어 있었다. 그사이에 홀로 정가의 반값에 올린 판매 글을 보았다. 선량한 개인이겠지. 서둘러 입금하고 문자를 보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서도 "늦게 보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며칠 후 아주 좋은 상태의 책이 도착했다. 페이지를 펼 때마다 감사한다.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진 절판본이 생각보다 많다. <The Year of Magical Thinking(마술적 사유의 해)>이라는 책이 있다. 우아하고 강인한 미국 작가 조앤 디디온은 남편과 딸을 같은 해에 잃었다. 디디온은 이때의 마음을 책으로 썼고 이것으로 전미도서상을 받았다. 한국의 시공사가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지만 역시 절판됐고, 지금은 최대 5만원에 거래된다. 누군가 이런 건 책임감을 갖고 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정말 아름다운 책이니까.
중고 책의 비싼 리셀가를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노력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다가 나중에 값이 비싸지는 일, 그런 일은 심정적으로는 속상해도 살다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난다. 다만 리셀가가 뛸 정도로 좋은 책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좀 생각해볼 일이다.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비싼 중고 책 가격은 두 가지를 뜻한다. 그 책이 가치가 있다는 뜻, 그리고 그 가치 주변에 공급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뜻.
좋은 책이 사라지면 독자에게 손해다. 좋은 책은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 모두는 독자이니 좋은 책은 잠재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좋은 책을 구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손해다. 리셀가가 비싼 책이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소수의 업자를 뺀 모두가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뜻있는 누군가가 지금까지 언급한 책들을 내주면 정말 감사할 텐데,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출판도 사업이고 사업체가 모이면 업계가 만들어지는데 업계라는 곳엔 으레 경향이 있으니까.
가끔 경향을 뒤집을 만큼 큰 파도가 치기도 한다. 19세기 런던의 콜레라 대유행을 그린 <감염지도>라는 책이 있다. 과학 저널리스트 스티븐 존슨의 역작이고, 한국어판 역시 과학 서적 전문인 김명남의 번역으로 훌륭하게 잘 나왔다. 이 책도 절판되어 5만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서점가에 온갖 유행병 관련 책이 그야말로 유행병처럼 들어서고 있다. <감염지도>도 그 흐름을 타고 <감염도시>로 재출간됐다. 이 책의 리셀가를 보고 경악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기뻤다. 좋은 책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WHO’S THE WRITER? 박찬용은 <에스콰이어 코리아>의 전 피처 에디터다. 책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를 냈다.
Credit
- EDITOR 오성윤
- WRITER 박찬용
- PHOTO ⓒ GETTY IMAGES
- DIGITAL DESIGNER 이효진
JEWELLERY
#부쉐론, #다미아니, #티파니, #타사키, #프레드, #그라프, #발렌티노가라바니, #까르띠에, #쇼파드, #루이비통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