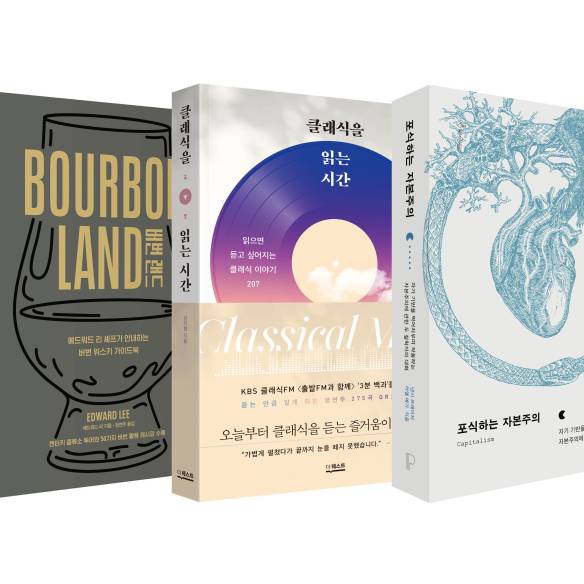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괴근식물, 이 독특한 식물에 깃드는 마음에 대하여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파키푸스는 마다가스카르섬의 남서부,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수백 년을 살기로 알려진 목본식물이다. 기껏해야 1.5m쯤 자라는데, 그 작은 크기로도 강인한 형세를 보여줘 ‘마다가스카르 식물의 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또 우직한 느낌에 비해서 잎은 작고 올망졸망한 편이죠. 왜 분재나 수경재배처럼 야생에 있는 형태를 조그만 곳에 옮겨 키우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감상하면서 키우기에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해요. 뿌리만 잘 내리면 실내에서 재배하기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이 파키푸스의 주인인 박두원은 자택은 물론 직장 옥상에도 괴근식물 여러 개를 두고 키우고 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를 중심으로 잘 배치해뒀는데, 그 광경에서 얻는 가장 큰 감상은 ‘위안’이라고 했다. “파키푸스를 비롯해 괴근식물이 대체로 굉장히 느리게 자라요. 몇 년을 키워서 겨우 주먹만해진다거나, 한 달에 잎 몇 개 겨우 난다거나. 그런데 그게 저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한테는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한정된 화분 안에서 흙, 물, 빛과 바람을 통제하며 얻어내는 미묘한 변화가 마치 예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천천히 자라는 그 템포에 제 삶의 템포를 한번 맞춰볼 수도 있고요.” - 박두원(회사원)


↑
고어플랜트서울은 세계 각지의 괴근식물을 취급하는 플랜트숍. 그 대표인 안봉환에게 당신의 식물 중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온갖 진귀한 것들 사이에서 아데니아 글로보사를 고른 건 이 개체가 최근 사람들의 경악을 들었기 때문이다. “전시 플랫폼과의 협업이 있어서 식물들을 챙겨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에서 아데니아 글로보사를 꺼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들 기겁하더라고요. ‘뭐야 저거?’ 하면서. 아마 살면서 이렇게 생긴 식물은 처음 봤으니까 그랬겠죠.” 아프리카 동부 연안에 서식하는 아데니아 글로보사는 울퉁불퉁 돌기가 솟은 철퇴 같은 몸통에서 가시 철조망 같은 가지가 날카롭게 뻗치는 형태를 가진 괴근식물이다. 처음 보면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는 모양새인데, 몸통의 형태도 가지가 뻗는 모양도 개체마다 가지각색이기에 매번 새롭게 놀라게 된다. 다만 안봉환의 말은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쉬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식물은 사실 따로 있잖아요. 얘는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는 멋있는 느낌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징그러운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괴근식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딱 내 눈에 멋있고 내 마음에 차는 식물이 따로 있다는 게, 결국 각자의 취향을 대변해주는 거잖아요.” - 안봉환(고어플랜트서울 대표)


↑
임용관은 현재 약 100개의 파키포디움을 키우고 있다. 대학생 때부터 쭉 좋아해왔고, 혼자 살면서 키우기 시작한 게 수가 조금씩 늘다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를 납득시키는 그만의 방식도 있다. “운동화 모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스니커즈 컬렉터들도 디테일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모델로 취급을 하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키우는 것 중에도 똑같은 종이 많지만 모양이 다 다르니까 모으는 재미가 있죠.” 파키포디움은 ‘두께’를 뜻하는 그리스어 ‘pachus’와 ‘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odion’의 조어로 만든 이름처럼 두꺼운 하부를 가진 다육식물로,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등지에 다양한 품종이 분포되어 있다. 다육식물로 분류되지만 가시나 잎을 가진 나무 같은 모양으로 자라나고, 그 조직은 단단하기보다 일종의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형태다. 그가 파키포디움이 가장 예뻐 보일 때로 꼽은 것도 바로 이때, 물을 줄 때다. “물을 주면 형태가 빵빵해지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색이 달라져요. 은회색이던 줄기에 아래에서부터 녹색이 올라오면서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거든요.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 임용관(의사)


↑
괴근식물 문화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북남미 등지의 식물인 코덱스를 중심으로, 넓게는 아가베, 박쥐란 같은 식물까지 포섭한다. “특히 아가베는 지금 국내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식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덱스와 선인장 사이의 식물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아무래도 가시가 가장 큰 매력이죠. 키우는 사람들도 좀 더 좋은 가시를 가진 아가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영진이 선보인 식물은 아가베 중에서도 우타헨시스라는 품종이다. 사실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아가베 식물은 티타노타며 우타헨시스는 한동안 유행처럼 떠올랐다가 빠르게 열기가 식고 있는 중인데,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이 품종이 제일 예뻐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덩이 같은’ 강렬한 인상에 첫 만남부터 매료됐었다고. 그는 현재 8개의 우타헨시스를 키우고 있으며, 이 개체는 개중 크기가 가장 크고 좋은 모양(짧고 뚱뚱하며 가시가 선명한 것을 상품으로 친다)을 띤 것이다. “그리고 처음 구했을 때는 얘가 깍지벌레에 당해서 많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이것저것 막 시도하면서 지금은 다 이겨내고 건강해졌는데,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부분도 있죠.” 척박한 땅에서 표면에 화상을 입거나 녹아서 생장점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옆을 뚫고 새잎을 돋아내고. 그는 그런 면면을 보면서 왠지 모를 힘을 얻는 것도 괴근식물의 묘미라고 했다. - 유영진(사진 영상 제작자)


↑
호리더스는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형태의 괴근식물이다. 채준병이 자신의 호리더스를 소개하는 첫 마디도 그랬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가정집에서 많이 키우던 소철 아시죠? 그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거리가 먼 식물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이기에, 국내 수입 자체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검역증서부터 수출허가증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수출, 반입이 되죠. 정식으로 수입하면 일종의 ‘족보’도 함께 받게 되고요.” 그가 자신의 유리온실을 가득 채운 온갖 식물들 중에서, <에스콰이어>에 소개할 식물로 호리더스를 고른 가장 큰 이유도 ‘희소성’이라고 했다. 개체가 적다거나 비싼 걸 넘어서 아예 국내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식물이니까. 물론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고, 개인적인 선호도 섞여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호리더스의 가장 큰 매력은 전체적 형태와 날카로운 가시가 주는 무게감이다. “남성적이고, 묵직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죠. 옆에 두고 있으면 어쩐지 든든하달까요. 그런데 또 이맘때쯤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해요. 1년에 딱 한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새싹을 내거든요. 이 잎이 조금씩 웨이브가 지면서 돼지 꼬리처럼 말려들어가는데, 그때 보면 참 귀엽다는 생각도 들어요.” - 채준병(인테리어 디자이너)
Credit
- EDITOR 오성윤
- PHOTOGRAPHER 정우영
- ART DESIGNER 최지훈
CELEBRITY
#리노, #이진욱, #정채연, #박보검, #추영우, #아이딧, #비아이,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하늘, #옥택연, #서현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