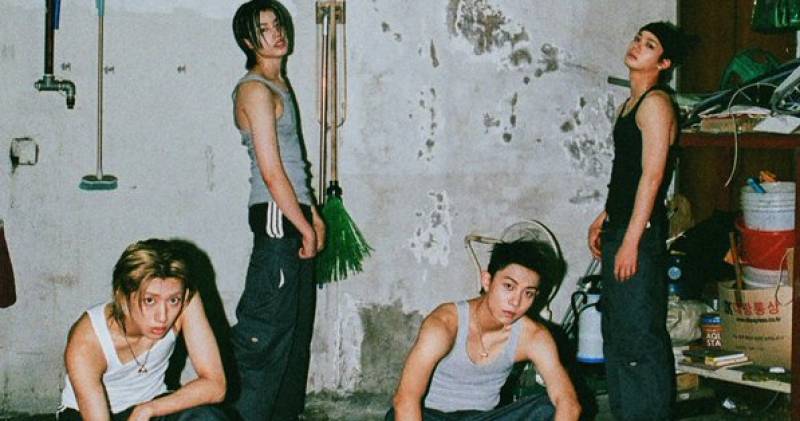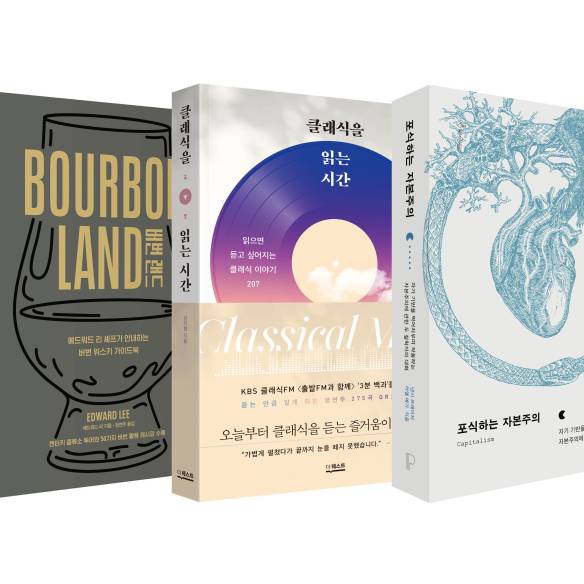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애드 미놀리티가 초대하는 포근한 논바이너리의 세계
아티스트 애드 미놀리티의 페인팅은 따듯하고, 포근한 기쁨으로 가득하다. 애드는 바로 그 포근함으로 논바이너리의 세계에 당신을 초대한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전시장 바닥에서 마치 버섯이 자라듯이 몇몇 그림은 좌대 위에, 또 몇몇 그림은 벽면의 페인팅에 마치 연결되듯 놓여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버섯들은 땅 위에서 보면 마치 다른 객체인 것처럼 자라 있지만, 땅속에선 실은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지요. 언급한 월드로잉도 일부러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듯한 형상으로, 그림을 올려두는 좌대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나무의 둥치처럼 보이게 디자인했어요.
전 설명을 듣기 전까진 조각의 좌대 개념을 차용한 줄만 알았어요.
좌대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건 맞아요. 작품을 평면적인 벽에만 거는 게 아니라 벽에서 좀 떨어지게 설치하고 싶었거든요.
전시를 보면서 힐마 아프 클린트가 떠올랐어요. 힐마 아프 클린트를 일컬어 발견되지 못한 최초의 추상화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국에서 힐마 아프 클린트의 전시를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조금 화가 났어요. 내가 좀 더 어릴 때 클린트의 그림을 만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클린트의 추상화는 1944년 사망한 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후 20년 동안 봉인되었으며, 봉인이 해제된 후에도 그녀의 작품이 미술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발견되었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 아쉬웠어요.
클린트가 미술사에서 오랜 기간 지워졌던 이유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모더니즘이 여성 아티스트를 지우는 방식과 비슷하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현대미술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미술계 안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예술이 주목받고 있고 저 역시 페미니즘 예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페미니즘 예술은 감정의 측면에서 보면 슬프고 우울한 경향이 있지요. 전 페미니즘 아트의 일부이면서도 밝고 경쾌한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Mariposa’, 2023, Acrylic on canvas, 100x100cm.
전 가끔은 ‘페미니즘 아트’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 전체가 마치 우울하고 슬픈 예술인 것처럼 묶어버리는 것 역시 특정한 성향의 작품들을 고립화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라벨을 붙이는 행위를 전복시키는 게 사실 퀴어 이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득 궁금합니다. 왜 버섯이었을까요?
혹시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알지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HBO의 좀비 드라마잖아요. 아직 한국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알고는 있어요.
이 드라마에 버섯이 아주 중요한 장치로 등장해요. 드라마에서 버섯은 유기체에 기생해 숙주를 좀비로 만드는 걸로 나와요. 심지어 좀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죠. 실제로 이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버섯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전 버섯이 그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걸,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게다가 동양에서는 1970년대부터 많은 버섯이 약효와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버섯의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요.
재밌네요. 화제작 <라스트 오브 어스>가 애드 미놀리티의 작품에 단초를 제공했다니요.
SF 영화나 소설 등을 보면 아폴칼립스의 세계나 폭력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아주 부정적인 세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 좀 밝고 유토피아적인 개념으로 미래 세계를 바꿔서 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를 의도하셨다면 이번 전시는 성공이네요. 행복하고 포근했어요.
소위 화이트 큐브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갤러리나 전시 공간들을 보면, 전 가끔 권위가 편견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다양한 색과 형태를 통해 탈바꿈시키고 싶었어요. 포근하다고 느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페레스 프로젝트에서 8월 20일까지 열리는 <숲의 기하학> 전시 전경.
미놀리티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포근함’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번 전시에서는 털북숭이 동물들을 전시장에 등장시키기도 했고, 이번 전시의 페인팅에서 붓 자국을 슬쩍슬쩍 드러내는 이유 역시 그림에 털이 난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라고 얘기했지요. 뭐랄까, 따듯함을 추구하는 게 삶의 철학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스페인어에 ‘펠루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디 베어나 토끼 인형 등 봉제 인형을 뜻하는 단어인데, 보송보송하고 폭신폭신한 감촉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 펠루체스러운 면들이 제가 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키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랑과 애정 그리고 따듯함을 전달하는 장치고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구상과 추상의 이분법을 깨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봤을 땐 구상인데 자세히 보면 완전한 추상이고, 추상적인 평면 위에 갑자기 엄청난 디테일의 구상 오브제가 등장하기도 하지요.
전 그런 식의 이분법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단순히 창작자와 예술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술을 소비하고 감상하는 관람객에게도 이분법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나쁜 영향을 끼치죠.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과 당신의 작품 사이의 연결 관계가 전시 소개에 쓰여 있더군요.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어요.(웃음)
표현의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전 제 페인팅 기법을 ‘사이보그 페인팅’이라고 불러요. 드로잉을 프린트한 다음 그 위에 물감을 칠하죠. 그 작업 자체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있다고 봤고, 그래서 사이보그 페인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관계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의 주제 수준에서 보면, 도나 해러웨이의 선언문 주제 중 하나는 논바이너리에 대한 강조였어요. 동물도 인간도 기계도 아닌 형태, 생명체도 무생물도 아닌 형태의 경계를 가를 수 없다는 논바이너리성에 대해 설명하지요. 제 작품이 추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니고,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매우 구상적인 ‘눈’ 등의 상징과 결합하는 형태 등이 제 나름대로는 그런 주제 의식과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의 버섯은 다음 전시까지 이어지는 개념이지요.
오늘 10월에 독일 에를랑겐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에요. 그때는 이 버섯이라는 개념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 회화와 드로잉 형태로 전시할 예정이에요. 이번 전시는 독일 전시의 주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맛보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edit
- EDITOR 박세회
- PHOTO Lila Llunez/Peres Project
- INTERPRETER 최다래
- ASSISTANT 송채연
- ART DESIGNER 주정화
CELEBRITY
#리노, #이진욱, #정채연, #박보검, #추영우, #아이딧, #비아이,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하늘, #옥택연, #서현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