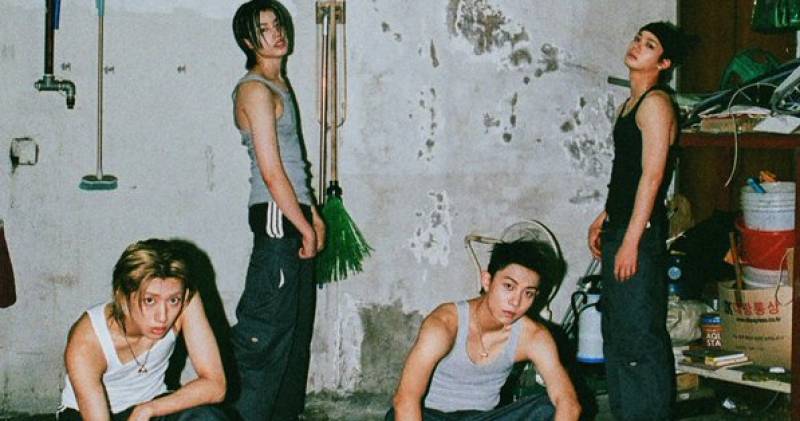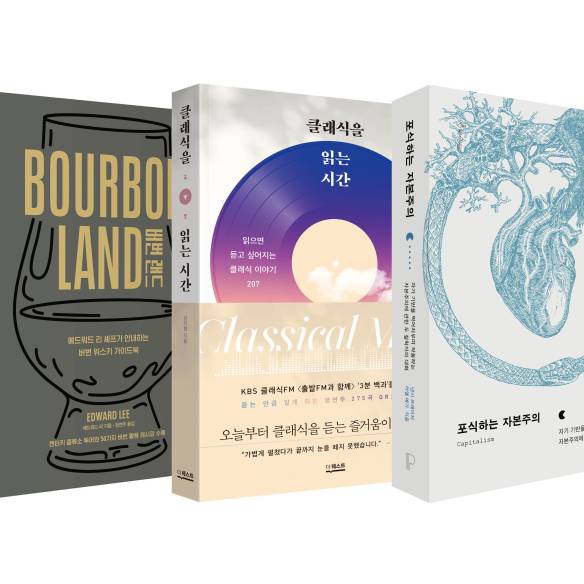LIFE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스포츠 기자가 할 수 있는 것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당시 스포츠 신문은 조간과 석간이 모두 발행됐다. 지하철 가판대에서 팔리는 부수가 많았다. 아침 마감은 오전 10시였다.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낮에 배포될 신문을 만들고 야구장 등으로 이동해 현장 기사를 썼다. 선수, 코치, 감독 등과의 통화가 늘 이어졌다.
2002 한일월드컵 때 최대 호황을 맞았던 <스포츠투데이>는 네이버 등 포털 뉴스의 급성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2006년 3월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으로 만든 스포츠 뉴스를 읽지 않았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경기 결과를 확인했고, 방금 작성된 따끈따끈한 뉴스를 봤다. 모든 뉴스는 공짜였다.
그해 12월, 종합지 <한겨레신문>으로 적을 옮겼다. 역시 스포츠 부서이기는 했으나 <스포츠투데이>와는 여러모로 다른 결의 취재가 이어졌다. 부서 인력 구성 자체가 이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 단체만 58곳인 만큼 담당 종목도 많았던 탓이다.
스포츠 전문 매체의 독자는 스포츠를 잘 아는 이들이라 인물, 규정, 규칙 등에 대해 굳이 설명을 넣어줄 필요가 없었다. 종합지 내 스포츠면은 달랐다. 스포츠를 모르는 이들도 많이 읽는 터라 전문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했다. 그러니 세이버메트릭스 내 숫자를 척척 읽어내는 야구 마니아들의 눈높이에 종합지 스포츠면 기사가 만족스러울 리 없었다. 야구보다 마니아 층이 두터운 아마추어 종목은 오죽할까. 어떤 종목의 마니아로 추정되는 독자가 이메일을 보내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서론이 길었다. 스포츠 전문 매체와 종합지 스포츠부의 기자와 기사에 대해 먼저 설명한 건, 미국 종합 언론 매체 <뉴욕 타임스>의 최근 행보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7월 10일, 스포츠부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스>의 A.G. 설즈버거 회장과 메러디스 코핏 레비언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뉴스룸 중 하나인 <디 애슬레틱>을 활용해 <뉴욕 타임스> 독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스포츠 보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향도 이야기했다. “<디 애슬레틱>이 매일 생산하는 전 세계의 리그, 팀 및 선수에 대한 150여 개 콘텐츠로 디지털 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셜 피드, 스포츠 랜딩 페이지 및 지면 인쇄 섹션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가 5억5000만 달러에 <디 애슬레틱>을 인수한 데 따른 전략이었다.
40대의 설즈버거 회장은 국내외 언론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뉴욕 타임스>의 97페이지짜리 ‘혁신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레비언 사장은 지난 2020년 49세의 나이로 CEO에 임명되었는데, <뉴욕 타임스> 168년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CEO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들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서 디지털 유료 구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안팎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유명하다. 스포츠부 해체 역시 이를 위한 극약 처방이었을 것이다.
<디 애슬레틱>에는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 400여 명의 기자가 있다. 야구, 축구, 농구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까지 총망라한다. 기자단의 대다수는 종목별 전문가, 즉 스페셜리스트다. 그렇기에 경기 자체의 분석이나 현장 해석에서 <디 애슬레틱>은 탁월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온라인 유료 구독자 330만 명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다. 조 칸 <뉴욕 타임스> 편집국장은 올해 초부터 35명 수준인 <뉴욕 타임스> 스포츠부 기자가 너무 많다며 <디 애슬레틱>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뉴스룸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기, 선수, 팀 및 리그에 대한 뉴스 보도를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우리는 스포츠가 돈, 권력, 문화, 정치 및 사회 전반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독특하고 영향력 큰 뉴스와 기업 저널리즘에 더욱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도 썼다. 어디에서나 공짜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뉴스로 찍어내는 비효율적 생산 체계를 개편해, 독자들이 지갑을 열 만한 차별적인 콘텐츠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국내 종합지 경영진 역시 <뉴욕 타임스>의 구성원들과 같은 고민을 한다. 독자들은 이미 전날 밤에 있었던 스포츠 경기 결과를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경기 내용과 결과를 지면으로 다시 읽는 독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경기장 안팎의 영상이 온갖 디지털 플랫폼에 넘쳐나는 시대다. 지면에 실린 뉴스도, 단독 기사나 인터뷰가 아닌 이상 최소 7~8시간 전에 이미 온라인을 통해 소비된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지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칸 편집국장 역시 이런 이유로 스포츠 그리고 사회 전반을 엮는 융복합 기사를 내놓으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스포츠 취재 방식의 진화이자 스포츠 저널리즘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터다. 물론 반발도 있다. <뉴욕 타임스> 노조는 “스포츠 보도를 자회사에서 ‘아웃소싱’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의 기조가 담긴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LA 타임스>는 지난달 LA 다저스 등 저녁 야구 경기 상보는 더는 지면에 싣지 않고, 잡지식의 기사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츠경향>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향신문>은 효율성을 내세워 스포츠 본부를 따로 두는 ‘원 소스 멀티 유즈’ 방식을 채택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신문>은 스포츠부와 문화부를 합쳐 문화스포츠부로 통합하는 방식을 꾀했다.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도래는 스포츠 전문지를 약화시켰고, 이제 종합지의 스포츠 지면까지 위협하고 있다.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축구 국가대표 A매치나 야구 WBC처럼 주요 경기가 아닌 이상 상보를 지면에 넣지 않는다. 기록을 남길 만한 경기는 디지털 기사로 처리한다. 대신 온라인 매체나 스포츠 전문 매체가 놓치기 쉬운 인터뷰 또는 다른 출입처와 융복합한 심층 기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 예를 들면 지난해 학교체육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기획한 ‘학교체육, 숨구멍이 필요해’ 시리즈가 있다. 올해 낸 ‘이주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시리즈는 스포츠 기사로는 이례적이게도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칸 편집국장이 <뉴욕 타임스>의 스포츠 기자들에게 바라는 점 역시 이처럼 사회와 연계된 심층 기획일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을 통합해 아우르는 종합 매체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전문성을 앞세워 개별 분야에 특장점이 있는 매체의 유료 구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하는 시대, 생존 게임의 승패는 결국 남들과 같은 경기를 보면서도 남다른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가를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발전 없는 선수가 도태되듯,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는 발전 없는 기자도 사라질 것이다. 비단 스포츠 기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김양희는 <한겨레> 스포츠 팀장이다. 만동화 <리틀빅 야구왕>과 야구 입문서 <야구가 뭐라고>를 썼다.
Credit
- EDITOR 김현유
- WRITER 김양희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CELEBRITY
#리노, #이진욱, #정채연, #박보검, #추영우, #아이딧, #비아이, #키스오브라이프, #나띠, #하늘, #옥택연, #서현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